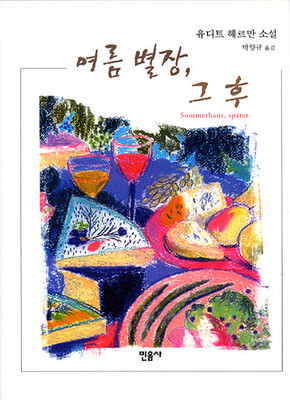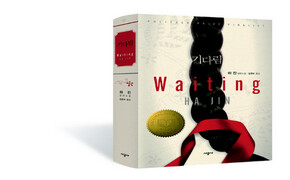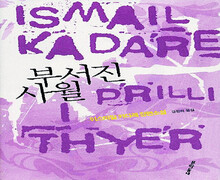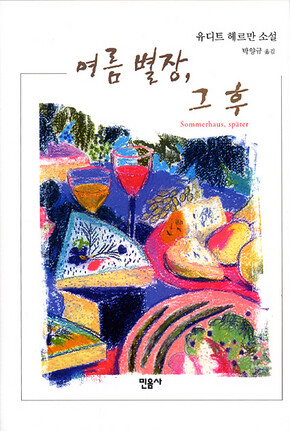
<여름 별장, 그 후>
‘의사가 괜찮을 거라고 말하네. 하지만 난 우울해.’
미국의 언더그라운드 싱어송라이터 톰 웨이츠의 가사를 서두에 붙이면서 시작되는 이 단편소설집은 음반 같다. 가령 이런 음반. 우연히 골랐는데 집에 와서 들어보니 단 한 곡도 버릴 것이 없어 멍하게 만드는 음반. 낯선 실험이 느껴지지만 어렵지는 않아 계속 듣고 싶어지는 음반. 우울을 말하지만 침울하게 만들지 않는 음반. 나는 9개의 단편이 실린 이 책을 교보문고 진열장에서 1년 반쯤 전에 발견했다. 책 위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훑자 ‘여름 별장, 그 후’(민음사 펴냄)라는 글자가 또렷해졌다. 여름 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했다. 겉장을 펼쳤다. 작가의 프로필에는 이 소설집이 유디트 헤르만의 처녀작이며, 독일의 문학상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다. 번역자의 말에는 소설집을 출간하면서 작가는 ‘문학 신동’으로 불렸고, 독설로 유명한 독일의 문학비평가 라이히라니츠키로부터 뛰어난 여성 작가를 발견했다는 찬사를 들었다. 작가는 대학에서 독문학과 철학을 공부했지만 극단 ‘폴크스뷔네’에서 연극을 하기도 했으며, 베를린 팝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번역자는 말한다. 이 소설집에서 언급된 대중음악이나 예술가의 등장이 우연은 아닌 것 같다고.
번역자의 말처럼 이 소설집의 주인공 혹은 ‘나’인 1인칭 진술자 대부분은 예술가이거나 예술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해시시를 피우고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들으며 춤추고 남의 집 정원에 누워 있는 ‘나’들. 예술가연하는 주인공들은 자유를 원하고, 자발적인 죽음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소설집은 이런 ‘문화적’인 ‘나’들이 타인과 헤어진 이야기다. 소설집의 공통적인 테마는 이별이다. 헤어진 뒤 살아남은 ‘나’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소설이다.
‘붉은 산호’에서 ‘나’는 우울증에 걸린 남자친구를 잃는다. ‘나’의 남자친구는 ‘나’의 증조할머니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하인의 증손자이다. ‘소냐’에서 미술작가인 주인공 남자 ‘나’는 소냐에게 강렬하게 이끌린다. 소냐는 예쁘지 않고 존재감이 없는 ‘것’이다. 소냐가 급격히 다가오자 ‘나’는 이별한다. 표제작 ‘여름 별장, 그 후’는 ‘나’가 그와 다른 부류인 남자 슈테판과 어색하게 결별하는 이야기이다. ‘나’와 ‘나’의 친구들은 히피 흉내를 내는 자유주의자들이며, 슈테판은 택시 운전기사이자 집 없이 떠도는 남자다. ‘나’들은 슈테판을 자신의 집에서 재운다. 집을 산 슈테판은 ‘나’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지만 어떤 누구도 그의 집, 여름 별장에 가지 않는다.
이 소설집의 이별은 다른 이별과는 조금 다르다. 이들이 하는 결별은 어긋난 사랑의 슬픔보다는 ‘나’들의 생존을 떠올리게 한다. ‘나’들은 그들을 욕망하되 그들과 살 수 없다. ‘나’들이 사랑하고 이끌리는 자들은 사회적 계급이 ‘나’보다 낮다. 그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이름도 없고 돈도 없는 존재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부족하다는 눈빛을 전혀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들은 매혹된다.
‘나’들이 욕망하는 ‘그들’은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가진 게 없는 유령 같은 존재들인 동시에 차가운 물에 어린 자기 그림자만 뚫어지게 응시하다 물에 풍덩 빠져버리는 미소년의 이미지이다. ‘그들’은 돌연한 행동을 하거나 전혀 행동하지 않는다. 죽음과 자유를 말로 외치던 예술지상주의자들인 ‘나’들은 알 수 없는 타인이 실제로 가까이 오자 거부한다. 회피한다. 이별한다. 죽음의 존재들은 몸의 존재에 가깝다. 그들은 말이 없다. 말없이 행동하거나 소리 없이 죽을 뿐이다. 이야기는 그들을 회피한 뒤 생존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별을 고하고 살아남아야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작가는 알 수 없는 타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죽음의 존재들과 같이 행동하지 못하고, 회피한 뒤 살아남아 단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듯하다. 회피했던 것을 고백한다. ‘그 후’에 태어나는 언어는 몸보다 못한 것일지 모른다. 이차적인 것이며, 죽음을 재현해내기에는 태생적으로 부족한 것이 언어의 본성일지도.
언어의 불가능함에 대한 무의식적 대안이 유디트 헤르만에게는 음악이 아닐까. 음악적 리듬이 느껴지는 문체, 짧은 문장, 정보의 생략, 언제나 현재인 듯한 시제의 모호함은 죽음의 존재들, 타인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보려는 작가의 무의식적 노력인 것 같다. 언어 너머 어딘가에 닿으려 하는. 자기를 고백하는 자들은 어딘가 우스꽝스럽지만 그 용기 때문에 역겹지 않다. 차가운 겨울 유리창에 머리를 대고 이편에 속삭이듯, 유디트 헤르만의 노래는 슬프고 우스꽝스럽고 멋지다.
채윤정 자유기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트럼프 “한국도 군함 보내라”…호르무즈 해협 보호에 파병 요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국내 선발 3~4명뿐인 KBO의 한계”…류지현 감독이 던진 뼈아픈 일침

“중동 에너지 시설 잿더미로”…이란, 미 하르그섬 공격에 보복 예고

북, “상대국 삽시 붕괴” 600㎜ 방사포 쏜 듯…한·미 연합연습에 무력시위

“윤석열의 꼬붕” “이재명에 아첨”…조국-한동훈 SNS 설전

이 대통령 “‘이재명 조폭 연루설’ 확대 보도한 언론들 사과조차 없어”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법왜곡죄’ 조희대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광수단에 재배당

트럼프 ‘이란 석유 수출 터미널 있는 하르그섬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