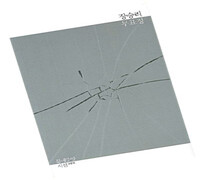J와 K의 결혼식이 끝난 뒤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었다. 아직은 걷는 일에 서툴러 보이는 한 아이가 우리 곁으로 왔다. 가만히 서서 우리를 빤히 쳐다본다.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기보다 흥미로워하는 기색이다. 안겨보라고 팔을 벌렸더니 저도 팔을 내민다.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때 어떤 어색한 느낌이 순간적으로 스쳐갔고, 내가 아이를 안아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를 다루는 데 서툴러서 혹은 아이(의 부모)가 싫어할까봐 등의 이유로 그래왔을 것이다. 이것이 내게는 매우 드문 경험이라는 것을 계속 의식하며 아이를 한동안 안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따뜻한 체온과 미세한 꿈틀거림이 각별하게 느껴졌다.
아이는 이내 내게 싫증을 느끼더니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렸다. 편안함과 섭섭함을 함께 느끼며 문득 해본 생각. ‘내 아이를 안고 있는 느낌은 어떨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경이로운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나는 모른다. 그저 언젠가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은 적이 있을 뿐. “어떻게 자아는 자신에게 타자가 될 수 있는가? 아버지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아이를 낳음으로써 인간은 ‘나에게서 출발해 나로 되돌아오는’ 협소한 삶의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뭘 ‘실감’하거나 ‘절감’한 것은 아니다. 결혼식장에서 돌아와 나는 마침 이런 시를 읽게 된다.
“이 아이를 보게 되면/ 괴로움을 잊게 되어/ 혼자 남아도 혼자 남은 줄 모르게 될까봐 두렵다.// 이 아이를 보게 되면/ 꽃보다 예쁘고/ 나무보다 푸른 이 작은 아이를 보게 되면 나는// 나의 비바람과 천둥을 잊게 될까봐/ 캄캄한 동굴과 그 안을 서성이는 붉은 눈동자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내가 건너온 사막과 발밑의 뜨거운 지옥이 사라지게 될까봐/ 두렵다.// 꽃보다 예쁜 아이야./ 나무보다 푸르른 작은 아이야.// 여기 이런 것들이 비바람에 흩어진 내 살과 뼈이고/ 저기 저런 것들이 천둥과 함께 흘러간 나의 청춘이다.// 이 아이를 보게 되면 나는/ 하지도 못할 말들이 너무 괴로워/ 이 아이를 보지 않는다.// 혼자 남아도 혼자 남은 줄 모른다.”
이응준의 새 시집 (민음사)에 수록된 시 ‘이 아이를 보게 되면’의 전문이다. 그에게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 이 시의 ‘아이’가 자식의 다른 말인지, 아니면 단지 성인이 아닌 존재를 뜻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 아이’라고 적혀 있으니, 자식이건 아니건, 그에게는 특별한 한 아이일 것이다. 이 시의 어떤 부분이 나를 붙들었다. 아이를 대상으로 한 시에서 흔히 보게 되는, 생명의 신비에 대한 경탄이나 순수한 동심 앞에서의 자기반성 따위는 이 시에 없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1~3연)에서는 아이가 자신을 ‘두렵게’ 한다고, 후반부(4~7연)에서는 아이가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말한다. 왜 그런가.
첫째, 아이를 보기 두려운 건 역설적이게도 아이가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행복이 삶의 비극적인 진실을 잊게 하기 때문이다. 삶이 끝내 “혼자”라는 사실을, “비바람과 천둥”의 나날이 많다는 사실을, “캄캄한 동굴”에서 “붉은 눈동자”로 헤매는 암중모색의 고행이라는 사실을 그만 잊어버리게 한다. 그 망각이 두렵다는 것. 둘째, 아이를 보기 괴로운 것은 삶이 대체로 비극에 가깝다는 그 진실을 말해줄 수 없어서다. 이 어여쁜 아이도 언젠가는 잔혹한 세월에 “청춘”의 “살과 뼈”를 봉헌한 대가로 살아남은 중년의 자신을 발견하고 아연해지리라. 결국 그럴 것이라는 말, 그 “하지도 못할 말들” 때문에 아이를 보는 일은 괴롭다는 것.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으리라. 아이 덕분에 삶의 비극성을 망각하는 일이 왜 두려운가? 그 망각이 곧 행복 아닌가? 그것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의 보람 아닌가? 시집 말미에 붙어 있는 산문에 시인은 이런 문장들을 적어두었다. “비극은 작가의 품위이다. 예술가는 자신의 비극을 관리할 줄 안다. 진실한 비극이 사라지면 시인은 역겨운 나르시시스트가 된다. (…) 나는 어떤 자가 예술가인가 아닌가를 감식할 때 먼저 그의 가슴속에 명쾌한 비극이 있는지 아닌지를 본다.” 비극을 잃는 순간 예술은 끝장이라는 것. 이런 예술가에게 아이란 과연 양가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으리라. ‘꽃보다 예쁘고 나무보다 푸른’ 아이 앞에서 삶은 잠시나마 비극이기를 그치니까.
문학평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룰라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장갑’ 받고 미소…뭉클한 디테일 의전

정청래 “장동혁, 고향 발전 반대하나…충남·대전 통합 훼방 심판받을 것”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전한길, 반말로 “오세훈 니 좌파냐?”…윤어게인 콘서트 장소 제공 압박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피해자들은 왜 내 통장에 입금했을까
![[속보]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소득세 대체할 것” [속보]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소득세 대체할 것”](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19899520364_4017719899388765.jpg)
[속보]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소득세 대체할 것”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에 미-중 전투기 대치 사과’ 전면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