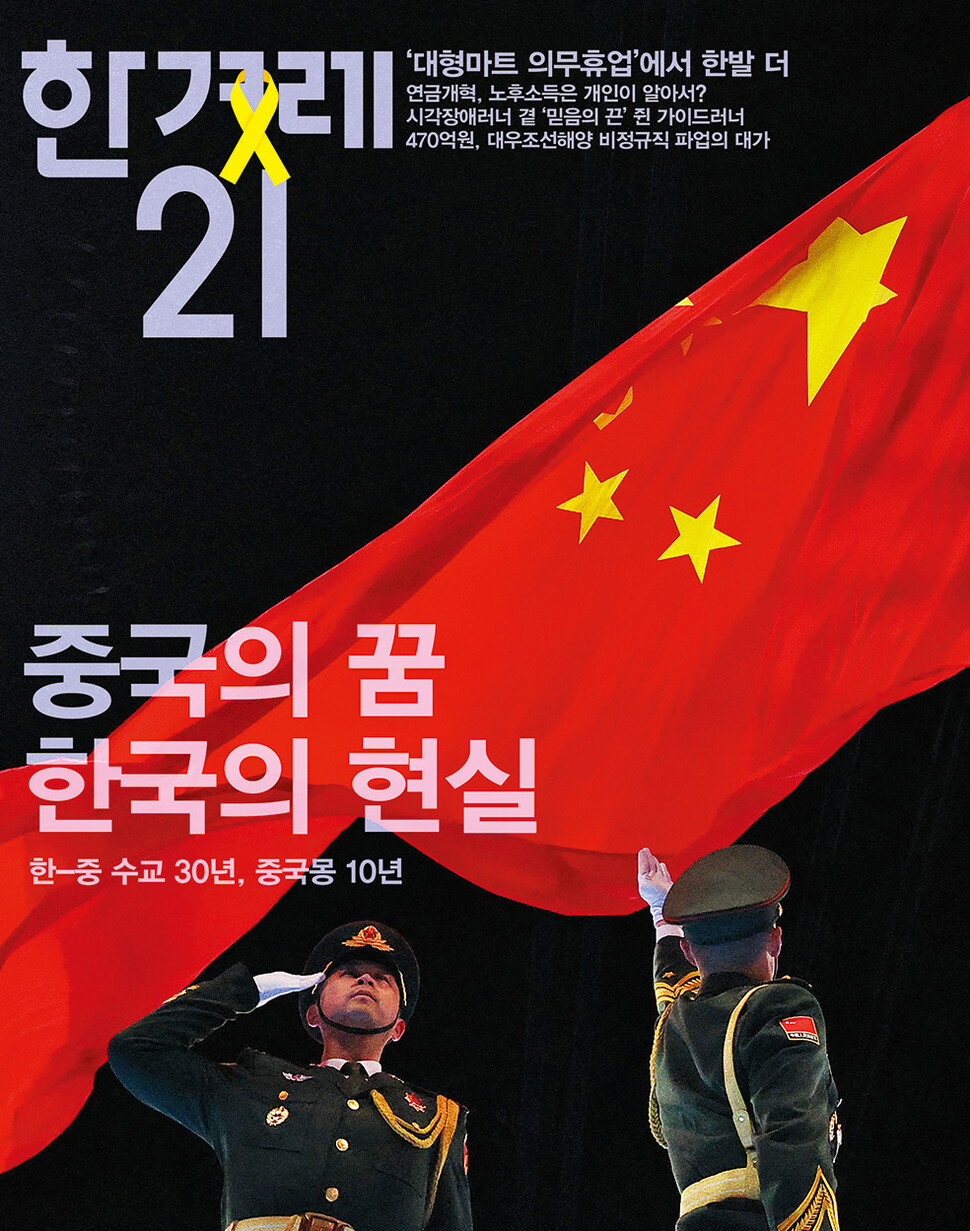
1428호 표지이미지
‘중국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짱깨들 무섭다’….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박현숙 선생님이 <한겨레21>에 연재하는 ‘북경만보’ 칼럼에 달린 온라인 댓글을 읽다보면 흠칫 놀라곤 한다. 일단 중국과 관련한 이야기에는 덮어놓고 중국인을 멸시하는 ‘짱깨’라는 혐오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언제부터인가 중국에 대한 적대감은 연령, 성별, 지역을 가리지 않는 정서가 됐다. 2020년 국내에 유입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 시장으로 지목된 이후 이러한 혐중 분위기는 더 널리 퍼진 듯하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2007년 중국 땅을 처음 밟아봤다. 신문 <한겨레> 베이징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중국통’ 선배와 함께 2주간 중국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중국 첨단산업이 뛴다’라는 주제의 기획취재를 진행했다. 그 선배는 중국을 똑똑히 보아두라고, 기자라면 꼭 출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으로라도 중국이 변화하는 모습을 1~2년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일러줬다. 실제 그 뒤로 몇 년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취재하러, 상하이 엑스포(세계박람회)를 취재하러 여러 차례 중국을 오갔다. 그때만 해도 ‘혐중’이나 ‘짱깨주의’는커녕, 국내 언론의 관심은 온통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등에만 쏠려 있었다. 중국 소비자와 관광객의 마음을 붙잡느라 한국 정부나 기업도 애썼다.
10여 년 전과 달리 2022년 8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관심은 뜨뜻미지근하다 못해 냉랭할 정도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미국을 대체할 큰 꿈을 꾸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아슬아슬한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칩4’ 등을 통해 한국과 대만을 중국 견제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떤 위기에 놓였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조일준, 이완, 이경미 기자가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여러 측면에서 짚어봤다.
코로나19가 멀어지게 한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한겨레21> 독자와도 얼굴을 맞댈 기회가 사라졌다. 그러다보니 ‘얼굴 없는’ 독자들의 댓글로만 기사에 대한 반응을 가늠하곤 한다. 직접 대면하진 않아도 따뜻하게 눈동자를 마주치며 말하는 듯한 독자의 반응이 더욱 고맙고, 고프다.
이를테면 이런 말들. ‘최근 <짱깨주의의 탄생>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짱깨라고 욕하는 동안 중국의 실체를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싫어도 이웃나라입니다. 친하게는 아니더라도 큰 문제 없이 지내야 합니다. (중략)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적절한 줄타기 외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요.’ 이번호 표지이야기를 소개하자, 독편3.0 단체대화방에서 한 독자편집위원이 남겨준 글이다.
이제는 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8월24일 독자 행사 자리를 마련했다. 거의 3년 만의 독자 모임이었다. ‘비건 비긴’ 통권7호를 읽은 여러 독자, 비거니즘과 채식을 고민하는 전문가들과 2시간 넘게 열띤, 하지만 다정한 대화를 나눴다. 관련한 이야기는 다음호에 기사로 전할 예정이다.
8월25일엔 ‘비건 비긴’ 통권호에 앞서 1년 전 만들었던 ‘쓰레기 TMI’ 통권6호를 들고 방준호 기자가 <미디어오늘>이 주최하는 ‘저널리즘의 미래’ 콘퍼런스 무대에 섰다. ‘좋은 질문이 좋은 해법을 이끈다’는 주제의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겨레21> 기자들이 재활용, 음식물, 일반쓰레기 등을 쫓아다니며 취재하고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 머리를 맞댄 경험을 소개했다. ‘쓰레기 TMI’와 ‘비건 비긴’ 통권호 모두 기후위기 시대에 작은 실천이라도 하려 고민하고 행동하는 이들과 어깨 겯고, 언론이 징검다리가 되기를 자처했던 기획이다.
혐오와 냉소가 가득한 시대에, 좀더 다정하고도 좋은 언론이 되고자 계속 노력하겠다.
황예랑 편집장 yrcomm@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내란 특검 “홧김에 계엄, 가능한 일인가”…지귀연 재판부 판단 ‘수용 불가’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트럼프, ‘슈퍼 301조’ 발동 태세…대법원도 막지 못한 ‘관세 폭주’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아내 이어 남편도 ‘금메달’…같은 종목서 나란히 1위 진풍경

“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12/20260212504997.jpg)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