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공터에서 봄을 즐기는 몽덕이. 김소민 제공
요즘 내 직업은 개 산책인 거 같다. 코로나19 탓에 프리랜서로 일하며 일주일에 몇 차례 드나들던 곳도 3주째 문을 닫았다. 태어난 지 넉 달 된 잡종견 몽덕이를 데리고 세 시간씩 동네를 배회한다. 개는 서비스만 받고 돈을 안 낸다. 그래도 이 개마저 없었다면 코로나 시대에 진짜 혼자 남을 뻔했다. 2주째 재택근무 중인 친구한테 “넌 가족이 있으니 ‘사회적 거리’ 유지해도 외롭지 않겠다”고 했더니 “가족은 가끔 만나야 좋다”며 “끼니가 부장보다 무섭다”고 했다. 학교에 안 가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돌보며 컴퓨터 앞에 붙어 있자니 일이 두세 배가 됐단다.
“개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밀란 쿤데라가 소설 에 쓴 이 문장은 참말인가보다. 이 개는 도인, 아니 도견이다. 몽덕이는 ‘나는 이런 개야’ 따위 자아상에 집착이 없다. 그러니 ‘나 같은 개를 뭐로 보고’ 따위로 성질내지 않는다. 가부좌 한 번 안 틀고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사는 경지에 올랐다.
잠옷 위에 점퍼를 그대로 걸치고 몽덕이와 산책 나왔는데 앞에 흰색 몰티즈와 마스크를 쓴 여자가 걷고 있었다. 몽덕이가 그 개 꽁무니를 쫓아갔다. 나도 따라갔다. 여자가 뒤돌아서더니 다짜고짜 쏘아붙였다. “따라오지 말라는데 왜 따라와요?” 바로 화가 치밀어올랐다. ‘언제 따라오지 말라 그랬냐? 이 길이 네 거냐? 봉두난발이라고 내가 만만해 보이냐?’ 여자가 아니라 몽덕이에게 반나절 중얼거렸다.
벚꽃은 피고 목련꽃은 떨어지고 하늘은 파란데 내 생각은 반나절 내내 사정도 모르는 여자 주위만 맴돌았다. 정작 거부당한 개는 그러든지 말든지, 검은 비닐봉지를 쫓느라 정신없다. 지나간 몰티즈를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지금 냄새 맡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지금 바로 앞에 비둘기가, 민들레가, 똥이 있다. 개는 잔뜩 찌푸린 날 이런 표정으로 본다. ‘분노가 뭐야? 먹는 거면 나도 좀 주고.’
개 몽덕이는 호혜평등을 실천한다. 지나치게 실천한다. 산책 한 번 나가면 길 가는 모든 사람, 모든 개와 인사해야 한다. 이 아파트에 2년 사는 동안 내가 아는 사람은 편의점 주인 아주머니 한 명뿐이었다. 몇백 명 같은 건물에 사는데 내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고립감이 엄습하곤 했다. 내가 40년 넘게 사는 동안 배우지 못한 무조건적인 환대를 이 개는 그냥 한다. 나이, 성별, 입성, 인상 가리지 않고 꼬리를 흔들며 발냄새 맡게 허락해달라고 한다. 갈색 시골개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이 좋다고 온몸을 떨어대면 10명 중 8명은 웃는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열리기도 한다.
몽덕이 오지랖 덕에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생겼다. “안녕하세요” 이상 대화를 나눠본 적 없는 경비 아저씨도 개를 키운다. “파주에 사는데 재개발한다고 빈집이 많거든. 그렇게들 개를 버리고 떠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내 개가 12살인데 그 개가 떠날 날이 가까워졌다 생각하면 그렇게 허전할 수 없거든.” 아저씨가 몽덕이를 쓰다듬었다. 몽덕이가 그 손을 핥았다. 80대 할머니와 둘이 사는 12살 개 용이는 짖는다는 민원 탓에 성대수술을 했다. 용이가 짖을 땐 이제 끽끽 쇳소리가 난다. 두 살짜리 웰시코기 풍이 아빠는 실업급여가 끊기는 4월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기저기 얻어터진 꼴이었던 유기견 똘똘이는 입양된 뒤 재벌집 스피츠처럼 털이 반짝인다.
무엇보다 시골개 몽덕이는 나한테 사랑을 가르친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나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랑이다. 수건을 백 번 돌리고 공을 백 번 던진다. 개가 즐거워하니까. 회사에 지각해도 뛰지 않던 내가 세 시간씩 걷고 뛴다. 내가 이리 뛰다니 헥헥, 나는 헥헥, 이 개를 헥헥, 사랑하는구나,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구나 헥헥.
벨 훅스는 책 에서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정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사랑이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자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 (…) 사랑은 실제로 행할 때 존재한다.” 다른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본 적이 없다. 사람한텐 사랑받는다는 걸 확인하려고 사랑한다고 말했으니 사랑한 적이 없는 거 같다. 이 개한테 바라는 게 없다. (있긴 있다. 신발을 물지 말아줬으면.) 내 사랑을 돌려주는지 아닌지 재지 않는다. (너무 명백해서 잴 필요가 없기도 하다.) 짧은 다리, 갈색 털 그대로 한 견생, 세상의 온갖 냄새를 탐험하며 충만하게 살다 가길 응원할 뿐이다. (개도 내게 그러겠지. 짧은 다리, 노란 가죽 그대로 한 인생 충만하게 살다가렴.)
25년 된 아파트 뒤편,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공터가 있다. 거기 앉아 개가 정성스럽게 가래, 쓰레기 봉지, 그 사이에 토끼풀 따위 냄새를 맡는 걸 하릴없이 눈으로 좇다보면 생각은 뒤로 물러나고 감각이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이 있다. 몽덕이는 20년을 못 살고 죽을 거다. 나도 아프고 죽을 거다. 그 약한 몸들 위로 봄 햇살이 쏟아져내렸다. 인간과 개가 그 풍경 속에 같이 있다. 심장마비와 암을 앓았던 아서 프랭크는 책 에 그런 순간을 썼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암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왔다. 비가 쏟아졌다. 몸이 젖었다. 아픈 몸으로 경험했기에 9월의 초록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웅덩이와 풀과 나뭇잎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이곳에 있었고, 나는 그 일부가 될 수 있었다. (…) 빗속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몸이 나에게 여전히 해줄 수 있는 일이 경이롭다고 느꼈다.”
갈 데가 없어 공터에 매일 퍼질러 앉아 있다보니 봄을 자세히 본다. 개나리 봉오리 하나, 두 개 그러더니 이제 화르르 피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 나는 손가락, 개는 발가락 쪽쪽 빨아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순간엔 몽덕이에게 감격에 겨워 말하게 된다. “보여? 목련이야!” 목련 꽃잎 냄새 맡는 줄 알았더니 몽덕이는 그 밑에 감춰진 똥을 먹고 있다.
김소민 자유기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침묵하던 장동혁 “절윤 진심”…오세훈, 오늘 공천 신청 안 할 수도

미 민주당 “이 대통령 덕에 안정됐던 한미 동맹, 대미 투자 압박에 흔들려”

농어촌기본소득법, 농해수위 통과

장동혁에 발끈한 전한길, 야밤 탈당 대소동 “윤석열 변호인단이 말려”

법원,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 3천만원 과징금 취소

“최후의 카드 쥔 이란…전쟁 최소 2주 이상, 트럼프 맘대로 종전 힘들 것”

이상민 “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열 생각 없었던 듯”…한덕수 재판서 증언

‘친윤’ 김민수 “장동혁 ‘절윤 결의문’ 논의 사실 아냐…시간 달라 읍소했다”

미, ‘이란 정권교체→군사력 약화’ 무게…종전 기준 낮춰 출구전략 찾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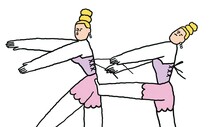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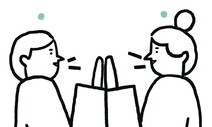


![[아무몸] 아홉 살 여자가 말했다 “여자애라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121/53_16059651125192_9116059651015046.jpg)
![[아무몸] 자유는 몸으로 만질 수 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004/53_16018177874382_6916018177743424.jpg)
![[아무몸] 밥하는 일보다 중요한 노동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911/53_15997893871638_1615997893661638.jpg)
![[아무몸] 나의 깨끗함을 위해선 남의 더러움이 필요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829/53_15986906788614_5915986906570301.jpg)
![[아무몸] 더럽게 외로운 나를 구한 ‘개 공동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24/53_15955756306094_5615955756190329.jpg)
![[아무몸] 어쩔 수 없는 나여도 괜찮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10/53_15943674064803_1415943673955014.jpg)
![[아무몸] 누가 나를 돌볼까, 나는 누굴 돌볼까](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26/53_15931545419299_2415931545291646.jpg)
![<span>[아무몸] 쓰레기 자루 속 레몬 빛깔 병아리</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16/53_15922336150495_961592233602684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