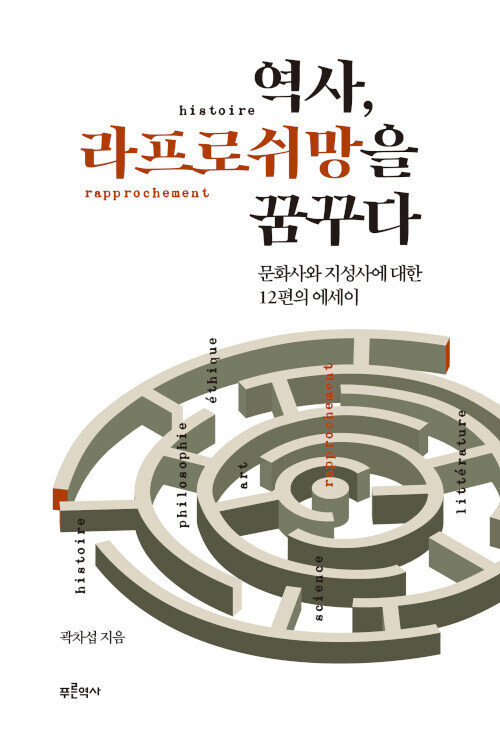
곽차섭 지음, 푸른역사 펴냄
역사학자 E. H. 카는 몰라도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은 아는 사람이 많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말이기도 하니 사실상 ‘상식’으로 자리잡았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상식은 양가적이다. 사람들 사이의 쓸데없는 마찰을 줄여주지만 생각을 굳혀 그 이면을 고민하지 못하게도 한다. 카의 말도 마찬가지다. 현재와 과거는 하하호호 담소를 나누지 않는다. 오히려 둘 사이의 대화는 오해와 회의로 점철돼 있다. 현재의 역사가는 과거의 모든 일을 복원해내고야 말겠다는 ‘실증’의 유혹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모든 역사란 결국 ‘재현’일 수밖에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한다.
곽차섭의 <역사, 라프로쉬망을 꿈꾸다>는 과거와 현재의 이러한 ‘엇박자’에서 역사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본다. 기록이란 한정적이기에 현재는 적극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과거를 그려낼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은 어디까지나 엄밀한 추론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 그 점에서 역사학은 문학인 동시에 과학이며, 둘은 결국 한곳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책 제목에 화해를 뜻하는 프랑스어 ‘라프로쉬망’(Rapprochement)이 들어간 건 그래서다. 지은이는 현재와 과거, 재현과 실증, 문학으로서 역사와 과학으로서 역사, 둘 사이의 화해를 도모한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다. 치열하게 싸워야 진하게 화해할 수 있는 법! 그렇기에 지은이는 우아하고 격조 있는 열두 편의 에세이에서 역사학을 둘러싼 투쟁과 모순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근대 실증주의 역사학의 비조로 평가받는 레오폴트 폰 랑케가 실은 낭만주의와 신학적 역사철학에도 심취했던 경계적인 역사가임을 보여준 4장이 대표적이다. 지극히 봉건제적인 배경에서 탄생한 중세도시로부터 근대의 맹아를 추출하려던 서구 역사가들의 허구성을 폭로한 10장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책은 비단 근대 역사학의 신화를 해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나 실제 일어난 일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는 역사학의 기본 전제까지 뒤흔든다. 역사소설의 역사성을 묻는 2장과 3장, 그리고 위서로 밝혀진 <헤르메스 서> 논쟁을 다룬 8장이 이에 해당한다.
아득한 옛 이집트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도래를 언급한 이교도 선지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물증’이었던 <헤르메스 서>는, 1614년 칼뱅파 신학자 이자크 카조봉에 의해 로마시대 위조된 가짜임이 탄로 난다. 하지만 〈헤르메스 서〉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으니, 역설적으로 연도가 확정됨으로써 헤르메스주의의 배경을 유추하는 단서로 거듭난 것이다. 20세기 초 리하르트 라이첸슈타인이 <헤르메스 서>의 이집트적 기원을 주장한 이래, 수많은 학자가 이 문제적인 책의 뿌리가 그리스인지 이집트인지 페르시아인지를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그 유명한 마틴 버낼의 <블랙 아테나>처럼 <헤르메스 서>를 통해 아예 유럽 문명의 기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헤르메스 서>로부터 <화랑세기>나 <환단고기>처럼 한국 역사학계에 파문을 일으킨 위서들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건 위서 그 자체는 사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위서를 만들어내고, 퍼뜨리고, 맹신하고, 억누른 기록은 충분히 사료가 될 수 있다. 비판과 배격을 넘어 위서를 어떻게 ‘역사화'할 것인지, 라프로쉬망을 꿈꾸는 역사가라면 궁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유찬근 대학원생
*유찬근의 역사책 달리기: 달리기가 취미인 대학원생의 역사책 리뷰. 3주마다 연재.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서울마저” “부산만은”…민주 우세 속, 격전지 탈환이냐 사수냐

노시환, 한화와 최대 ‘11년 307억원’ 계약

‘윤석열 품은 장동혁’ 국힘 오늘 갈림길…극한갈등, 파국 치닫나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사설] 중국 도발한 주한미군 훈련, ‘단순 항의’로 끝낼 일 아니다 [사설] 중국 도발한 주한미군 훈련, ‘단순 항의’로 끝낼 일 아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29577243_20260222502024.jpg)
[사설] 중국 도발한 주한미군 훈련, ‘단순 항의’로 끝낼 일 아니다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그림판]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64410097_20260222502174.jpg)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그림판]
![국가는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가 [한승훈 칼럼] 국가는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가 [한승훈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59809613_20260222502135.jpg)
국가는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가 [한승훈 칼럼]

내란 특검 “홧김에 계엄, 가능한 일인가”…지귀연 재판부 판단 ‘수용 불가’

이 대통령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환영”…한-브라질, 오늘 정상회담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