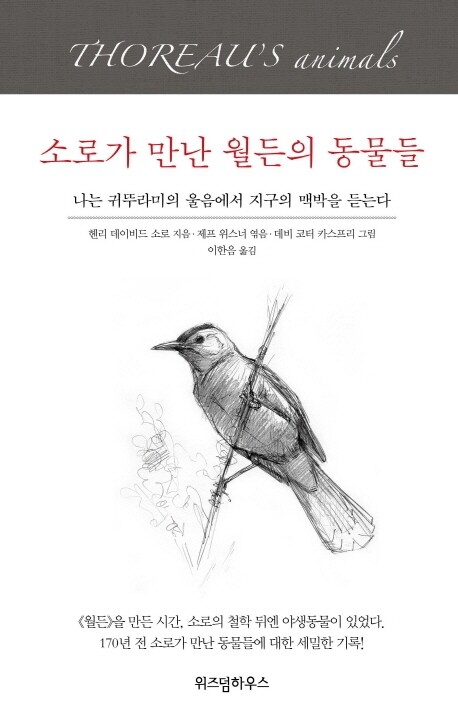
중심을 잡고 산다는 것. 말로는 쉬워도 손에 잡히지 않는, 연기 같은 수사일지 모른다. 오랫동안 궁금했다. ‘중심을 잡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을까. 대체 그런 게 있기는 할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읽는다는 것. 그런 ‘우아한 관찰주의자’의 정신 곁에 머무르는 일은 중심에 대한 불안을 안정과 기쁨으로 놀랍게 바꿔버린다. 그는 자기 안에서 중심을 찾지 않았다. 거꾸로, 중심 속에 갇힘으로써 균형을 ‘얻었다’. 자연이라는 위대한 중심에 둘러싸여 스스로 구한 것보다 훨씬 견고한 밸런스를 얻은 것이다. 중심을 ‘나’의 바깥에 둘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소로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겸손과 절제를 가진 인간이 적시적기에 강인해질 수 있다는 점도 그는 가르쳐주었다.
(위즈덤하우스 펴냄)을 통해 그 유산을 한 번 더 누린다. 더, 더, 친밀해서 정말로 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1850년부터 1860년까지 소로가 동물에 관해 쓴 일기만 추렸다. 연도와 상관없이 날짜순으로 엮여 계절 흐름을 따라 읽을 수 있는데, 이 책은 3월부터 시작한다. 소로에게 한 해가 시작되는 때는 3월이었다. 소로는 “동물을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 그 성격과 정신을 확실히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 그 동물이 사람에게 무엇인지를 말해야 한다”고 썼다. 동물학·곤충학·등에서 전문가에 버금가는 지식을 가지고 학자들과 교류했던 소로는 생물의 이름과 크기, 특성 등을 낱낱이 기록해뒀다. 그러나 핵심은, 동물 세계에서 자기 영혼의 단서를 찾는 데 있었다.
까마귀에게서 그가 찾은 것은 ‘근원적 기질’이다. “이 새는 백인이 오고 원주민이 물러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자신은 물러나지 않았다. 그 길들지 않은 목소리는 대장간에서 꽝꽝거리는 소리 너머로 들린다. 까마귀는 한 인종이 스러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자신은 스러지지 않았다. 남아서 원주민의 본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숲지빠귀에게서 찾은 건 ‘숭고함’이다. “거의 내가 가는 곳마다 노래를 한다. 우리를 위해 아침저녁으로 세상을 끝없이 신성하게 만든다. 그리고 세상을 살 만한 곳으로, 우리가 살고도 남을 만한 곳으로 만드는 듯하다.” 매에게서 찾은 건 ‘시간의 힘’. “매가 아주 고상하게 높이 떠서 한결같이 노력 없이 맴돌고 있다. 전생에 파충류로서 땅을 충실히 기어다녔기에 이 능력을 획득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달리기 전에 먼저 기어 다녀야 한다. 날 수 있으려면 먼저 달려야 한다.”
소리를 좋아한 소로의 동물 일기엔 새가 넘친다. 파랑어치의 “삐뻬삐뻬” 딱따구리의 “윅윅윅윅윅윅” 쇠박새의 “데이데이데이” 붉은날개지빠귀의 “구글-리”…. 생명마다의 고유한 노래가 끝없이 들린다. 바로 “그것을 손잡이로 삼아서, 내 생각은 봄을 꽉 움켜쥐고 있다.”
소로의 스케치도 실려 재미를 더한다. 뭉클한 동시에 웃음이 뿜, 터지는 순간이 적지 않은데 소로의 독창적인 그림 세계를 보면 거의 반드시 웃게 된다. 동물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데비 코터 카스프리의 스케치 50여 점이 수록돼 소로가 말하는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 쉽도록(!) 도와준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jpg)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국힘 지지율 17% “바닥도 아닌 지하”…재선들 “절윤 거부에 민심 경고”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이 대통령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게 할 것”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트럼프 새 관세, FTA 맺은 한국은 유리…기존 세율에 10% 더해

조희대, ‘노태악 후임’ 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

쿠바 “미 고속정 영해 진입해 4명 사살”…미국은 일단 신중 모드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임은정, ‘한명숙 사건’ 소환해 백해룡 저격…“세관마약 수사, 검찰과 다를 바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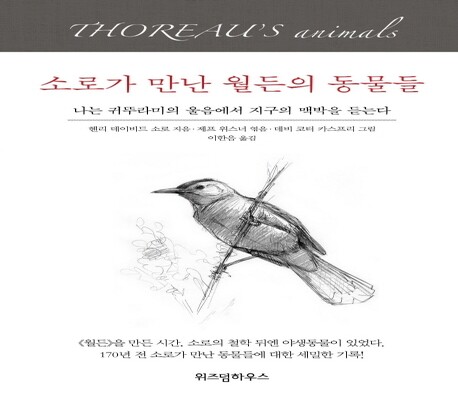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