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 >
장석남의 일곱 번째 시집 (문학동네·2012)를 읽으며 좀 딴생각한 이야기를 적어보려 한다. 시집 제목에 ‘고요’라는 말을 얹었으니 이 말이 지금처럼 이 시집의 열쇳말이 되어버린 건 어쩔 수 없는 일. 그게 또 틀린 것도 아니어서, 이 열쇠로 열고 들어가면 이 시집은 이 세상의 고요한 것들을 참 정갈하게 보여주지. 그러나 그렇게만 읽는 것은 좀 심심한 일. 너무 잘 보이는 길은 가끔 의심해봐야 하는 것. 어떻게 고요할 수만 있을까. 절대적으로 고요하기만 하다면야 말 그대로 입적(入寂)일 텐데, 누구보다 생생하게 살아 있는 이 시인의 내면이 그럴 수는 없는 것. 오히려 마음 한쪽이 소란하여 고요의 귀함을 더 잘 아는 건 아닌지. 이를테면 이런 고요한 시를 한번 보시길.
“오도카니 앉아 있습니다/ 이른 봄빛의 분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발목이 햇빛 속에 들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저것이 아닌가 하는 물리(物理)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그 방에도 들겠는데/ 가꾸시는 매화 분(盆)은 피었다 졌겠어요/ 흉내 내어 심은 마당가 홍매나무 아래 앉아 목도리를 여미기도 합니다/ 꽃봉오리가 날로 번져나오니 이보다 반가운 손님도 드물겠습니다/ 행사(行事) 삼아 돌을 하나 옮겼습니다/ 돌 아래, 그늘 자리의 섭섭함을 보았고/ 새로 앉은 자리의 청빈한 배부름을 보아두었습니다/ 책상머리에서는 글자 대신/ 손바닥을 폅니다/ 뒤집어보기도 합니다/ 마디와 마디들이 이제

시인 장석남
제법 고문(古文)입니다/ 이럴 땐 눈도 좀 감았다 떠야 합니다/ 이만하면 안부는 괜찮습니다 다만/ 오도카니 앉아 있기 일쑵니다”(‘안부’ 전문)
맨 처음 ‘오도카니’에는 수상한 기색이 없다. 그냥 봄을 맞이하는 자세 같은 것. 그런 자세로 봄의 분주함을 바라보며 사랑의 근원을 생각하던 시인은 기념행사로 돌을 하나 옮겨놓는데, 그랬더니 돌이 원래 있던 자리는 섭섭해졌고(“그늘 자리의 섭섭함”) 새로 놓인 자리는 뿌듯해졌다(“청빈한 배부름”). 어떤 나이쯤 되면 잃는 것이 있는 대신 얻는 것도 있다는 것. 사랑이 또 올까 싶어 섭섭하지만, 마침내 놓여난 듯 홀가분하기도 하다는 것. 그래서 그는 세월의 무늬가 제법 고문(古文)처럼 새겨진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이지. 마지막 두 행은 ‘섭섭함’을 은근히 강조하며 요약한다. 청빈한 배부름이 있으니 이만하면 괜찮다는 것, 다만 자꾸 오도카니 앉아 있게 만드는 섭섭함은 어쩔 수 없다는 것. 이 마지막 ‘오도카니’는 앞의 것과 달리 쓸쓸해 보인다. 그러니 이런 안부를 고요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막대기로 연못 물을 때렸습니다/ 축대 돌을 때렸습니다/ 웃자란 엉겅퀴를 때렸습니다/ 말벌 집을 때렸습니다/ 사랑을 때리듯이 때렸습니다/ 헌 신발도 신은 채로 때렸습니다/ 밥솥도 밥그릇도 때렸습니다/ 어둠이 오면 어둠도 때릴 것이고/ 새벽도 소쩍새도 때릴 겁니다/ 하루를 다 때렸습니다// 긴 하루 지나고 노을 물들면 오늘도/ 아무 지나는 이 없는 이 외진 산길을/ 늦봄인 양 걸어 내려가며/ 길에, 하늘에, 민들레 노란 꽃을 총총히 피워두면/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올라오는 이 있겠지/ 그 말이 누군가를 막 때리는 말인 줄은 까맣게 모를 테지/ 여전히 나는 민들레 노란 꽃을 남기면서 내려가고 있을 거야// 민들레 노란 꽃을 여럿 때렸습니다”(‘어찌하여 민들레 노란 꽃은 이리 많은가?’ 전문)
이 고요한 시집에서 유독 이질적인, 마음의 소란이 극대화된, 그래서 단연 매력적인 시. 어느 날, 존재하는 것들이 죄다 싫어 막대기로 막 때려주었다(1연). 그런 마음도 모르고 내가 심어놓은 꽃을 보며 “이쁘다” 감탄하는 이가 또 있으니, 인연이 될 사이라면 그 감탄은 나를 기쁘게 하겠지만, 그럴 수 없이 엇갈리는 사이일 땐(‘올라오는 그’와 ‘내려가는 나’) 그 말은 나를 막 때리는 듯 안타까운 말이 된다(2연). 그러니 민들레꽃에다 또 화풀이를 할 수밖에(3연). 요컨대 이 시의 공격성은, 표현하지 못하고 삼킨 에로스의 뒤틀린 분출 아닌가. 결론. 이 시집은 대체로 고요하지만 은밀한 소란도 있다는 것. 이 소란을 딛고 얻은 고요라서 더 귀하다는 것. 봄이 거의 다 왔으니, 어쩌나, 이제 곧 마음 소란스러워지겠다는 것.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장동혁 지도부의 공천권 강탈”…당내선 ‘선거 포기했나’

앞뒤 다 비워…윤석열 ‘황제 접견’, 재구속 이후 278차례

프로야구 롯데 선수들, 대만 도박장 CCTV에 ‘찰칵’…성추행 의혹도

전임자도 “반대”…이성윤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 임명에 민주당 발칵

‘트럼프 관세’ 90%, 돌고돌아 결국 미국인이 냈다

10만명 생계 달린 홈플러스, 살릴 시간 20일도 안 남아…“제발 정부가 나서달라”

기상 악화에도 “치킨은 간 모양이네요”…이 대통령, 연평도 해병대 격려

재판소원 옹호 나선 헌재 “4심제도 위헌도 아니다”

여자 500m 벽 높았다…쇼트트랙 최민정·김길리·이소연, 메달 획득 실패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표명 다행…재발 방지에 주의 돌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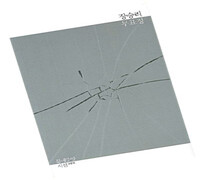
















![[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 [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12/53_17708767345627_202602125028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