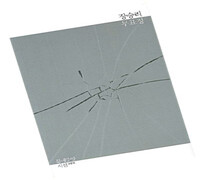어떤 작가·시인들은 책의 맨 앞이나 맨 뒤에 붙어 있는 ‘작가의 말’ 혹은 ‘시인의 말’과 같은 관행적인 장소에서도 관례적인 말을 늘어놓기보다는 그냥 멋진 이야기 하나를 툭 던져놓는다. 작가 배리 기포드는 첫 단편소설집 (최필원 옮김·그책 펴냄·2010)의 ‘작가의 말’에서 그의 아흔 살 삼촌이 최근에 겪은 일화를 들려준다. 낚시광인 삼촌은 멕시코의 프로그레소에 갔다가 어느 낚시 가이드를 만났는데, 단번에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다음날 아침 함께 낚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계획을 세운 그날 밤 삼촌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다. 다음날 아침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가이드에게 연락을 해줘야 할 텐데 어쩌나.

<스타호텔 584호실> 표지
“벅 삼촌이 전화가 없는 가이드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의사도 없는 프로그레소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삼촌은 간호사의 남편이 가져다준 수제 목다리를 짚고 메리다라는 인근 읍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비행기를 찾아 집이 있는 플로리다의 탬파로 돌아왔다. 부러진 다리가 완치될 때까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완치 후 삼촌은 기다렸다는 듯 프로그레소로 날아가버렸다. 사고를 당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벅 삼촌은 낚시 가이드의 집을 불쑥 찾아갔다. 자, 이제 가볼까요? 그가 문을 열자 벅 삼촌이 말했다. 잠시 삼촌을 빤히 쳐다보던 가이드는 기억을 더듬고 나서 대답했다. 모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지키지 못한 1년 전의 약속을 지키려고 다시 멕시코로 날아간 삼촌이나, 1년 만에 불쑥 찾아온 그를 마치 1년 전의 아침인 양 덤덤히 맞이하는 가이드나, 좀 멋진 사람들인 게 분명하다. 이 이야기를 전달한 뒤 작가는 단편소설이야말로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매력적인 문학 형식임을 주장한 다음 다시 저 이야기로 돌아가 이렇게 덧붙인다. “삼촌과 멕시코의 낚시 가이드에 관한 이야기는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이 이 책에서 쓰고 싶었던 유형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자신이 생각하는 단편소설 미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짧은 이야기 하나로 다 얘기했으니 꽤 경제적이다.

시인 정한아의 첫 시집 (문학동네 펴냄·2011)의 ‘시인의 말’이 또 그렇게 멋지다. 어떤 시인들은 ‘시인의 말’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기를 원한다. 한 사람의 자연인 혹은 생활인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감사의 말 같은 건 생략해버리고 그저 한두 문장만 쓰고 만다. 예컨대 심보선의 새 시집의 경우 “시여, 너는 내게 단 한 번 물었는데 나는 네게 영원히 답하고 있구나.” 이준규는 새 시집 (문예중앙 펴냄·2011)의 ‘시인의 말’에 숫제 딱 한 단어를 적었다. “하염없다.” 그런데 정한아는 ‘시인의 말’을 길게 썼고 심지어 이야기를 담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무척 좋았다는 얘기다. 시인은 흔한 감사의 말 대신 한 이성 친구와 9년 만에 재회한 날의 기억을 꺼내놓는다. 외국인 친구인 그 남자는 게이다. 남편이 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여전히 그를 떠나지 않고 있는 아내와 9년째 살고 있다. 그런 친구가 시인에게 근황을 털어놓는다. 신부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 물론 이 결심은,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에 성공하지 못한 한 사내의, 아픈 배수진일 것이다. 술을 좋아하고 담배도 피우고 문신까지 있는 게이 신부의 탄생을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축복한다. 게이는 자신의 결심이 너무 외로워서 일부러 웃고, 시인은 친구의 결심이 가슴 아파서 함께 웃어준다.
“기억해줘.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 이렇게 말하면서 장차 신부가 될 게이는 울고 만다. 물론 이 ‘사랑’은 가장 섬세한 ‘우정’의 다른 이름일 것이고, 어떤 ‘고통’의 절박한 표현일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인의 말. “나는 방 안에서 그의 말들을 찬찬히 되새기고 있었다.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 중년의 게이를 위해 나는 몇 년 만에 기도를 했다. 이 상처받은 어린 짐승들을 보살펴주소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울지 않게 하소서. 아니, 그저 울음을 참지 않게 하소서. 2011년 7월 정한아.” 우리의 시인은, 울 수 있는 외로움은 울 수도 없는 참혹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친구가 앞으로도 울음을 참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어떤 서문은 그 책의 첫 번째 작품이 된다.
문학평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지역구 공천, 중앙당이 하기로…친한계 공천권 제한

‘사법개혁 3법’ 통과 앞…시민단체들 “법왜곡죄, 더 숙의해야”

‘윤석열 출국금지’ 국회 보고했다고…박성재 “야당과 결탁했냐” 질책

정부, ‘엘리엇에 1600억 중재판정’ 취소 소송서 승소…배상 일단 면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낮 음주운전…감봉 3개월

트럼프 “대법 결정으로 장난치면 훨씬 더 높은 관세”

조희대, 민주당 사법 3법 ‘반대’…“개헌 해당하는 중대 내용”

‘노스페이스’ 영원그룹 회장, 82개 계열사 은폐해 고발 당해

국힘 ‘절윤 격돌’ 예상했지만…싱겁게 끝난 “입틀막 의총”

김혜경 여사·브라질 영부인, ‘커플 한복’ 맞추고 친교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