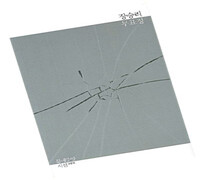최제훈의 <퀴르발 남작의 성>
체호프는 아기가 태어나면 우선 잘 씻긴 뒤 이렇게 말하면서 매질을 하라고 했다. “쓰지 마. 쓰지 마. 작가가 되면 안 돼!” 그래도 어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안타깝게도 작가가 된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을 모아놓고 어디선가 주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제 이야기인 양 ‘구라를 푸는’ 소녀는 위험하다. 이야기의 향연으로 뭇사람을 끌어들이는 입담형 소설가가 될지도 모른다. 자신의 체험, 기억, 상처들을 응시하면서 일기나 편지 따위를 쓰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는 문장을 끼적이게 되는 소년도 가망 없다. 천박한 세계에 맞서 내면성을 수호하는 고백형 소설가가 될지도 모른다.
두 유형의 작가들이 활약해준 덕분에 수많은 이야기가 축적돼왔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소문도 들린다. 모든 개별적 사건들이 월드와이드 매체들로 즉각 공유되는 시대에 무슨 이야기인들 신기하게 느껴지겠느냐는 것이고, 다들 획일적으로 살고 있는 터라 내면을 들여다본들 독자적으로 고백할 게 딱히 없다는 거다. 요컨대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의 소설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남 얘기도 내 얘기도 아닌, 그냥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가들. 이른바 ‘포스트모던’하다고 하는 작가들이다.
앞의 두 유형의 작가들이 소설 쓰는 법을 익히기 위해 소설을 읽었다면, 세 번째 유형의 작가들은 동서고금의 이야기가 그 자체로 요릿감이기 때문에 취재를 위해 읽는다. 물론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 신화와 중세 마녀사냥 문헌들을 읽고, 미셸 페로의 동화와 코넌 도일의 셜록 홈즈 이야기와 메리 셸리의 고딕소설 등을 읽는다. 그런데 그들은 뒤집어 읽고 거꾸로 읽고 행간을 뒤지며 읽는다. 그러고는 이런 식으로 말문을 연다. “그런데 이 스토리, 어딘가 허술하지 않은가?”(172쪽) “괴물은 어떻게 되었을까?”(236쪽) 다시 읽어보니 뭔가 이상하거나 비어 있더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써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신인작가의 첫 책이 바로 이런 유형의 물건이다. 최제훈의 (문학과지성사·2010)에는 앞서 언급한 옛이야기들을 ‘다시 읽고 다시 쓴’ 사례가 여러 편 있다. 이런 유형의 소설이 겨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패러디의 재미와 이데올로기 해체. 먼저 전자에 대해서라면 이 책은 대부분의 독자를 만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통찰과 재치 둘 다 있다. 세련된 유머 말고 잔재미를 노리는 개그들은 좀 절제했다면 좋았겠다 싶기도 하지만, 가독성을 높이는 데는 쏠쏠히 기여한다. 특히 ‘셜록 홈즈의 숨겨진 사건’ 같은 작품은 겸허하게 명석하고 끝까지 우아하다.
그렇다면 후자로서의 성과는 어떤가. 근래의 문화이론 담론을 적절히 흡수하고 작가 고유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쓴 ‘마녀의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고찰’이나 ‘괴물을 위한 변명’ 같은 작품들로 판단해볼 수 있겠다. 두 소설은 마녀·괴물 형상의 도상학이자 계보학이다. 마녀·괴물이 애초 원본에서부터 얼마나 훼손됐는지, 그 훼손이 어떤 과정을 밟아 진행됐는지, 그것이 결국 우리 안의 마녀·괴물을 투영한 결과는 아닌지를 추적하고, 그 마녀사냥과 괴물 창조는 현재형이라고 꼬집는다. 진부하다고? 현실은 그보다 더 진부하다. 숱한 연예인들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동성애자는 아직도 일각에서 괴물 취급을 당하지 않는가.
입담형 작가나 고백형 작가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작가를 ‘추리형 작가’라고 해도 좋겠다. 그러고 보면 이 책에서 셜록 홈즈가 왓슨에게 “왓슨, 우리가 사물을 관찰하고 추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에 대한 탐구라는 것을 내가 누누이 강조했었지”(68쪽)라고 말할 때 이는 작가 자신의 다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럼 이런 말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도 될까? “왓슨, 그간 우리는 인간의 복잡성에 대한 많은 사례를 접해왔지만 이 사건은 그중에서도 매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걸세.”(74쪽)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 첫 책을 보건대 그가 체호프의 매질을 이겨내고 작가가 된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신형철 문학평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순교자’ 하메네이에 ‘허 찔린’ 트럼프…확전·장기전 압박 커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18413306_20260304503108.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김성태 “검찰 더러운 XX들…이재명,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여”

호르무즈 봉쇄 직전 한국행 유조선만 ‘유유히 통과’…사진 화제

국방부, 장군 아닌 첫 국방보좌관 임명 나흘 만에 업무배제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39703969_20260304503247.jpg)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팔 잃은 필리핀 노동자와 ‘변호인 이재명’…34년 만의 뭉클한 재회

“유심 교체하고 200만원씩 이체하세요”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향해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코트
![금방 끝날거라며? [그림판] 금방 끝날거라며?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253337001_20260304503536.jpg)
금방 끝날거라며?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