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은 역사다〉
정문태 지음, 아시아네트워크(031-955-1410) 펴냄, 1만7천원
‘현장은 역사다.’
조사 빼고, 달랑 두 단어다. 짧다. 그 느낌이 팽팽하다. 결기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자는 필시 ‘행운아’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역사의 현장’을 한 번이라도 목도했다는 얘기다. 그게 여러 번이라면, 물론 ‘우연’으로 여기기 어렵다.
한편 행운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법이다. 우연이란, 본디 필연의 우화다. 그러니 ‘현장은 역사다’라고 쓸 수 있는 기자는 ‘행운을 만들어낼 행운’을 거머쥔, 그야말로 희대의 행운아다. 부러운가?
그의 현장, 아니 그의 역사는 때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했다. 총·탱크·폭탄·전투기는 차라리 ‘문명’이었다. 야만의 무딘 칼날에 목이 잘려나간 채, 야자나무에 묶여 누이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는 주검. 그 앞에서, 그는 셔텨를 눌렀다. 정문태, 독자들이 그에게 ‘전선기자’란 드문 ‘작위’를 내린 이유이기도 하다.
때로 ‘삐끗’하기도 했다. 1998년 5월 인도네시아 시민·학생들이 불러대는 “노랫소리만 들어도 콧등이 찡”했으면서도, 그들의 ‘무기력함’을 나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1967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군대를 바탕 삼아 빼어난 독재술을 부리며 정치, 경제, 사회는 말할 나위도 없고 종교까지” 주무르던 노회한 수하르토는 그 달이 가기 전에 결국 그 ‘무기력한 힘’에 무릎을 꿇었다. ‘오보’를 내고도 기꺼웠을 터다.
전선기자 정문태가 지난 10여 년 에 실었던 기사를 묶고 갈무리해 냈다. 취재 뒤 바뀐 상황이 있는 경우엔, 하나둘씩 사실을 모아 오늘의 현실에 투영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아체·동티모르·버마·캄보디아·말레이시아·타이의 어제와 오늘을 훑었다. 현대사의 최전선을 떠돌며, 촘촘히 기록한 아시아의 현장이다. 우리의 눈으로 본 우리 이웃의 현대사다.
“네가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네가 충분이 가까이 다가서지 않았기 때문이야.” 사진기자 로버트 카파는 이렇게 말했다. 를 읽다 보면, 충분히 가까이 다가선 기자의 숨소리가 느껴진다. 그가 ‘현장’에서 보내올 다음 ‘역사’가 기다려진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인권을 생각하는 개발 지침서〉
보르 안드레아센·스티븐 마크스 엮음, 양영미·김신 옮김, 후마니타스(02-739-9929) 펴냄, 2만3천원
인권과 개발은 배타적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은 극소수의 부를 증가시키고 많은 이들의 인권과 자유를 제약한다. 경제를 외면한 인권 주장은 도덕적 선언에 그칠 뿐이다. 둘의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책은 인권에 입각한 개발이 어떠해야 할지 정치적·경제적·법적 전략을 제시한다. 공통의 결론에 도달하기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첨예한 이론적·실천적 논쟁 지점을 짚어내고 있다.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
강신주 지음, 동녘(031-955-3005) 펴냄, 1만6천원
현대 시인의 시를 들여다보면서 철학적 고민을 교차시킨다. 김남주의 ‘어떤 관료’라는 시는 한나 아렌트의 과 만난다. 아프리카에서 식인종이 쳐들어와도 충직한 관료로 살아남을 ‘어떤 관료’는, 평범하고 근면했던 아이히만이 유대인 학살의 전범이 되었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은 김춘수의 시 ‘어둠’과 만나고, 오규원의 시는 데리다, 정현종의 시는 메를로퐁티와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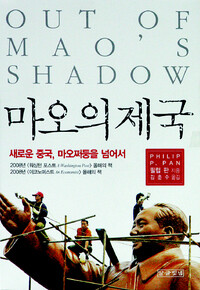
〈마오의 제국〉
필립 판 지음, 김춘수 옮김, 말글빛냄(02-325-5051) 펴냄, 1만6500원
자오쯔양이 죽었다. 그는 1989년 계엄령 선포 당시 시위자들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당 서열 3위의 공산당 총서기였다. 그 뒤 그의 얼굴은 에어브러시로 지워졌고 교과서에서도 이름을 뺐다. 공산당의 그런 노력에도 그의 장례식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2000년부터 8년간 중국 특파원을 지낸 저자가 마오쩌둥 시대의 혼란과 민주화 투쟁을 겪은 중국 인민의 삶을 생생한 필치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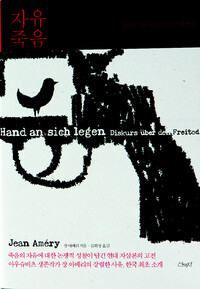
〈자유죽음〉
장 아메리 지음, 김희상 옮김, 산책자(02-3670-1143) 펴냄, 1만5천원
‘자유죽음’은 자살이다. “자유죽음을 미친 짓으로만 몰아세우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자유죽음은 부조리하지만 어리석은 짓은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자는 아우슈비츠에서 생환한 지식인이다. 레지스탕스 활동 중 밀고당하고, 게슈타포에게 붙들리고, 나치 수용소로 끌려다녔다. 그는 이 끔찍한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살았다. 저자는 책을 쓴 2년 뒤 자유죽음을 택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란, 카타르·쿠웨이트·UAE·바레인 미군기지·예루살렘에 미사일”

트럼프, 이란 국민에 “우리 작전 끝나면 정부 장악하라”

이스라엘, 이란 공격 시작…미국도 공격 참가

미·이스라엘 작전명 ‘장엄한 분노’…“이슬람 공화국 체제 붕괴 목표”

장동혁 “2억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송언석, 천영식 8표차 부결에 “당 의원 일부 표결 참여 못해, 사과”

이 대통령 “개 눈에는 뭐만”…‘분당 아파트 시세차익 25억’ 기사 직격

트럼프의 공습 ‘이란 정권교체’ 가능할까…중동 장기광역전 우려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570592077_20260227501013.jpg)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

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 국회 통과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