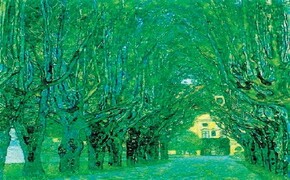구스타보 두다멜. 크레디아 제공
브라보! 비바 두다멜!
전례 없는 열광과 파격이 연주회장을 뒤덮었다. 27살 지휘자와 젊은 악단이 절정의 손길을 거두며 교향곡 4악장을 막 끝내자 청중들은 튕기듯 일어섰다. 함성 지르며 손뼉을 쳤다. 객석 곳곳에 해일처럼 환희의 파도가 물결쳤다.
앙코르타임. 남미풍 ‘맘보’ 리듬에 흥분한 소떼들처럼 꿈틀거리던 악단 단원들이 갑자기 첼로와 더블베이스를 빙글빙글 돌리고, 북채를 들어올렸다 내리더니, 춤을 춘다. 남녀노소 몸 흔들며 화답하는 관객들. 홍익대 앞 인디 록밴드 공연의 후끈한 열기를 클래식 무대에서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12월15일 밤 경기도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과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내한 둘쨋날 공연은 국내 연주회에서 상상도 못했던 요지경의 연속이었다.
두다멜과 악단 단원들은 ‘엘 시스테마’(시스템)라고 불리는 개발도상국 베네수엘라 특유의 빈민층 청소년 음악교육 프로그램 아래서 성장한 이들이다. 애국심과 음악 전도사의 사명으로 뭉친 그들 연주는 한마디로 ‘일사불란한 과속’이었다. 쉴 새 없이 가속 페달을 밟는 카레이서처럼, 애국가와 베네수엘라 국가, 라벨의 발레곡 , 아마존 열대수림 분위기가 풍기는 베네수엘라 작곡가 카스테야노스의 모음곡 로 이어진 전반부가 휙휙 지나갔다. 후반부 메뉴가 뜻밖이다. 남미적 열정과 전혀 다른 러시아 동토의 서정이 가득한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전날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서 ‘방방 뜨는’ 번스타인 뮤지컬 의 ‘심포닉 댄스’와 죽음의 고뇌 어린 말러 을 전·후반에 대비해 연주했던 것과 거의 같은 얼개다.
차이콥스키 은 옛 소련의 거장 므라빈스키와 베를린필의 제왕 카라얀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지휘한 곡들이다. 므라빈스키의 강철 성채 같은 구성미와 카라얀의 세련되고 우아한 서정이 뇌리에 박힌 이 명곡을 두다멜과 악단은 젊은 혈기에 기대어 브라스밴드 같은 합주력으로 마구 내질러갔다. 운명에 울부짖으며 맞서는 기세를 우울한 플루트 선율로 시작하는 1악장의 주제부가 다소곳이 흐른 것도 잠시. 2악장 호른 서주와 주제의 격정적 전환, 3악장의 경쾌한 왈츠, 급기야 4악장 말미에서 절규하며 쏟아내는 금관, 현악의 총주를 통해 1악장의 음울한 주제가 벅찬 생명력의 송가로 변주되는 순간까지 스피드는 거침없었다. 폭주기관차 같은 박력과 6관 대편성의 압도적 음량으로 이제껏 본적 없는 왁자지껄 장터 같은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빚어냈다. 요란한 리듬감 차오르는 차이콥스키다.
아마존 우림을 연상시키는 카스테야노스 모음곡의 리듬감 앞에 앳된 현악 주자들은 움찔움찔 떨었다. 새콤한 신맛 나는 라벨의 발레곡을 갖가지 표정 지으며 들려주는 10대 연주자들은 흡사 그리스 신화의 악동격인 사티로스 같았다. 앙코르에서 자기네 국기 그려진 점퍼를 갈아입었다가 내던지는 혈기방장함이란! 절제감 없어도 박력 가득한 `연주쇼'는 보기에 즐거웠고, 물씬 사람내가 났다. 리더 두다멜은 연주 뒤 단원을 소개하면서 일일이 각 주자 자리로 옮겨다니며 어깨동무 하고, 툭툭 치는 장난을 쳤다.
사실 악단 연주는 합주력을 빼고는 음색이나 구성의 긴밀도 등에서 빼어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50년대 거장들처럼 지나치게 격정적인 두다멜의 연주 스타일을 두고 최근 다분히 과대포장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기실 관객들이 들뜬 건 퍼포먼스풍 연주를 통해 두다멜과 단원들이 악흥의 순간들을 삶의 일부로 즐기고 있음을 드러냈기 때문일 것이다. 들끓는 젊음이 세기말적인 유럽 낭만 음악과 남미의 열정적 감수성을 융합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공동체 정신 머금은 유쾌한 음악 바이러스가 관객의 신명을 깨운 것이다. 빈민 아이들에게 원하면 악기를 쥐어주고, 하고 싶은 연주를 가르치면서, 세상을 바꿀 시야를 틔워준 엘 시스테마의 자유 정신이 거기에 숨쉬고 있었다. 200명 가까운 연주자들이 출동한 대편성 연주가 시종 신명과 자신감으로 충만한 것도 짐작이 갔다. 휴식시간 만난 단원들은 공연장 로비에서 장난하면서 담배를 빠느라 정신이 없었다.
고약하게도 연주회 끝물에 청중의 환성이 야유로 들리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고독한 엘리트 교육 코스에 올인하는 한국에서 클래식 연주자로 배우는 길은 청춘을 파묻는 고행이다. 테크닉 중심의 학원과 개인지도의 쳇바퀴 속에서 일상의 관계를 단절하고, 입시 혹은 외로운 장인의 길로 신음하며 돌진해간다. 음악을 즐겁게 살고, 호흡하지 않는다면, 의 ‘S오케’나 시몬 볼리바르 같은 악단이 국내에 등장할 길은 요원하다. 강마에가 일갈한 ‘똥덩어리’란 말과 “곳곳에 음악을 흩뿌리는 것은 나의 아름다운 책임”이라는 두다멜의 한마디가 머릿 속에서 시종 뒤섞여 맴돌았다.
노형석 한겨레 대중문화팀장 nuge@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미 공중급유기, 이라크 상공서 추락…“적군 공격·오인사격 아냐”

“아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60일된 딸 둔 가장 뇌사 장기기증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한준호 “김어준, 사과·재발방지해야”…김어준 “고소·고발, 무고로 맞설 것”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정청래 “검찰개혁, 이 정부·민주당의 깃발…제가 물밑 조율”

박지원 “레거시 언론과 언어 차이”…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 제기 두둔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련 조사 개시…한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