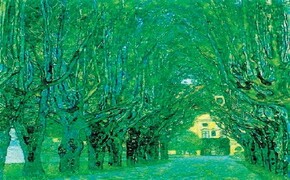“당신 머리는 내 거야… 네 입에 키스했어, 요한… 네 입술에서 쓴맛이 나. 피맛이었나?”
대사가 부르르 떨린다. 목 잘린 예언자 요한의 머리를 쓰다듬고 입맞춤한 살로메의 외침. 그 광기의 질감이 뜻밖에 차갑다.
지난 10월2~5일 서울 LG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립오페라단의 국내 초연작 는 보러 갈 때와 보고 나올 때가 달랐다. 애초 를 찾았던 건 주인공인 요녀 살로메, 그의 에로틱한 자태가 고루한 한국 땅에서 어떻게 탈바꿈할까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이 오페라를 만든 ‘영혼 없는 천재’였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세기말 광기는 기실 이 땅에서 고개를 숙인 격이 됐다. 슈트라우스의 살로메는 베일을 두르고 춤추다 벗어던지고 알몸이 되는 ‘스트립 댄서’였지만, 이번에 공연된 에서는 의붓아버지 헤로데왕이 대신 붉은 팬츠의 반알몸으로 나왔다.

<살로메>
살로메는 성서에서 어머니의 꼬드김으로 의붓아버지에게 예언자의 목을 베라고 부탁한 엽기적 ‘효녀’였지만, 세기말에 탐닉했던 영국 문필가 오스카 와일드와 그의 추종자 슈트라우스는 연극과 오페라를 통해 진짜 색에 미친 요부로 살로메의 성격을 못박아버린다. 이 포르노 같은 오페라를 대할 때 흔히 살로메 역의 가수가 얼마나 벗느냐, 얼마나 야하게 춤추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르곤 하지만, 이번 무대를 만든 베네수엘라 출신의 젊은 연출가 카를로스 바그너는 살로메를 광신자 요한에게 상처받는 순박한 소녀로 설정했다. 그렇다면 이 오페라의 광기는 어디서 실마리를 찾을까. 미니멀한 기하학적 형상의 무대 배경과 소품의 이미지들이 바로 살로메의 변신을 돕는 광기의 장치였다. 그 깔끔한 공간에서 음산한 감각이 뿜어져나오는 것이다.
3일 공연에 한한다면, 배우들의 연기는 미흡해 보였다. 낯선 독일어 대사에 엽기적 감정, 소녀에서 요한의 육체에 집착하는 괴물로 살로메가 변신해가는 감정의 농도를 다 계산해 넣기란 한국인으로서는 과유불급이었을 거란 짐작도 간다. 두 주인공 요한과 살로메의 연기는 특히 초·중반부에 힘들어 보였다. 십자가처럼 끌어올려졌다가 내려오면서 등장하는 요한과 뒤이은 살로메의 유혹, 이를 뿌리치는 요한의 신에서 주인공들은 뻣뻣한 토막처럼 어깨힘만 주고 대사를 외치거나, 감정이 실리지 않은 표정, 발성의 미약함 등을 드러냈다. 독일인 성악가가 분한, 알몸에 빨간 팬티만 입고 흰 털망토를 두른 헤로데왕은 쩌렁쩌렁한 발성과 미묘한 심리 변화까지 거침없이 표출했다.
배우보다 더욱 뚜렷한 소리를 낸 것은 무대였다. 불안하게 기울어진 왕궁의 소품벽, 원통을 비스듬히 뚝 자른 우물 감옥, 그 안에서 쇠줄에 묶여 예수처럼 올라오는 누더기 성자 요한, 궁전으로 올라가는 불안한 오르막의 사선형 계단 등등…. 그 차가운 기하학적 소품들이 인물들의 불안정한 심리, 혼란상을 깔끔하게 다듬어주었다. 얼굴에 분칠하고 빨간 옷을 입은, 좀비 같은 주역 사이의 조연인 유대인들은 공간이 좀 헐렁할라치면 어김없이 기울어진 궁전 벽의 창문을 열고 관음증을 표출하면서 극에 긴장을 불어넣어 주었다.
살로메는 극의 막바지 요한의 육체를 무작정 가지려는 욕망에 집착하다 악마적 괴물로 변해간다. 헤로데왕에게 그의 목을 베어달라고 요구하고는, 빙글빙글 춤추고, 헤로데왕과의 성희를 암시하는 숨바꼭질과 좀비 유대인들의 맥주병 세례 속에, 마지막 부분에서 절규하듯 요한의 머리통을 어루만진다. 머리를 싼 보자기를 끌고 다니며 저주 같은 사랑의 언사를 뱉는다. 보자기에 싸인, 베어진 요한의 목을 희롱한다. 애무가 아니라, 물체를 만지고 집착하는 행위다. 일종의 페티시겠지만, 거기에는 섬뜩하게 물화된 시선이 어려 있다. 영혼의 교감이 없는 소유욕은 채워지지 않고, 넋두리를 보다 못한 헤로데왕의 단말마적인 지시로 극은 갑자기 끝나버린다. “그년을 죽여!”
요한의 머리에 대한 살로메의 집착, 등장인물들 사이의 일방적 시선을 더욱 강조하는 바그너의 는 소유의 집착에 죽음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공연이 끝날 무렵 필자는 관능의 매혹 대신 엉뚱하게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떠올리고 있었다. 바그너의 무대는 그 자체로 소유의 집착과 물화의 과정이 죽음과 파멸을 낳는다고 웅변한다. 금융위기 또한 이런 죽음의 이미지와 잇닿는 계량화의 비극에서 시작됐다. 실체가 없는 미래의 예상 수익에 이윤 명분을 붙인 금융 파생상품에 올인하다 신용위기를 부른 건 결국 영혼의 교감 없는 집착의 종말과 다를 바 없다. 세계가 통째로 구제금융 상황에 들어갈 것이란 비관론으로 술렁거리는 지금, 슈트라우스가 요부로 낙인찍은 살로메가 천하 색녀가 아니라 지금 세태에 대한 선지자처럼 느껴지는 건 필자가 쓸데없이 예민한 탓도 있을 터다. 아무렴.
노형석 한겨레 대중문화팀장 nuge@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신고하세요”…“여기요! 1976원” 댓글 봇물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948569591_20260312502255.jpg)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