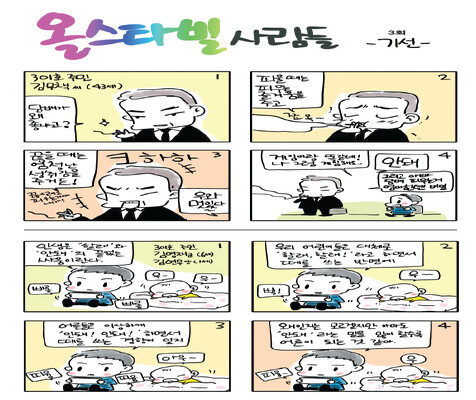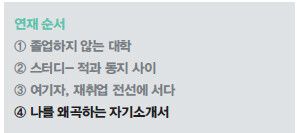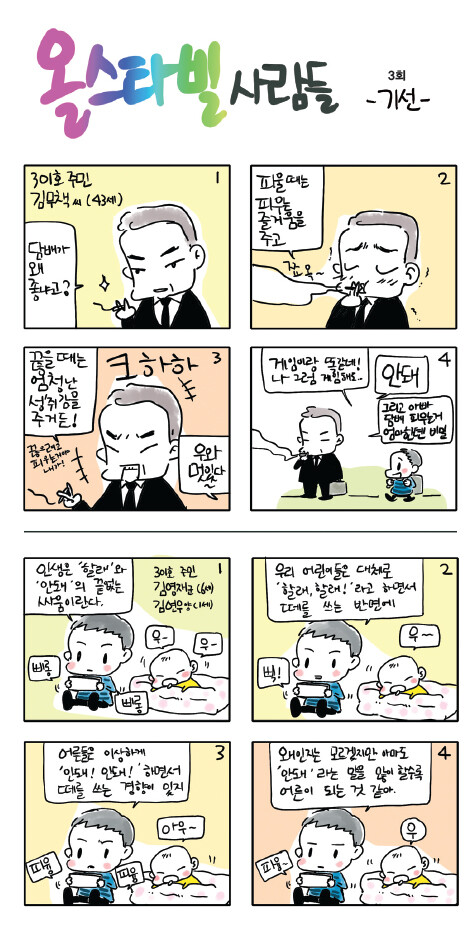
1
“사~공의 뱃노래 가아무~울거~어리면/ 삼하~악도 파도 깊이 스며~드느~은데/ 부두의 새아~악시 아롱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얼움.”
그 시절 야구장엔 늘 이 노래가 울려퍼졌다. 관중은 경기가 진행 중일 때는 관중석에서, 경기가 끝나면 주변 도로에서까지 이 노래로 목청을 돋웠다. 호남인의 영원한 애창곡 이다.
1982년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래 1990년대 중·후반 어느 때까지 펼쳐졌던 광주 무등야구장 풍경이다. 사람들은 홈팀인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를 응원하면서 이 노래를 열창했다. ‘김봉연이 홈런을 치거나, 김성한이 안타를 치거나, 선동열이 삼진을 잡거나, 이종범이 도루를 하거나’ 하면 어김없이 불렀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삼삼오오 노래를 부르며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해태의 전성시대였다. 김봉연·김성한·김종모·선동열·이종범 등 불세출의 스타가 즐비한 해태를 당해낼 팀이 없었다. 이 기간에 무려 9차례나 한국시리즈를 제패했으니 가히 ‘해태왕조’라 할 만했다. 연전연승하는 해태의 성적에 따라 노랫가락도 더욱 힘이 났다. 해태의 경기가 있는 날 야구장 주변은 밤늦도록 로 흠뻑 젖곤 했다.
무등야구장과 . 왠지 어색할 것 같으면서도 친근해 보이는 이 조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냥 둘만 놓고 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하지만 여기에 해태와 호남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넣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야구장에서 부르는 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었다. 홈팀 해태의 승리를 염원하는 응원가이자 수십 년간 소외되고 핍박받아온 호남인들의 울분이었다. 호남인의 한이었고 눈물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을 부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흠모하기도 했다. 호남인들의 정치적 소외와 설움의 상징인 김대중을 야구장에서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해태 야구의 승리를 통해 그 설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으니까. 해태와 무등야구장, 김대중은 당시 호남인들에겐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이었던 셈이다. 공교롭게도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달성한 이후엔 그 노랫가락을 듣는 게 쉽지 않아졌다. 또 2000년대 들어 신세대 관람문화가 자리잡으면서부터는 그 명맥조차 희미해지고 말았으니 ‘격세지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이후에는 이곳에서 더는 을 들을 수 없게 됐다. 지난 10월4일 열린 KIA 타이거즈의 2013년 시즌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무등야구장 시대가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32년간 해태·KIA와 함께했던 영욕의 시간을 뒤로하고, 2014년 시즌부터는 홈구장 지위를 바로 옆 ‘챔피언스 필드’(신축)에 내주기로 했다. ‘새 야구장 건설’이라는 광주시민의 염원이 이뤄져 다행이긴 해도, 왠지 가슴 한켠이 휑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물론 새 야구장에서도 가끔은 이 불릴 것이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이니 언제든 관중석에서 흘러나올 수 있을 게다. 하지만 그 감흥이 1980~90년대 무등야구장의 그것과 같을지는 모르겠다. 한동안 무등야구장이 많이 그리워질 것 같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미 국방 “오늘 이란 공격 가장 격렬할 것”…전투기·폭격기 총동원 예고

‘국힘 당원’ 전한길 “황교안 보선 나왔으니 국힘은 후보 내지 마”

이란 안보수장 “트럼프,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0/53_17731217429546_20260127500444.jpg)
[단독] 조희대 대법, ‘재판소원법’ 대응 TF 꾸린다…헌재도 실무 준비

‘명태균·김영선 무죄’ 선고 판사, ‘해외 골프 접대’로 500만원 벌금

“김정은 ‘두 국가’ 선언은 생존전략…전쟁 위험 극적으로 줄었다”

이란 모지타바, 아버지의 ‘핵무기 금지 파트와’ 깨고 핵무기 가지나

윤석열 “출마하시라 나가서 싸우라”…선고 다음날 ‘내란 재판 변호인’ 독려

문형배 “법왜곡죄, 국회 입법 존중해야…나도 고발 여러 번 당했다”

‘초등학교 폭격’ 난타 당한 트럼프…“이란에 토마호크 판 적 없는데 무슨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