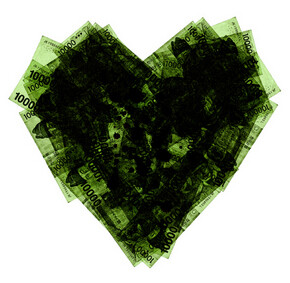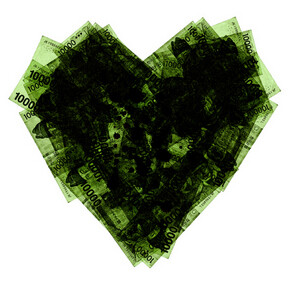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인류의 역사를 통으로 살피는 절대적 평가는 불가능하지만, ‘어울려살기’가 곳곳에서 새로운 궁지로 내몰리는 게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다. 이념갈등이 식는가 했더니 종족갈등이 분출하고, 계급갈등이 옛일인가 싶으면 부(富)를 계층화한 신(新)신분제가 맨망스레 암약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60년의 분단사 속에 외틀리고 버성긴 자매형제들의 어울려살기조차 요원하고, 사회적 재부(財富)에 비해 놀랍도록 남성중심적 터에 여자와 남자의 어울려살기도 먼 길이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공동체적 지혜를 유실한 근대국가의 자생력은 부득불 ‘통합’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종교나 정치 이데올로기가 그런 용도로 쓰이고, 도덕과 관습도 실은 내용과 무관하게 통합적 통치에 유용하다. 알다시피 이런 통합용 장치가 그 수명을 다하거나 내파되면서 자유와 분열의 시속(時俗)은 끝 간 데가 없다. 그것이 개성이고, 창의력이고, 진보의 일종으로 호도되기도 한다. 가령 ‘녹색성장’이라는 말처럼, 지혜도 성장주의 코드로부터 뒤처지면 먹히지 않는다. 얼핏 박정희식 성장주의의 환상이 통합 기제로는 수명을 다한 듯도 하지만, 신성장주의의 튀기들은 여전히 그 위세가 등등하며, “관료화와 합리적 성장주의라는 점에서는 좌우가 같다”(베버)는 지적처럼, ‘성장, 더 성장, 또 성장, 새로운 성장’이라는 이념에는 동서남북이나 신구의 차이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통합 이념으로 작동하는 자본제적 성장주의에도 빈틈은 있다. 왜냐하면 성장의 환상이나 그 수확의 이익만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섞사귀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성장의 이익에 대한 청사진은 물론이거니와 이른바 그 수확의 ‘분배정의’로도 현명한 통합을 약속하긴 어렵다. “공동작업의 이익만으로 인간을 결속할 수 없으므로 리비도를 통해 묶어야 한다”(프로이트)는 권고처럼, ‘사람은 빵만으론 살 수 없고 사랑의 말씀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등 따습고 배부른 뒤에도 사랑의 결속을 통해서야 비로소 섞사귀면서 생산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셔널리즘에서 사이비 종교의 교주에 이르기까지 ‘사랑’은 아교처럼 성장과 분배의 건축이 남긴 틈을 메운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의 틈을 메우려는 사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거꾸로 자본에 예속돼간다는 점에 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근년의 이혼율이나 동거 풍속은 혼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고장났다는 사실, 그리고 사회적 통합력으로서의 구실에 구멍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린다. 이슬람권 국가들이나 북한 등을 빼면, 국가조차 일종의 기업으로 변신한 지금 거의 유일한 사회통합적 기제는 자본의 포괄적 규제력뿐인 듯싶다. 종교도 자본과 경합하지 못한 지 오래됐다. 제도권 인문학은 차라리 국가와 기업의 지배를 반기는 눈치다. 혼인제도와 사랑의 문화는 말할 것도 없이 자본제적 체제의 변명이자 장식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 자의와 방종의 세속 속에서 어울려살기의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 “자본주의 체제는 합리성의 구현”(베버)이며, “개인의 열정은 위험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하고 안전한 것”(A. 허시먼)이라는 진단에 맡기는 것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한물간 패션 같은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헤치고 이미 자본의 하수인이 된 사랑을 건져내야 할까?
김영민 한신대 교수·철학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파면’ 김현태 극우 본색 “전한길 선생님 감사합니다…계엄은 합법”

장동혁, ‘한동훈계’ 솎아내기 수순?…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에 시끌

장동혁 “이 대통령에 단독회담 요청…16살로 선거 연령 낮추자”

국회 재경위, 트럼프 관세 압박 빌미된 ‘대미투자법’ 설 전 상정 논의
![현대차노조 ‘아틀라스’ 무조건 반대? NO…일자리 충격 해법은 [뉴스AS] 현대차노조 ‘아틀라스’ 무조건 반대? NO…일자리 충격 해법은 [뉴스A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4/53_17701549929584_20260203503847.jpg)
현대차노조 ‘아틀라스’ 무조건 반대? NO…일자리 충격 해법은 [뉴스AS]
![[단독] 퇴근하려는데 “우리 남편 밥 차려”…강요된 1인2역 필리핀 도우미 [단독] 퇴근하려는데 “우리 남편 밥 차려”…강요된 1인2역 필리핀 도우미](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4/53_17701861372936_20260204502539.jpg)
[단독] 퇴근하려는데 “우리 남편 밥 차려”…강요된 1인2역 필리핀 도우미

이 대통령 또 “연명치료 중단하면 인센티브 주자” 제안

막말 이하상, 이진관 판사가 직접 ‘감치’ 지휘…김용현 쪽 “나치 경찰이냐”
![4398번은 오늘도 감사 또 감사 [그림판] 4398번은 오늘도 감사 또 감사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03/20260203503629.jpg)
4398번은 오늘도 감사 또 감사 [그림판]

이 대통령, ‘KBS 이사 7인 임명 취소 판결’ 항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