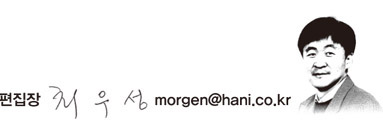
“나를 불법 수사했던 검사들 목소리를 듣고 싶다.”
2월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 지 꼭 23년 만이다. 오래전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저지른 대표적 범죄 사건이 일단락되는 순간이었다. 정작 당사자의 입에선 무뚝뚝한 반응만 나왔다. 훌쩍 흘러버린 23년의 세월이 덧씌운 무게는 어쩌면 그랬을 것이리라, 감히 상상해본다.
그날은 어린이날이었다. 1991년 5월5일 1면엔 큼지막한 기고문이 실렸다. 제목은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우라’.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는 어린이날과는 묘한 조합이었다. 글쓴이는 197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처럼 굳어진 시인. 독설과 핍박, 저항과 탄압의 아이콘이었던 시인은 세상을, 정확히는 ‘정권에 도전하고 나선 철부지들’을 거침없이 후려쳤다. 이틀 뒤엔 또 한 명의 ‘어른’이 버럭 소리를 높였다.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 총장 자리와는 전혀 어울릴 법하지 않은 격식 파괴 행보와 돌직구 발언으로 유명세를 타던 인물의 입에선 “우리 사회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섬뜩하되 실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희대의 망언이 튀어나왔다. 세상이 그랬다.
지독히도 암울한 시절이었다. 직접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노태우 정권은 하루아침에 3당 합당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되돌려놓고 말았다. 명지대생 강경대가 시위 도중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이후,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캄캄한 터널 속 그 자체였다. 전남대생 박승희, 안동대생 김영균, 경원대생 천세용…. 이틀 간격으로 꽃다운 젊은이들이 수없이 제 몸을 불사르며 꽉 막힌 세상에 분노했다. 여당과 보수 언론은 ‘분신정국’이란 이름을 끌어다 붙였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성균관대생 김귀정은 시위 도중 진압 경찰에 깔려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다. 탄압의 발길이 학생들만 향한 건 아니다. 당시 한진중공업의 박창수 노조위원장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는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자 경찰은 주검이 안치된 병원 영안실 벽을 뚫고 들어와 주검을 탈취하는 몹쓸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이 와중이었다. 그해 5월8일 재야단체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김기설 사회부장이 분신 사망하자, 공안정권의 어두운 그림자는 드디어 제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시작했다. 군사정권을 지탱했던 군과 정보기관의 위세가 잠시 잦아든 사이, 그 자리를 재빨리 꿰찬 건 바로 권력에 빌붙은 검찰 몫이었다. 검찰은 숨진 김씨의 전민련 동료인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며 전격 구속했다. 앞서 시인과 총장이 군불을 땐 ‘죽음의 배후 세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문득 지난주 이 지면에서 밝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판결 건이 떠올랐다. 다시 한번 이 지면을 빌려 기록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맨위로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노모 집 찾은 ‘주택 6채’ 장동혁 “대통령 때문에 불효자는 운다”

‘사형 구형’ 윤석열, ‘운명의 19일’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

윤상현 “윤석열, 대국민 사과해야”…민주 “과거 본인 행동부터”

“‘김주애 후계’ 공식화하면 고모 김여정 반기 가능성”

‘첫 올림픽’ 김길리, 불운 딛고 1000m 동메달 따냈다

붕어 좀 잡아먹는다고 유해조수라니…1급 위기종 수달의 서글픔

전두환·박근혜·윤석열…국힘 당사에 사진 걸라고?

쉬지 말고 노세요…은퇴 뒤 ‘돈 없이’ 노는 법

‘이 대통령 피습사건’ 수사 경찰, ‘테러 미지정’ 김상민 전 검사 압수수색

이 대통령, ‘주택 6채’ 장동혁에 “다주택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