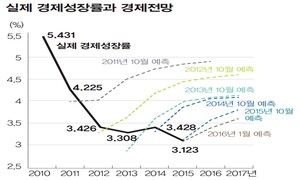일터의 풍경이 을씨년스럽다. 늦가을의 쓸쓸함 때문에 만사가 그리 보이는 탓도 있겠지만, 이런 계절적 소회를 애써 제쳐두더라도 막막한 느낌은 넓고도 깊다. 한쪽에서는 정년 보장과 청년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임금피크제라는 ‘신의 한 수’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를 마치 나의 일처럼 성심껏 지지해왔던 어느 신문사의 노조는 “월급에서 자존심이 나온다”라며 획기적인 임금 인상을 주장한다. 게다가 연공급 임금체계의 대표 주자인 정부가 자신의 ‘마법의 지팡이’를 직접 사용하여 모범을 보이려 한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기업은 비용 절감 폭과 보조금 액수를 계산하느라 분주하다. 신규 고용 소식은 아직 멀다.
이 모든 것의 결과를 온전히 껴안아야 하는 노동자들은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 혹독한 겨울 끝에 꽃피는 봄이 온다고 하는데, 이런 봄노래는 어찌나 친숙한지 믿음이 가질 않는다. ‘고진감래’라는 말도 그렇다. 이 말을 외치는 이들에게는 달짝지근한 열매를 가져다주고, 그 고통을 감내한 이들에게는 쓴맛만 남겨주지 않았나. 게다가 드라마 (JTBC)에서 구고신이 내뱉은 송곳 같은 말은 을씨년스러움을 더한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너도 그 높은 곳에 서보면 똑같아질 것이라는 야유다. 어디서 보든 모든 풍경이 뿌옇게 되는, 바야흐로 삭풍의 계절이다.

기업이 노동자의 자리에 서보면 풍경은 달라진다. 인간의 온갖 감정이 녹아 있는 일터의 낮은 곳에서 기업은 의외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만화 <송곳> 갈무리
그래도 따져보려 한다. 지금 부는 바람으로 단련되면 꽃을 피우는 것인지, 아니면 뿌리마저 잘라버려 황무지의 봄이 오는 것인지 물어본다. 구고신에게는 참으로 쓸모없는 일이겠으나, 지금이라도 일터의 낮은 곳으로 내려와 그곳의 풍경을 바라보았으면 한다. 위쪽에서 본 풍경에 취해 벌이는 일들은 그쪽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다지 이로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몇 가지 풍경만 들여다보려 한다.
임금을 삭감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이야 경제학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원리다. 임금 비용에서 여유가 생기면, 기업이 살뜰하게 그 돈으로 고용을 늘린다는 얘기다. 실제로 그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해두자. 하지만 낮은 일터의 풍경에는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 노동자들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반응한다. 임금 삭감 소식에 노동자의 의욕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예전보다 못하게 된다. 기업과 정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제각각이기 마련인 경제학 실험 연구에서 드물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현상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뷸리(T. Bewley)는 노조가 아니라 기업이 임금 삭감을 더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임금 삭감을 통한 비용 절감보다는 생산성 감소에 따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이 이토록 변하는 이유는 노동이 다름 아닌 인간의 일이기 때문이다. 머리와 심장 그리고 근육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각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한 인간으로서 노동자의 생산성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이 하기 나름이기도 하다. 똑같은 노동자가 어느 기업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노동자만 겁박할 일은 아닌 것이다.
물론 노동자의 생산성 폭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꼼꼼하게 감시하는 방법도 있다. 직원들이 ‘농땡이’를 부리지 않고, 직장에 있는 일분일초도 오로지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감시 장치를 도입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경우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가령 인터넷 사용이 기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하지만, 혹 사사로운 용도로 사용되어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고 믿는 기업이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일일이 감시하고 ‘부절적한 사용’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보자. 이런 상황에 대한 연구 결과는 놀랍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하다. 우선 직원들은 인터넷 사용에 좀더 조심해진다. 성과라고 한다면 성과다. 하지만 기업이 자신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직원들의 업무 능률은 떨어진다.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다. 설령 그렇게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무릅쓰고 저항하는 이들도 나온다. 의 유명한 대사처럼, “분명 하나쯤 뚫고 나온다.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 결과적으로 기업으로서는 손해다.
최근에는 눈부신 기술 발전 덕분에 노동자에게 어떤 ‘빈틈’도 주지 않겠다는 전략도 한 단계 진전했다. 어마무시한 정보 수집 기법과 현란한 데이터 분석으로 인해 노동자의 숨소리 하나마저 섬세하게 챙길 수 있다. 예컨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개발한 소시오메트릭(sociometric) 배지는 직원들의 목에 출입증처럼 달려 있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낱낱이 기록한다. 위치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팔을 움직이는 방향까지 기록한다(다만 대화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 20세기 초, 테일러가 노동자 한 명을 데려다가 동작과 시간을 기록하며 연구하여, 노동자를 꼼짝 못하게 만든 테일러주의는 이제 마치 구석기 유물같이 느껴질 정도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디지털 테일러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의외였다. 흔한 상식으로 치자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커피 마시는 시간과 잡담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겠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휴식 시간을 교대로 갖는 것이 좋겠다. 저 무시무시한 배지를 달고 있으니, 직원들은 더 눈치를 살피고 책상 앞에 꼭 붙어 있을 것이다. 그런 직원의 개인적 실적은 당연히 높아지겠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인 팀은 단체로 빈번하게 만나 잡담을 나눈 팀이었다. 대화 내용도 회사 일과는 관계없는, 그야말로 소소한 일상에 관한 가장 ‘비생산적인’ 내용이었다. 일터의 풍경을 그제야 보게 된 기업들은 부랴부랴 단체 휴식 기간을 만들었고, 소시오메트릭 배지를 통해 모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직원들이 좀더 편안하게 자주 잡담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재배치했다. 가장 ‘비생산적인’ 시간이 결과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었던 것이다.
물론 정반대에 서 있는 기업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마존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실적 자료를 무기로 삼았다. 실적 부진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가족 사정이나 건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오로지 무쇠 덩어리처럼 살아남는 자만 키우겠다는 전략인데, 어느 아마존 퇴직자는 이를 ‘의식적인 다윈주의’(Purposeful Darwinism)라고 불렀다. 복도 구석에선 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직원들은 끊임없이 나가고 새로운 이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여성들이 버티기에는 특히 힘들었다. 아마존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건 기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고 변명할 수는 없다.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엄연한 선택이었다. 다른 선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회사 ‘그래비티페이먼츠’는 최저임금을 7만달러로 인상했다. 100만달러 연봉을 받던 이 기업의 대표 댄 프라이스는 ‘일터의 낮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눈 뒤 이같은 결정을 했다. 회사의 생산은 늘고 매출과 이윤도 늘었다. 그래비티페이먼츠 홈페이지 갈무리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의 자리에 서보면 풍경은 달라진다. 그 풍경은 낯설지만 긴 호흡으로 세세히 들여다보면 기업의 길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열리곤 한다. 최근 널리 회자된 댄 프라이스라는 젊은 기업인을 생각해보자. 그는 아주 성공적인 신용카드 결제회사를 운영하면서 100만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아왔다. 기업도 성공적이고 자신도 행복하니 모든 직원들이 다 행복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우연히 바깥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면서 휴식 중인 직원을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그의 팍팍한 생활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시장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그 직원은 “그게 너희들 수법”이라고 시큰둥하게 쏘아붙였다. 문득 프라이스는 홀로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전 직원의 최저임금을 7만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상 폭이었다. 이런 획기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 그는 자신의 100만달러짜리 연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했다.
그러면 7만달러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프라이스는 연구의 힘을 빌렸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과 올해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이 2010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였다. 대규모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그들은 소득이 높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었다. “돈이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득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적용되는 얘기이고, 이 소득임계점에 미치지 못하면 돈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 소득임계점이 바로 7만달러 내외(정확히는 7만5천달러)였다. 조사 당시 이 소득수준에 못 미치는 가계가 절반을 넘었다.
말이 많았다. 젊은 치기라고 하기도 했고,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나치게 평등한 임금구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서 몇몇 직원이 직장을 떠났을 때 언론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포격을 해대었다. 같이 회사를 설립한 동생은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했다고 그를 고발해버렸다. 하지만 프라이스의 회사는 끄떡없었다.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는 높아져 생산성은 높아졌고, 고객들도 몰려들었다. 매출도 늘고 이윤도 늘었다. 성장가도에 불이 붙었다. 프라이스는 자신의 결정이 ‘도덕적 명령’ 때문이지 결코 ‘기업 전략’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전자를 후자보다 앞세워 둘 다 얻었다.
프라이스의 ‘뜻하지 않은’ 성공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니다. 일터의 낮은 곳으로 가면 거기에는 온갖 감정을 가진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저기 높은 곳처럼 수십억원이 날아다니는 대단한 곳은 아니지만, 그곳에도 감동과 좌절이 있다. 돈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절박함이 있다. 그래서 낮은 일터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감동한다.
이런 실험이 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을 뽑는데, 임금은 세 가지로 제각각이다. 물론 채용된 직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첫째는 시간당 3달러, 둘째는 시간당 4달러다. 셋째는 앞선 두 가지의 변형이다. 우선 시간당 3달러라고 하고서는, 일을 하기 직전에 1달러 인상됐다고 알리는 방식이다(3+1 방식). 결과는 어땠을까?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4달러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나 3+1 방식은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노동자는 달리 반응한다. 3+1 방식으로 일한 사람들의 생산성은 한꺼번에 4달러를 받은 이들의 생산성보다 무려 20%나 높았다.
이를 ‘조삼모사’의 어리석음이라 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실험이 시사하는 것은 ‘얼마를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주느냐’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기업의 선의가 느껴지면 노동자도 선의로 반응한다. 만일 월급 인상을 하더라도 생색내듯이 뜨악하게 한다면, 노동자도 같이 시큰둥하게 반응한다. 같은 월급 인상이라 하더라도 ‘인간적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연인에게 주는 생일 선물을 생각해보자. 연례행사처럼 하나 툭 던져주는 것보다 ‘서프라이즈’가 효과적이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따지고 보면, 조삼모사도 원숭이의 합리적 주장을 유연하게 받아들인 저공이라는 자의 유연한 소통법을 말하는 것 아닌가.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이윤을 올리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는 게 능사가 아니다. 노동자를 감동시키고도 기업은 쑥쑥 자랄 수 있다. 그런 기업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다. 그러려면 서는 곳을 달리하면 된다. 그러면 풍경도 달라진다. 내려오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정책이 무엇이겠는가. 그들이 내려와서 그 좋은 경치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정책이다. 위에서 휘젓고 소리 질러봐야, 삭풍만 휘몰아칠 뿐이다.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감동받고 싶다.
1. Alexander K. Koch and Julia Nafziger 2015, “A real-effect experiment on gift exchange with temptation”, IZA DP NO. 9084
2. John A. List and Imran Rasul 2011, “Field experiments in labor economic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ume 4a.
3. Daniel Kahnemen and Angus Deaton 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944762/)
4. Duncan S. Gilchrist, Michael Luca, and Deepak Malhotra, 2015, “When 3+1>4: Gift structure and reciprocity in the field”, Harvard Business School NOM Unit Working Paper No. 14-030
5. World Bank 2015, World Development Report 2015: Mind, society and behavior, Washington DC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미 국방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외모 훼손됐을 것”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이란, 두바이금융센터 공격…신한·우리은행 지점 있지만 인명 피해 없어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신고하세요”…“여기요! 1976원” 댓글 봇물

홍익표 정무수석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