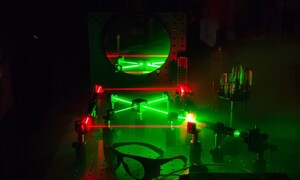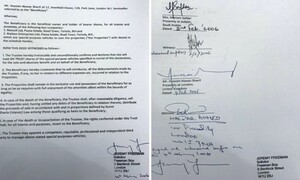‘우버’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쾌적한 실내, 친절한 운전기사,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 덕분이다. 택시요금보다 2배는 비싸다지만, 그게 대수인가. 흔히 먹는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가끔 기분전환 삼아 찾는 ‘프랑스 코스요리’라 생각하니 감수할 만하다. 그 반대편엔 불친절과 불안, 불쾌함의 대명사로 굳어진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기존 택시사업자들에게 우버는 ‘굴러온 돌’이다. 까다로운 절차와 적잖은 돈을 투자해 면허를 얻은 택시기사 눈에 우버는 규제 틈새를 파고든 불법 서비스요, 팍팍한 살림과 치열한 경쟁에 숟가락을 얹은 무임승차 서비스일 뿐이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우버를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우버가 36번째로 시동을 건 도시, 서울도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우버에 제동을 걸었다.
우버는 현행법상 불법인가 아닌가. 이걸 따지는 건 나중 일이다. 우버는 불법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던질 질문은 따로 있다. 우버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버 같은 서비스를 어떻게 기존 제도에 조화롭게 수용할 것인가.
서비스만 놓고 보면 우버는 택시 서비스의 바람직한 미래로 보인다. 과속과 불친절, 불쾌함이 응축된 택시를 어떤 시민이 반기겠는가. 우버는 그런 점에서 고급 콜택시에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꺼낸다는 점을 보여줬다. 우버에 자극받은 기존 택시 서비스의 품질이 덩달아 올라가는 효과도 기대된다. 우버를 둘러싼 논란들, 예컨대 ‘택시 자격증 없이 영업을 한다’거나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엔 세금 한 푼 안 낸다’는 비난이 과연 우버 탓인가. 변하는 기술과 서비스와 공존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할 일이다.
하지만 이처럼 바람직한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버 계기판엔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우버는 애당초 유휴 자원을 선순환시켜 수익도 함께 도모하고 자원 낭비도 막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나 실제 우버는 개인 대신 리무진 사업자 같은 기존 기업용 서비스와 손잡았다. 최근엔 자가용이 없는 전문 대리운전 기사를 일당을 내걸고 모집하기도 했다. 렌터카를 빌려 영업을 하던 우버 기사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쓰지 않는 자가용을 공유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애당초 취지가 지금 우버에도 유효한지 묻는 까닭이다.
최근엔 도덕성 논란으로 궁지에 몰렸다. 우버 경쟁사인 ‘리프트’는 8월11일
이뿐 아니다. 지난 7월 말 리프트가 뉴욕시장에 들어오자 우버는 자사 운전기사들에게 ‘두 회사에서 일하는 건 뉴욕시 규정 위반’이란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뉴욕시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공유경제’의 가치를 옹호하던 기업이 허위 규정을 앞세워 구성원들의 공유경제 활동을 막은 꼴이다. 이런 우버가 ‘규정’을 앞세운 서울시를 향해선 “글로벌 공유경제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선이다.
지금의 우버는 공유경제 성공 모델이 아니다. 공유경제 분위기에 영리하게 올라탄 틈새형 ‘수익모델’일 뿐이다. 황금광시대에 정작 돈을 챙긴 이는 금맥을 좇아 모여든 광부가 아니라 청바지 장수였고, 정부까지 힘을 실어주는 청년 창업 열풍 속에서 주머니를 채우는 건 ‘스타트업’이 아니라 ‘스타트업 비즈니스’라는 역설적 현실. 궁금하다. 이 청바지 장수나 스타트업 거간꾼과 지금의 우버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기술이 발전하며 기존 산업을 침범하는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봐왔다. 소리바다가, 페이팔이 그랬다. 적잖은 혁신은 기존 제도와 아슬아슬하게 충돌했지만, 그 속에서 디지털 경제는 공존의 길을 찾았다.
우버도 마찬가지다. 과속 딱지를 뗐다고 해서 자동차의 효용성까지 폐기 처분한다면 퇴행적 처사다. 우버는 급발진했지만, 공유경제는 여전히 연착륙할 가치가 충분하다.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택시를 손쉽게 부르고, 누구나 택시기사가 될 수 있는 세상을 그렸다. 그가 초기에 꿈꿨던 따뜻한 가치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를 어떻게 현 제도 안에서 조화롭게 수용할 것인가. ‘공유경제 바로품기’는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이희욱 기자 asadal@bloter.net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지역구 공천, 중앙당이 하기로…친한계 공천권 제한

‘사법개혁 3법’ 통과 앞…시민단체들 “법왜곡죄, 더 숙의해야”

‘윤석열 출국금지’ 국회 보고했다고…박성재 “야당과 결탁했냐” 질책

‘노스페이스’ 영원그룹 회장, 82개 계열사 은폐해 고발 당해

정부, ‘엘리엇에 1600억 중재판정’ 취소 소송서 승소…배상 일단 면해

조희대, 민주당 사법 3법 ‘반대’…“개헌 해당하는 중대 내용”

전한길은 ‘가질 수 없는 너’…가수 뱅크도 윤어게인 콘서트 “안 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낮 음주운전…감봉 3개월
![[사설] 중국 도발한 주한미군 훈련, ‘단순 항의’로 끝낼 일 아니다 [사설] 중국 도발한 주한미군 훈련, ‘단순 항의’로 끝낼 일 아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29577243_20260222502024.jpg)
[사설] 중국 도발한 주한미군 훈련, ‘단순 항의’로 끝낼 일 아니다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