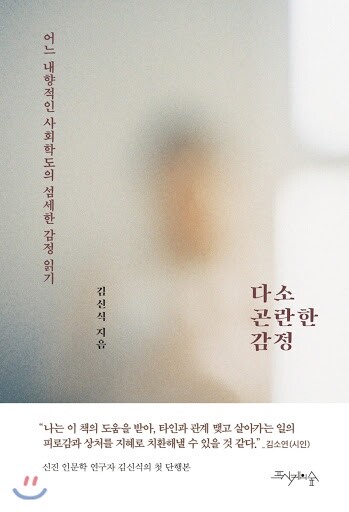
.
책을 고를 때, 책에 관한 글을 쓸 때 ‘뇌에 힘을 주고’ 유념하는 세 가지가 있다. 어떤 책인가(어떤 시도가 어떠한 형식에 담겼는가). 이 책은 무슨 가치를 주는가. 그래서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프시케의숲 펴냄)은 나만의 세 물음에 최근 흔쾌한 응답이 되어주었다. 더욱 드세게 혐오를 뿜어대는 차별과 배제 그리고 불평등, 이를 겨냥한 어느 영화가 이룬 성대한 업적에 쏟아진 열광, 불안에서 분노로 나아가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감정의 범람으로 보이는 나날에서 이 책은, 감정을 ‘활성화되었지만 주의에 닿지 않은 생각’(윌리엄 레디)이라는 견해에 시선을 꽂고 이렇게 말한다. “감정은 선명히 가닿은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주의에 닿지 않은 채 삶을 이루는 미지의 생각으로 함께할 것이다. 당신은 그 미지의 영역을 쉽게 정복할 수 없다는 현명함을 몸소 느낄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헤아리는 존재가 되어간다.”
1980년대생 인문학자로 사회비평가,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감정사회학 연구자 김신식의 첫 단독 저서. 감정사회학이라는 이름이 다소 낯설다. 이 분야는 개인적, 미시적, 비합리적이라는 수식에 갇혔던 감정이 실은 거시적 사회현상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감정에 관한 사회학의 논의를 단상이라는 형식에 담았다. 55개 단어를 각 단상의 제목으로 삼았다. ‘다행이다(나만 우울하지 않아서)’ ‘멀었다(넌 아직)’ ‘웃다(어이없어)’ ‘따지다(결혼 적령기를)’ ‘싫다(아무튼)’….
우울은 부정적이기만 한가. 내가 밝아지길 바라는 주변의 응원이 때로 따끔거리는가. ‘넌 너무 어두워’라는 말은 감정을 “병색의 은유”로 둔갑시킨다. 쾌유를 바라는 척하면서 보고 싶은 감정만 아픈 이에게서 확인하려는 사회의 속내를 지은이는 묘파한다.
의연함의 반대인 ‘약한 멘탈’은 어떤가. 멘탈의 강약은 자극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왜 멘탈은 늘 ‘피동’의 상태에서만 논의되는가. 왜 당신과 나는 그러한 구도에 복속되어야 하는가.” 기사 제목에 흔해 빠진 ‘아쉽다’는 감정적 표현도 문제가 있다. 이기지 않으면 도무지 떨칠 수 없는 아쉬움은 “과도한 평가사회가 낳은 독설”이기 때문이다.
감정마저 불평등함을 탐문하는 대목은 이 책의 절정이다. 감정에도 위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월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지역 내 평균소득이 높아져도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최신 연구 결과 등을 인용하면서, 최저소득층엔 박탈감이나 격리감도 사치스러운 감정일지 모른다고 지은이는 감지한다. 아예 ‘감이 오지 않는’ 간극. 저자는 이를 “실감하고 싶지 않다는 ‘자처하는 격리감’”이라 뼈아프게 칭한다. 감정이 위계에 휘둘린다면, 감정을 드러내는 이와 받아들이는 이의 사이는 결코 공평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평함이란 유리한 영역을 점한 존재가 그렇지 못한 존재에게 내리는 선고에 가깝다는, 섬세하고도 전복적인 시선으로 가득한 이 책. 헤아리는 존재가 되어가려는 노력을 가치로 삼은 당신에게 권한다.
석진희 기자 ninano@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jpg)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국힘 지지율 17% “바닥도 아닌 지하”…재선들 “절윤 거부에 민심 경고”

임은정, ‘한명숙 사건’ 소환해 백해룡 저격…“세관마약 수사, 검찰과 다를 바 없어”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이 대통령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게 할 것”

조희대, ‘노태악 후임’ 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트럼프 새 관세, FTA 맺은 한국은 유리…기존 세율에 10% 더해

‘재판소원 육탄방어’ 조희대 대법원…양승태 사법농단 문건 ‘계획’ 따랐나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