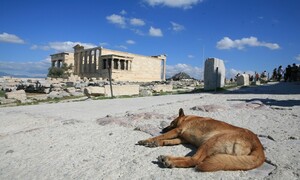멕시코의 수족관을 나온 범고래 ‘케이코’가 1998년 미국 뉴포트 한 수족관에서 임시 보호받고 있다.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저택 ‘네버랜드’에 수족관을 짓겠다고 제안하는 등 케이코 거취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결국 케이코는 고향 아이슬란드 바다로 돌아갔다. 위키미디어 코먼즈 제공
동물과 인간 관계의 역사에서 이보다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영화가 실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1998년 9월, 범고래 ‘케이코’는 미 공군 수송기 C17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다. 야생에서 잡힌 지 19년 만에 고향 아이슬란드 앞바다 헤이마에이섬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5년 전, 멕시코의 한 좁은 수족관에서 쇼를 하던 케이코는 할리우드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됐다. 영화 이름은 . 1970~80년대생이라면 3편까지 나온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영화에서 케이코는 수족관 사장의 음모에 맞서 고아 소년 ‘제시’의 도움으로 바다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는 범고래 ‘윌리’를 연기했다. 가 세계적인 흥행몰이를 하면서, 정작 그 윌리가 멕시코의 낡은 수족관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세계적인 모금 운동이 일어 수백만달러가 모였다. 그 결과, 케이코가 이 비행기에 타게 된 것이다.
어려서 어미를 잃은 범고래의 귀환에 모두가 감동받고 응원했을까? 현실은 아름다운 동화처럼 단순하지 않고, 선과 악 사이 회색지대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이다. 케이코가 돌아가는 그곳, 아이슬란드는 1992년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한 포경국이었다. 즉, 고래를 잡는 나라였다. 케이코도 그렇게 잡아서 미국에 판 것이었다. 그런 케이코가 전 지구적 축복 속에 금의환향하다니?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 ‘고래잡이'는 민족적 정체성을 떠받치는 여러 개 기둥 중 하나다. 고래를 잡으며 근대국가를 만들었고, 근대국민이 되었다. 고래 보호 운동은 서구 부자 나라들이나 하는 것이었다. 자기들이 우리 바다에 들어와 실컷 잡아 씨를 말리더니, 이제 와서 무슨… 그게 아이슬란드 ‘어른들’이 케이코의 귀향을 보는 심정이었다.
당시 아이슬란드의 포경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그때만 해도 아이슬란드 국민은 자국의 고래잡이에 70% 이상이 찬성했다. 하지만 케이코의 귀환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엇갈렸다. 케이코의 귀환에 53%가 찬성했고, 20%가 반대했다. 캐나다 인류학자 앤 브라이던은 ‘곤란에 빠진 자연’이라는 논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며,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케이코의 귀향에 양가적 감정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냉소다. 사람들은 농담을 해댔다. “케이코로 무얼 할 수 있지?” “응, 1만6천 개의 미트볼을 만들자고.” “고기가 오래되어 질겨지기 전에 먹어치워야겠네.”
그러나 어린이들은 달랐다. 아이들은 복잡한 법이 없으며 느끼는 대로 행동한다. 한 언론은 이렇게 전했다. “케이코가 돌아오는 날, 헤이마에이섬 아이들은 학교에서 휴일을 받았다. 어린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에서 줄지어 환영했다.” 포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인터뷰에 한 어린이는 “포경에 반대하고 포경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왜냐는 물음에 천진난만한 대답이 나왔다. “고래는 유명하고 귀여우니까요.”
아이슬란드 사례는 사실 한국에서 포경을 재개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과 흡사하다. 동물과 자연을 대상으로 한 착취 문제에다 식민주의적 문제가 교묘히 관통하기 때문이다. 근대국가는 자연을 정복하며 부를 쌓아왔다. 고래는 가장 대표적인 희생자였다. 미국, 영국, 일본이 그렇게 했다. 부자 장사꾼들이 철시할 때쯤 상업적 고래잡이에 뛰어든 것은 한국이나 아이슬란드 등 후발 근대국가였다. 자기네들이 다 잡아 없애놓고 지금 와서 선한 척하네? 그래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모피 반대 운동으로 생계를 잃어버린 캐나다 뉴펀들랜드나 그린란드 원주민이 자신들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몽둥이로 맞아 죽는 하얀 물범보다 야만인으로 욕먹는 원주민들 처지에 더 감정을 이입했다.
여기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 어린이들은 왜 케이코를 환영했을까? 어른들 마음은 왜 복잡했을까? 명실상부한 포경국가에서 53%가 케이코의 귀환에 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케이코가 통과했던 지난한 고통의 역사와 그가 맛보는 자유에 우리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전폭적으로 공감했고, 어른들도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성과 가냘픈 생명체에 대한 공감 속에 이 불쌍한 고아 범고래를 측은히 여겼다. 앤 브라이던은 케이코의 귀환이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가졌던 근대적 자연관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자연은 경제적 이용 대상일 뿐이라는 명제는 이로써 상대화했다.
케이코는 헤이마에이섬에서 5년 넘게 살았다. 천연 요새처럼 닫혀 있는 클레트스비크만에서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홀로 서지 못했다. 아침 일찍 사육사를 따라 가두리를 나가서 멀찌감치 야생 범고래를 바라다보다 돌아올 뿐이었다. 아주 어릴 적 잡혀 어미와 헤어졌기 때문에, 야생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몰랐다. 늑대소년이 어른이 되어 인간 사회로 돌아왔을 때, 어떨지 상상해보라. 그것과 비슷하다. 어느 날, 케이코는 혼자 멀리 여행을 떠났다. 1천㎞ 떨어진 노르웨이에 도착해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
케이코가 살았던 헤이마에이섬 클레트스비크만에는 지금 두 고래가 들어와 살고 있다. ‘리틀 그레이’와 ‘리틀 화이트’라는 흰고래(벨루가)다. 둘은 중국 상하이의 수족관에 있다가 여기에 왔다. 러시아 오호츠크해에서 잡혔기 때문에 둘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다. 그래도 야생에 방사되지 않고 이곳에서 편안히 생을 마감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곳을 ‘고래 바다쉼터’(Whale Sanctuary)라고 한다. 수족관에서 태어났거나 야생에서 살아본 기간이 짧아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고래들이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리틀 그레이와 리틀 화이트는 지난 6월 무사히 이곳에 도착했고, 조만간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이슬란드의 포경업은 어떻게 될까. 지금도 참고래 사냥 소식이 뉴스 타임라인을 훑고 지나가지만, 나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고, ‘문화적’ 세계시민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이슬란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포경에 대한 찬반 비율이 각각 34%로 똑같았다.
작은 사건이 모여 큰 사건을 이루고, 작은 슬픔이 모여 변화의 에너지가 된다. 고작 한두 마리 동물이 사람 마음을 바꿔 세계가 다른 길을 가게 한다. 그건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최소 1억…전한길 “윤석열 중심 제2건국 모금”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신랑

이 대통령, 12일 정청래·장동혁과 회동…‘입법 협조’ 강조할 듯

선고 D-9 윤석열 “날씨 풀리고 나라 회복될 것…주야로 기도”

‘대세 박정민’ 보러 왔는데 5분 전 취소…110% 환불에도 불만 폭발

‘전두환 미화’ 고성국 “당무위 피하려 비겁한 결정”…국힘 자진 탈당 거부

‘태극기’ 접더니 ‘받들어총’…오세훈의 문제적 사업, 결국 중단 수순

한학자 도박첩보 ‘윤석열 대통령실’ 보고됐지만 사건 배당 안 돼

배경훈 “쿠팡, 조사 결과 합의했는데 미국 본사가 ‘딴소리’”

트럼프, 캐나다가 7조원 들인 다리 “절반 내놔”…러트닉-재벌 ‘로비’ 의혹

![[세상 바꾼 동물] 코코넛 따는 원숭이를 아시나요](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31/53_15961785058402_861596178492177.JPG)
![[세상바꾼동물] 군인 194명을 구한 비둘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26/53_15931540490478_4315931540358268.jpg)
![<span>[세상을 바꾼 동물] 낭만으로 시작해 비극으로 끝난 사랑</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20/0525/3415903432012537.jpg)

![[남종영의 세상을 바꾼 동물들] 치킨과 닭의 차이…인간의 죄의식 삭제해버린 공장식 축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0/0416/581586963033409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