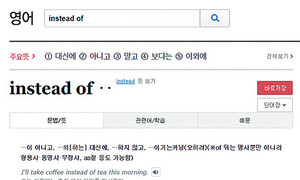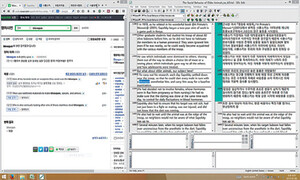한겨레 자료
편집자는 첫 독자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 독자는 내가 오역이나 오타를 저지른 것이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볼 뿐 아니라 걸핏하면 내 문장을 자기 취향대로 뜯어고치는 사람이다. 옳게 번역한 문장을 틀리게 고치기도 한다.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는 편집 방침 중 하나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답시고 ‘ㄴ데’로 연결하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레일 위에 동전을 올려놓기도 했다. 기차가 지나가면 동전은 납작하게 짜부라졌다”라는 문장을 “레일 위에 동전을 올려놓기도 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 동전은 납작하게 짜부라졌다”로 바꾸는 식이다. ‘ㄴ데’가 ‘두 문장을 이유 없이 연결하는 연결어미’라도 된단 말인가. 편집자에게 수모를 당할 때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모욕을 감수하지만 언젠가 실력을 인정받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 내 원고에 절대 손 못 대게 할 거야’라며 이를 갈았다.
번역을 갓 시작했을 때는 역자 대조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최종 원고를 보내면 나머지는 출판사가 다 알아서 하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2008년 출판사에서 교정지라는 것을 보내왔다. 디자이너가 진짜 책처럼 근사하게 조판해 A3용지에 인쇄한 교정지는… 빨간펜으로 도배돼 있었다. 터무니없는 오역과 오타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이 문장이 이해되지 않아요”라는 문구에서는 알몸을 들킨 것처럼 부끄러웠다. 편집자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표시해둔 문장은 대부분 나 자신이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번역한 문장이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제대로 이해하고 번역했는데 지적받은 문장도 있었다. 그럴 때면 신이 나서 원문을 들이대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 뒤로도 교정지를 받을 때마다 호승심에 불타 설전을 펼쳤다. 편집자가 문장을 오독하고 고친 부분을 원래 번역문으로 되돌려놓을 때는 쾌감까지 느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시절이었다.
그러다 고수 편집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분명히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 문장보다 더 유려하게 고쳤다. 원문을 안 보고 내린 추측이 들어맞기도 했다. 편집자 덕분에 미처 몰랐던 표현을 배우기도 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만 쓰다가 ‘이를테면’을 쓰게 된 것도 모 편집자 덕분이다. 점점 ‘내가 어떻게 썼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읽었느냐’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편집자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시키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 글을 누구보다 꼼꼼히 읽었을 편집자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떤 독자도 이해하지 못할 텐데 원문을 들이대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차츰 편집자를 경쟁자에서 동업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요즘 가장 고마운 편집자는 두 종류다. 하나는 원고에 손대지 않는 편집자이고, 다른 하나는 배울 점이 있는 편집자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예전에는 전자를 골랐겠지만 지금은 후자와 더욱 함께 일하고 싶다. 공연히 ‘ㄴ데’로 문장을 합치지만 않는다면.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최시원, 윤석열 선고 뒤 “불의필망”…논란 일자 SM “법적 대응”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이 대통령, 인천시장 출마 박찬대 글 공유하며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

“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미, ‘무역법 301조’ 관세 예고…한국에도 새 위협 될 듯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1/53_17716543877486_20241013501475.jpg)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