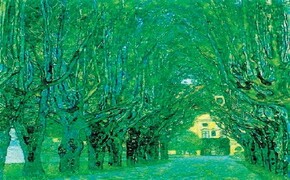중국 대륙을 침략한 일본군의 승전 뉴스와 지원병 권유 담화가 조선 팔도를 울리던 시절이었다. 1938년 8월29일,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국치일이던 그날, 경성(서울) 혜화문 밖의 성북리 숲 언덕에는 새하얀 2층짜리 미술관이 솟아올랐다.
장식 없는 직사각형 몸체, 2층 쪽 옆구리 창이 툭 튀어나온 이 평지붕 콘크리트 미술관은 근대건축가 박길룡(1898~1943)의 야심작이었다. 기하학적 이미지를 쓴 첨단 모더니즘 양식을 민간 건물에 실험한 것부터가 혁신적이었다. 더욱이 건물 안에는 온갖 지고의 문화재 명품들이 진열실 자리를 채웠다. 32살 거부였던 간송 전형필(1906~62)이 수년간 애지중지 사들인 숱한 대가들의 그림과 글씨, 도자기, 고서적들이었다. 식량·물자 통제로 인부를 모을 수 없었던 때라 소작인들에게 도시락 싸서 공사장에 출근하라고 명령하면서 겨우 완공했다. 그의 뇌리에는 다가올 대전란을 앞두고 최신 수장시설을 세워 문화재의 알짬을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가득했다. 간송의 수집을 자문했던 당대 최고의 감식가이자 서예가 오세창(1864~1953)은 온갖 보물들을 간직한 집이란 뜻의 ‘보화각’이란 이름을 붙였다(66년 간송미술관으로 개명). 그는 낙성식 때 주춧돌에 이렇게 새겼다. ‘…한집에 모인 것들은 오래도록 빛날 보물 중 보물이로다… 세상 함께 보배로 삼고 자손 길이 보존하세….”

간송미술관. 안창모 경기대 교수 제공
70년을 넘긴 올해 10월. ‘보화각 설립 70주년 기념전’(10월12~26일)을 연 간송미술관에는 2주간 관객 10만여 명이 몰렸다. 혜원과 단원의 걸작이 등장하는 드라마 의 입소문을 탄 것이 컸지만, 간송 연구진들은 침울한 기색이었다. 불어난 관객 규모에 맞춰 시설 관리, 컬렉션 유지 측면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여론 압박이 거세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부터 항온·항습, 수장고 관리 등까지 시설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병삼 연구위원(숙명여대 교수)은 “지금 시설과 편제로는 한계 상황이 온 것 같다”고 했다. 필자도 전시장의 안쓰러운 모습들이 적잖이 눈에 아렸다. 2층에서 본 다산 정약용의 서첩 ‘다산심획’은 첩 중간 부분이 너덜너덜 벗겨지고, 심한 얼룩 자국이 져 있었다. 거위, 원앙을 그린 조선 중기 대가 이징의 산수화조 작품첩은 가장자리 곳곳이 민망스러울 정도로 해져 있었다. 일제시대 나무 진열장이 낡은 탓에 인파가 달라붙은 혜원이나 단원 그림의 진열장은 위태위태해 보였다. 아카데믹한 연구 공간에 가깝던 간송은 이제 대중 전시공간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
사실 간송미술관은 법적으로 미술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컬렉션은 엄연히 전성우, 전영우씨 등 간송 직계 후손(2남3녀)들의 사유물이다. 공공 재단이 아니기에 판매 반출에는 제한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간송은 56살로 갑자기 타계하면서 유물 소유권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유언을 하지 않았다. 공동 상속의 원칙은 있지만, 유물별로 최종 상속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간송 후손들 사이에서 컬렉션 소유권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한다. 간송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미술관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는 건 이 때문이다.
미술관은 40여 년간 후손과 연구진들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황금 분할 체제로 운영돼왔다. 후손들은 간송학파의 컬렉션 관리와 연구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1962년 간송의 타계 뒤 방치됐던 컬렉션을 40여 년간 정리하고 연구해온 최완수 연구실장과 후학들 또한 별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 자급자족해왔다. 소유주의 전횡이 두드러지는 대다수 사립 미술관에 비하면 건전한 체제라고 평할 수도 있다. 수장시설, 전시시설 등을 지원해주겠다는 숱한 외부 제안이 지금껏 모두 성과 없이 끝난 건 이런 맥락에서 간섭을 원치 않는 간송학파의 고집과 복잡미묘한 컬렉션 소유권 내막 등을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간송의 장남 전성우씨는 뛰어난 색채화가로서 미국 화단에서 성공했고, 귀국 뒤 서울대 미대 교수와 보성학원 이사장을 맡으며 교육자로도 일가를 쌓았다. 상명대 교수를 지낸 동생 전영우씨는 간송기획전의 터전을 만든 한국민족미술연구소를 개설하면서 컬렉션 중흥의 기틀을 만들었다. 보기 드문 문화 명가를 잇고 있는 후손들의 자긍심을 살리면서 컬렉션 공공성을 살려낼 묘안은 무엇일까. 어쨌건 공공성 강화라는 화두는 외부 의견보다는 후손들이 가급적 빨리 스스로 매듭을 푸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들이 지혜를 짜내 미묘한 소유권 문제를 정리하고 재단법인화 등의 장래 청사진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때를 늦출수록 부담과 압박은 커진다. 간송가 사람들은 선친의 컬렉션에 깃든 문화구국의 의미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노형석 한겨레 대중문화팀장 nuge@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표결 못한다” 여당서도 ‘법 왜곡죄’ 수정 요구…“후퇴 말라” 강경파 넘을까

‘800만원 샤넬백’…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왜 유죄일까

코스피 사상 첫 6000 돌파…5천피 달성 한 달 만에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한 전한길·김현태…“탈취 시도” 억지 주장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4/20260224503791.jpg)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이 대통령 “산골짜기 밭도 20만~30만원”…부동산 타깃 확대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