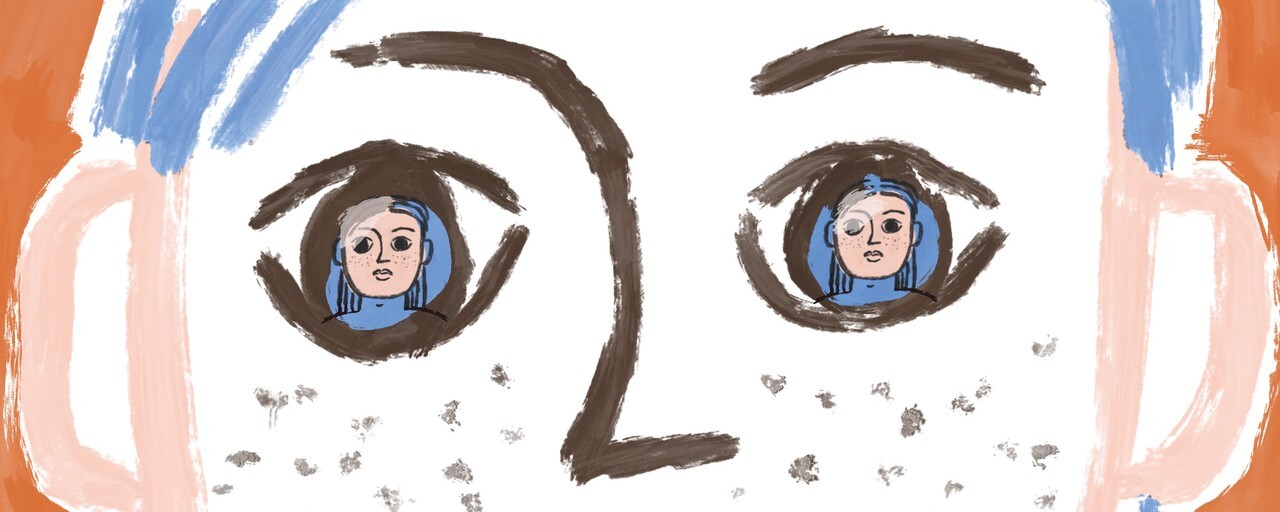일러스트레이션 슬로우어스
내 죽음이 기억되려면 당신과 닮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당신과 닮지 않았다면 당신은 내가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그 죽음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었는지, 죽음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애도와 추모는 이뤄지고 있는지… 알지도, 알고자 하지도 않을 테니까. 내가 당신과 닮지 않았기에.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참가자들이 그 고통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알아보려 했다. 동영상 속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표정을 지었지만, 구분이 있었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람과 아닌 사람.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경로가 수혈인 사람과 자발적 약물 사용으로 인한 주사기 감염인 사람. 참가자들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에이즈 환자에게 가장 덜 공감했을 뿐 아니라, 고통마저 약하게 가늠했다. 고통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고 생각할수록 고통은 더 작게 읽힌다. 제시 싱어의 <사고는 없다>에 나온 이야기다. 이 단락에 붙여진 소제목은 이것.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고통은 보지 않는다.’
낙인찍힌 사람은 공감받기 어렵다. 고통마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당신이 불쾌하거나 꺼리지 않을, 당신이 좋아할 만한, 어떤 낙인도 없는, 당신과 닮은, 아니 당신이 되고자 하는 ‘정상적이고 선량한’ 인간에 가까워야겠다. 범죄자여서도 안 되지만, 장애가 있어도, 너무 작거나 커다란 몸이어도, 너무 늙거나 빈곤해도, 소수자여도 안 된다. 피부색이 달라도 안 되고 국적이 달라도 안 된다.
“그들은 우리와 너무나도 닮았다.”
이 말의 주인공은 영국 보수당 대니얼 해넌 전 의원. 그는 전쟁으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우리’와 닮았기에 충격이라 발언했다.(그의 말을 접한 것은 김인정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에서.) 해넌은 그래도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했고, 그건 이 세계의 상식이었다.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연민한다. 그의 세계는 아시아인인 나에게 닥친 전쟁과 죽음엔 크게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충격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이니까.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했다. 이 중 18명이 중국, 라오스 국적의 이주노동자다. ‘우리’와 닮지 않은 이들이 사고를 당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타국까지 와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 그래서 사고를 당해도 충격이 아닌 이들.
안전 교육도 없었고, 파견업체 소속 이주노동자들은 비상구 위치도 몰랐다. 말이나 통했을까. 위험하니 배터리를 떨어트리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그들이 들은 전부였다. 사고 이후 책임 주체인 화성시의 태도는 미온하다 못해 훼방에 가깝다. 여러 사례가 많지만, 추모제 방해가 대표적이겠다. 살아서는 존중이 없고, 죽어서는 추모가 없다.
최근 화제인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무수한 죽음이 배경인 영화. 영화에서 아우슈비츠 소장인 루돌프 회스와 그 가족은 담벼락 너머에 수용소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 등 뒤로 수용소 굴뚝에서 연기가 치솟지만 그들의 시선은 집요할 정도로 자신들이 가꾼 정원에 머문다. 회스 가족이 돌아보지 않은 그곳에선 유럽인과 닮지 않은 유대인들이 소각되어 검은 연기로 사라지고 있었다. 당신의 등 뒤에도 당신과 닮지 않은 이들이 있다. 이 세계의 ‘시민’이 될 수 없는 이가. 그는 당신과 어디까지 닮아야 하나. 어디까지 닮아야 이 죽음을 진정으로 안타까운 것이라 여길 것인가.
희정 기록노동자·<뒷자리> 저자
*‘노 땡큐!’는 일상의 곳곳에 물음표를 던지는 칼럼입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최시원, 윤석열 선고 뒤 “불의필망”…논란 일자 SM “법적 대응”

‘모든 수입품’에 15% 관세…세계 무역질서 뒤엎은 트럼프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1/53_17716543877486_20241013501475.jpg)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중과세 무관 ‘1주택자 급매물’도 잇따라…보유세 부담 피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