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수심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전북 군산에서 낚싯배를 타고 유부도로 들어갔다. 지난해 7월 섬마을 자락에 파도가 일렁였다. 그곳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수심원’이 있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이 마련한 ‘수용소 다크투어’를 따라나선 길이다. 2층짜리 흰색 건물을 담쟁이가 소리 없이 집어삼켰고 쇠창살을 칭칭 감고 올라왔다.
1974년 문을 연 수심원은 1997년 SBS 프로그램 의 폭로로 긴급 폐쇄될 때까지 수용자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때려 죽이고, 암매장했다. 한 번 끌려오면 나갈 수 없는 곳이었다. 시설 바닥엔 폐쇄 당시 모습 그대로 누렇게 바랜 수용자 기록이 흩어져 있었다. 화장실에는 칸막이가 없다. 문은 밖에서만 잠긴다. ‘여자 수용실’. 벽엔 이렇게 쓰여 있다. “자조, 자립, 자위 1971년 1월1일 박정희”. 폐쇄되고 20년 뒤 SBS는 당시 아무 대책 없이 흩어진 수용자들을 수소문했다. 사라지거나 숨지거나 다른 시설에 살고 있었다.
2층 옥상에 여름 볕이 쨍했다. 섬이 반짝였다. 수심원 담 바로 옆에서 한 할아버지가 꽃에 물을 줬다. 그 집 마당 그늘에서 개가 졸았다. 밭 사이로 단층집들이 자리잡았다. 담을 사이에 두고 다른 세상이다. 수용자들은 섬 전역에서 맞아가며 일했다. 왜 이 선량한 시민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몇 달 뒤 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 갔다. 볕이 잘 드는 한방에 5~6명이 생활했다. 개인 수납장도 있다. 요리 실습장도 있다. 식단을 보니 한 끼 반찬이 네댓 가지다.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옷 갈아입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봐요?” 따위를 여자에게 물었다. 웃기만 했다. 내 말을 이해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자료를 보니 그는 10살 때인 1984년에 시설로 들어왔고 3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았다. 같이 온 인권단체 활동가에게 우스개로 말했다. “우리 집보다 깨끗하네요. 여기 좋네요.” 그가 물었다. “그럼 여기서 사실래요?” 내가? 왜? 나는 아니지만 너는 그리 살라고 말할 때 너와 나는 같은 인간인가? 폭력은 너와 나를 다른 등급의 인간으로 구분하는 순간, 이미 일어났다. 너와 나는 다른 급의 인간이란 그 생각에서 수심원의 잔혹극은 이미 시작됐다. 끝나지도 않았다. 에바다(1996년), 양지마을(1998년), 광주인화학교(2010년)…. 경북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 정신질환 입원자 102명 중 100명은 환기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병동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곳 첫 코로나19 사망자는 20년 넘게 갇혀 있다 42㎏으로 숨졌다. 가해자들과 나는 다른 사람인가?
“200년 전에는 장애인은 없었다.” 김도현은 책 에 이렇게 썼다. ‘장애인’이란 카테고리는 근대 자본주의와 함께 발명됐다. 산업혁명 뒤 땅을 떠났지만 도시 노동자로 편입되지 못한 부랑자들이 넘치던 때다. 이들을 수용해 노동자로 동원하는 구빈원이 등장한다. 구빈원에 수용된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몸’과 ‘일할 수 없는 몸’으로 구분됐다. ‘일할 수 없는 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실제로 ‘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돈으로 교환되는 ‘노동’을 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몸으로 구분한 거다.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로 묶일 만한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장애인 대 비장애인, 이 분류가 이상하다고 을 읽기 전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 이른바 ‘정상’이라고 불리는 특정 형태의 몸 이외에 다른 몸은 모두 한 꾸러미에 담는 이 분류는 백인 대 유색인 분류만큼 이상하다.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부닥치는 현실은 다르다. 장애인 대 비장애인을 가르는 선은 권력이다. 백인 중심 사회에서 흑인이 노예가 되듯이 비장애인 위주로 꾸려진 사회에서 장애인은 이동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시설에 너는 살라는 건 보호가 아니라 배제다. 시설 밖에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시설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발달장애인 시설에서 30년 산 여자가 나와 소통하지 못한 건 그의 몸 탓인가? 소통의 책임을 양쪽이 져야 한다면, 나는 왜 나를 기준으로 그의 장애 때문에 소통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에 공약한 대로 탈시설 강구책을 짜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4만4700명이 시설에서 산다. 장애인 시설 거주자 67%는 비자발적으로 입소했고, 58%는 10년 이상 시설에서 살았다. 특히 시설 거주자 가운데 78%는 발달장애인이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니 어쩔 수 없나? 북유럽 발달장애인들은 원하는 만큼 활동보조를 받으며 지역사회 속에 산다. 한국은 노르웨이가 아니라고? 예산이 없다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은 왜 돈 버는 일에만 통하나?
누군가 해준 밥 먹고, 누군가 지은 집에 살면서 돈만 벌면 의존하지 않는 줄 알았다. 모두 의존하는데 몸의 의존만 의존이라 손가락질당한다. “자립은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존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이 장애인용으로 돼 있지 않으니 장애인은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무척 적습니다.”(구마가야 신이치로 일본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부교수 인터뷰 재인용)
바이러스는 사람을 배제하지 않았다. 배제당한 곳을 가리켰다. 어떤 몸을 내쫓는 곳에선 모두 불안하다. 모른 척, 아닌 척 해도 사실 다들 안다. 사람은 원래 취약하다는 걸 말이다. 우리는 취약함으로 연결돼 있다. 효율성 높은 몸이 기준인 곳에서 사람은 취약함을 떠올리게 하는 타인뿐 아니라 자기 안의 약함도 없애버리려 자신을 쥐어짠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건 순 거짓말이고, 효율성 떨어지는 몸이 되는 순간 ‘비인간’으로 취급하는 곳에선 약하지 않은 사람도 자신으로 살 수 없다. 서울시 탈시설 정책에 따라 15년 동안 살던 시설을 나온 발달장애인 이상분씨는 책 에서 이렇게 말했다. “시설 가래, 니네는. 어떤 할아버지는 나한테. 도,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으래. 그래서 화났어. 약한 사람이 살(수 있으)면 (그 사회는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없어지라고 그러지?”
김소민 자유기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관세 ‘만능키’ 꺼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한국 포함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침묵하던 장동혁 “절윤 진심”…오세훈, 오늘 공천 신청 안 할 수도

‘오래된 지도로 잘못 공격’…미군, 이란 초교 ‘170명 집단 희생’ 조사

‘왕사남’ 장항준 “막살고 싶은데…와이프가 경거망동 말라 해”

미 민주당 “이 대통령 덕에 안정됐던 한미 동맹, 대미 투자 압박에 흔들려”

사시 부활 땐 ‘개천 용’ 가능하지만…‘고시 낭인’ 등 논쟁 재연될 듯

농어촌기본소득법, 농해수위 통과

장동혁 “지방선거 전 징계 논의 중단”…오세훈 인적 쇄신 요구는 외면

미군 “호르무즈 주변 이란 민간항구 피하라”…공습 가능성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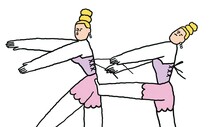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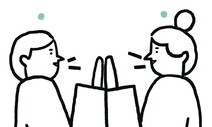


![[아무몸] 아홉 살 여자가 말했다 “여자애라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121/53_16059651125192_9116059651015046.jpg)
![[아무몸] 자유는 몸으로 만질 수 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004/53_16018177874382_6916018177743424.jpg)
![[아무몸] 밥하는 일보다 중요한 노동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911/53_15997893871638_1615997893661638.jpg)
![[아무몸] 나의 깨끗함을 위해선 남의 더러움이 필요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829/53_15986906788614_5915986906570301.jpg)
![[아무몸] 더럽게 외로운 나를 구한 ‘개 공동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24/53_15955756306094_5615955756190329.jpg)
![[아무몸] 어쩔 수 없는 나여도 괜찮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10/53_15943674064803_1415943673955014.jpg)
![[아무몸] 누가 나를 돌볼까, 나는 누굴 돌볼까](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26/53_15931545419299_2415931545291646.jpg)
![<span>[아무몸] 쓰레기 자루 속 레몬 빛깔 병아리</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16/53_15922336150495_961592233602684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