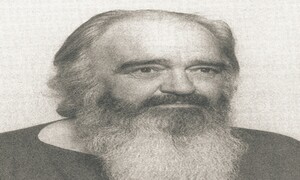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6차에서 10차에 이르는 촛불집회가 열린 뜨거웠던 2016년 12월. 나라 한편에선 무려 2500만 마리가 넘는(12월24일 0시 기준) 닭, 오리 등 가금류가 이른바 ‘살처분’되는 싸늘한 대량학살이 진행됐다.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하고도 단호한 ‘처분’이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됐거나 감염 염려로 강제 도살된 가금류 가운데 약 80%는, 닭이라고 한다.
‘소를 잘못 대하는 일에 관한 법안’

조류인플루엔자(AI)를 원인으로 해마다 천문학적 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당한다. 결국 ‘인간의 잘못’ 탓이다. 헨리 솔트(사진)는 일찌감치 “동물과 인간성에서 우러나오는 공통 유대를 인식해야 한다”며 ‘동물의 권리’를 위한 싸움에 앞장섰다. 헨리 솔트 누리집 henrysalt.co.uk
‘갈루스 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gallus domesticus) 학명으로 불리며, ‘붉은 들닭’에서 기원한 아종. 한때 들에서 살았으나 약 1만 년 전에 가축이 된 이들. 이들은 과연 그토록 쉽게 도살돼도 되는 존재일까? 육계는 부화해서 도살되기까지 약 30일을, 산란계는 약 1년을 살게 한다는데, 쾌적한 환경에서라면 8년에서 15년까지 생존할 이들의 삶을 이토록 단축할 권한이 과연 인간에게 있기는 할까? 닭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불필요할 때 ‘처분’하면 그만인, 인간의 소유물일 뿐인가?
만일 “인간이 과거에는 동물과 같았으나 구원의 주문을 발견하여”(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인간이 될 수 있었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닭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월한 존재라면, 우리는 도덕적 사유와 행동으로 그 우월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세계에 진지한 인간이 되는 걸 포기하는 것”(도나 해러웨이)과도 같기 때문이다.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이는 단순히 철새의 문제만도, 뚫린 방역 시스템이나 공장식 밀집사육 문제만도 아니다. 철학자 엘리자베스 드 퐁트네는 가축의 대량 살처분 행위를, 가축을 오직 식품·약품의 원자재로만 환원해 생각하는 ‘생산 제일주의 문명’이 낳은 치명적 결과라고 진단한다. 달리 말해서,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가축을 생각하고 취급하는 다른 문명적 태도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퐁트네에 따르면, 가축과 인간, 동물과 인간의 관계라는 주제의 경우 프랑스·독일 등 유럽의 윤리학보다 앵글로색슨 윤리학이 훨씬 앞서나갔다. 실제로 1975년 을 출간하며 공장식 축산업을 비판해온 피터 싱어는 일찍이 18세기 말 동물의 권리를 이야기한 제러미 벤담(1747~1832)의 논의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당시 영국에서 벤담이 구우일모(九牛一毛)인 것은 아니었다. 이미 1770년대부터 험프리 프리맷, 토머스 테일러, 존 오즈월드 등 적잖은 이들이 벤담과 더불어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이야기했다. 이 도덕적·철학적 쇄신의 전통은 마침내 1822년 리처드 마틴이 제안한 ‘소를 잘못 대하는 일에 관한 법안’(일명 마틴 법안)이 가결되면서 입법 운동으로까지 번지며 무시할 수 없는 운동이 된다.
헨리 솔트(1851~1939)의 (1894)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까지 이어져온 선배들의 기나긴 투쟁 여정에서 피어난, 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꽃이다. 헨리 솔트라고? 솔트는 누구이며, 는 어떤 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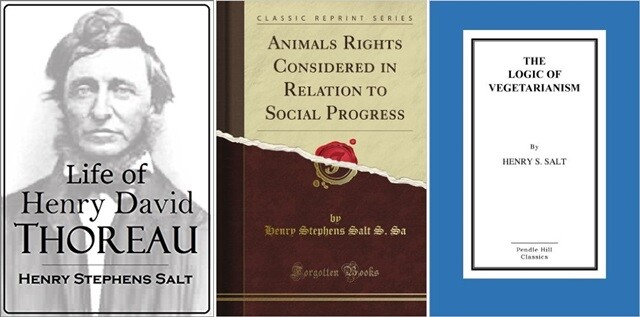
그의 저작들
솔트의 인생은 한마디로 찰스 다윈 풍이었다. 스콧 니어링 풍이라 해도 좋은데 은거지에 틀어박혀 글과 책으로 당대의 문제와 씨름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부터 유거의 삶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 이튼칼리지와 케임브리지대학을 무난히 졸업하고 졸업 뒤 곧바로 이튼칼리지 교사로 활동한 이력을 살펴보면, 되레 그는 평범한 수재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 범상한 청년을 급진적 사회운동과 사회적 발언의 길로 몰고 간 치명적인 것들이 곧 그를 찾아온다. 우선 반려자가 되는 여인(캐서린 조인스)과 그녀의 동생(제임스 조인스)이다. 제임스 조인스는 솔트에게 윌리엄 모리스, 헨리 조지 같은 사회주의 성향 사상가들을 소개해준 이튼의 동료 교사로, 솔트가 점차 사회주의에 경도되는 건 조인스의 영향이었다. 또 하나 치명적인 건, 동물과 음식에 대한 솔트의 섬세한 태도였다. 결국 그는 채식주의자가 되는데, 무뇌아적 육식 생활을 하던 다른 동료 교사들에 대한 염증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었다.
사회주의와 채식주의라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솔트는 엘리트 교육 공동체인 이튼칼리지와 얼마간 불편한 동거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결단의 시기가 찾아온다. 1884년 조인스가 사회주의운동 가담이란 이유로 체포되고 이튼칼리지에서 해고되자, 솔트도 이튼칼리지와의 작별을, ‘비타 누오바’(새로운 삶)를 결정한 것이다.
솔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정착지로 삼은 곳은 런던 남서부에 위치한 틸포드였다. 솔트 자신은 이 삶을 ‘이민’이라고도 명명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새 둥지를 틀고는, 식물을 기르며 ‘글로 말하는’ 삶을 시작한다. 사회민주주의재단 저널 (Justice)의 기고가 시작되는 시점도 바로 이때다. 1886년 세상에 나온 솔트의 첫 책은 였는데, ‘나는 왜 이민을 결정하였나’와 같은 자기선언문이었다. 마하트마 간디(1869~1948)는 영국 유학 시절, 솔트의 이 작품을 읽고 채식주의자가 되었다고 고백했는데 이런 인연으로 훗날 간디와 솔트는 인생의 동무가 된다.

19세기에 쓰인 헨리 솔트의 책 <동물의 권리>는 18세기와 20세기 사이에서 ‘동물윤리학’의 가교 구실을 한다. 그의 인식은 “‘가축 노동’을 하는 동물에게 그에 걸맞은 노동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서 시작된다. 헨리 솔트 누리집 henrysalt.co.uk
솔트를 ‘이민’으로 인도한 또 하나의 사상 물줄기는 ‘단순한 삶’이었다. 삶에 필요한 것을 최대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손수 자연에서 가져오기. 무능력한 문명인에서 능력 있는 자연인으로 진화하기. 이 이상을 솔트에게 심어준 영감의 한 원천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1817~1862)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로에 경도된 솔트는 소로 평전(, 1890)을 쓰기도 했다.
야생과 교감하는 능력을 계발하려 했던, “하루를 좀더 동물처럼 보내고” 싶어 했던 소로의 정신은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고정된 거대한 격차를 제거하고, 모든 살아 있는 이들을 하나로 결속하는 “인간성에서 우러나오는 공통 유대”()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솔트의 정신과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솔트는 소로의 야생 정신을 도시로 끄집어내, 동물과 인간이 공생하는 철학적 원칙으로 만들어낸다. 바로 에서였다.
솔트가 펴낸 책은 약 40권이라고 전해지는데, 이 중 는 19세기가 저무는 시점에 나와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동물윤리학을 21세기 동물윤리학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저작이다. 왜 우리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왜 닭 한 마리도 물건처럼 다뤄서는 안 되는가? 에 따르면, 그것은 동물에게도 감각과 지각, 감정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하게는 동물에게도 개별성, 성격(개성), 판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그들에게 ‘각자의 삶’이 따로 있다는 걸 뜻한다.
솔트가 보기에 동물에게도 선택하고 행동할 자유, 즉 미래로 삶을 투기하며 살아갈 자유가 있는데 이는 곧 동물이 “자연적인 삶을, 즉 개별적 성장이 허용되는 삶을 살아갈” 자유를 뜻한다. 이는 곧 동물 각자가 “삶의 주체”(톰 리건)라는 말과도 같다. 중요한 것은 별반 크지 않은 차이를 큰 차이로 보는 ‘차이의 시선’을 거두고 “인간적 공감 울타리” 안에 다른 종들을 포함하는 일이다. 솔트에 따르면, 고문자나 폭군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폭력의 피해자와 자신이 동족이란 느낌이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의 심리적 거리두기야말로, 악의 실행을 세계에서 가능케 하는 악의 근원자라는 말이다.
그러나 솔트는 동물에 대한 자비나 축산업 일체 폐기 따위를 논한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정반대로 그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태도 원칙을 세움으로써 당대의 법과 현실에 변형을 일으키려 했다. 예컨대, 솔트의 한 제안은 모든 노동자에게 그래야 하듯 ‘가축 노동’을 하는 주체인 가축에게도 향상된 노동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험프리 프리맷의 주장대로 가축의 “먹이, 휴식, 인자한 대우” 이 세 요소가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지금 ‘이것이 나라냐’고 투덜대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보다는 ‘살처분 현실’과 마주하며 다른 행동의 로드맵을 짜야 한다. 그 기획에는 젊은 솔트의 번민과 노숙한 솔트의 원칙,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이 혁명의 첫 단추는 내 생각엔 “동물의 탈동물화”(캐서린 레미)를 멈추는 일이다. 어느 걸그룹이 손에 들고 봉처럼 흔들어대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닭다리를, 어느 특정 장소에서 숨 쉬며 살아 움직였던, 자기만의 눈과 부리, 벼슬, 날개, 다리, 발톱을 지니고 살았던 특정 포유류의 몸, 그 생명의 이동과 동작을 가능하게 했던 몸의 일부로, ‘삶이 있었던 자리’로 보기 시작하는 일 말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20019159043_20260225502317.jpg)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국힘, 지방선거 1·2호 인재 영입…손정화 회계사·정진우 원전엔지니어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3차 상법개정안 통과…‘자사주 소각 의무화’ 증시 더 달굴 듯

“이 대통령, 어떻게 1400만 개미 영웅 됐나”…외신이 본 K-불장

공군 F-16 전투기 추락…대책본부 구성, 조사 착수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