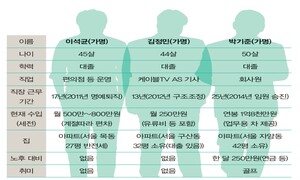“모든 나무에는 그늘이 있다.”
하랄트 피들러 독일노동총동맹 프랑크푸르트 지부장은 인터뷰가 끝날 때쯤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 주제는 ‘노동시장 개혁 뒤 독일의 중산층은 안녕한가’를 묻는 것이었다. “한국의 고용주들이 이 기사를 많이 읽으면 좋겠다. 모든 나무에는 그늘이 있다. (독일 경제 사정이) 좋아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지난 9월 중순 유럽 금융의 중심지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랄트 피들러 지부장을 만났다. 독일노동총동맹은 금속노조 등 8개 산업별 노조를 관장하는 동맹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에 의견을 내는 곳이다. 프랑크푸르트 지부는 독일 100대 기업 가운데 14개 기업의 본사가 있는 라인마인 지역을 관장한다.

하랄트 피들러 독일노동총동맹 프랑크푸르트지부장(왼쪽)이 독일이 ‘저출산·고령화’로 2025년까지 350만명 정도 노동력이 부족해져, 중동에서 온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노동 개혁을 추진하면서 모범 사례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들었다.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은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 국가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고용률 70%라는 국정목표를 위해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했던 하르츠 개혁 방식을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독일 경제는 1990년대 통일과 함께 비용 부담으로 수렁에 빠졌다. 2002~2005년 등장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내각은 하르츠 개혁(어젠다 2010)을 단행했다. 하르츠 개혁은 기업이 좀더 쉽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하며, 파견노동 규제를 완화했다(그럼에도 독일 기업에서 해고는 여전히 쉽지 않다). 실업급여 기간은 3년에서 1년~1년6개월로 단축했다.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만들어내고 다른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게 유연성을 강조한 정책이었다. 이를 통해 독일 기업의 노동비용을 감소시켜 경쟁력을 되찾으려 했다.
독일 쾰른경제연구소는 어젠다 2010이 도입된 뒤 실업률이 2005년 11.3%에서 2012년 5.5%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률(25살 이하)은 같은 기간 15.6%에서 8.1%로 하락했다. 2000년대 말부터 유럽 재정 위기로 각 나라들이 휘청댔지만 독일 경제만은 튼튼했다. 유디트 니위스 쾰른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어젠다 2010은 독일을 유럽의 병자에서 가장 힘센 나라로 변모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들러 지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고용시장에 기적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자리 자체가 나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체 일자리를 보면 1995년 3410만 개에서 2015년 3820만 개로 늘었다. 이를 구분해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파트타임 일자리가 770만 개에서 1470만 개로 증가했다고 독일노동총동맹은 밝혔다. 반면 정규직 일자리는 2640만 개에서 2350만 개로 줄었다. 즉, 전체 일자리는 늘었지만 대부분이 불안정한 파트타임 일자리이고 안정된 일자리는 줄었다는 것이다.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는 소득이 낮은 이들을 늘렸다. 파트타임 노동자는 임금이 정규직에 견줘 적을 뿐 아니라 노조의 임금 인상 파업 뒤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피들러 지부장은 “독일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더라도 하위층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가진 이들에게는 전혀 이득이 돌아가지 않았다”며 “저임금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중산층이 실직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하위층으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졌다”고 했다.

독일 쾰른경제연구소의 유디트 니위스 연구원(오른쪽).
그 결과 탄탄했던 독일의 중산층은 감소했다. 안정된 일자리 감소로 중산층 가운데 일부가 하위층으로 이탈했다. 20년 전 독일의 중산층은 83%(순수입과 사회보장제도 혜택 효과를 합한 결과)였는데 78%로 줄었다. 중산층의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노동 유연화도 한 부분을 차지했다.
독일의 경제 부흥 역시 하르츠 개혁의 효과를 본 것인지 불분명하다. 독일 문제 전문가인 한스 쿤드나니는 을 통해 독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스페인·프랑스 등 유럽이 화폐를 유로로 통합한 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독일이 예전에 쓰던 마르크화는 통화가치가 높아서 수출 가격이 비쌌는데, 통화가치가 낮은 유로를 도입하면서 독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훨씬 향상됐다는 것이다. 달러에 견줘 원화의 화폐가치가 낮아질 때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잘 팔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유로 통합과 함께 독일 노동자들도 기업과 타협했다. 공장에서 쫓겨나지 않는 대신 임금 삭감과 유연한 노동 형태를 받아들였다. 이는 유럽 내에서 독일 노동자의 임금만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조차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보장된 독일의 공동의사결정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은 지적했다. 하르츠 효과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유로존 통합은 동유럽 등 광대한 시장을 독일 기업에 열어줬다. 가격이 저렴해진 독일 제품은 다른 유럽 국가로 쉽게 침투했다. 반면 유럽 내 다른 국가의 공장은 무너지고 실업률은 올라갔다. 독일 중산층의 감소가 그나마 5%포인트에 그친 것은 다른 유럽 국가 중산층의 희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피들러 지부장은 “수출이 늘어서 그나마 일자리가 괜찮았는데 수출이 1995년 수준이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가난해졌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경제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쾰른경제연구소의 니위스 연구원은 독일 중산층이 다른 유럽 국가 중산층의 희생 위에 있다는 의견을 부인한다. 그는 “다른 나라 제조업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독일 제품의 품질이 좋아서 경쟁에서 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니위스 연구원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일자리 질이 나빠지고 좋아지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독일 산업화의 젖줄이던 라인강변에 위치한 쾰른경제연구소의 니위스 연구원을 만난 날은 날씨가 맑았다. 니위스 연구원은 하르츠 개혁의 성공을 자신했다. 그는 “기업이 활동을 잘해서 소득을 높이면 사회보장 시스템도 좋아진다”고 주장했다. 라인강의 지류인 마인강변에 위치한 프랑크푸르트 노조 사무실을 찾았을 때는 쌀쌀한 날씨 속에 비가 내렸다. 피들러 지부장은 “줄였던 부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상속세율도 높여야 한다. 소득 하위층의 복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독일 역시 고민이 있었다. 한국보다 앞선 실업급여·무상교육 등의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불황과 소득 불균형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독일 내에서 엇갈렸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쉬운 해고·취업 가이드라인 변경 등’ 노동 유연화 뒤 늘어난 일자리 개수만을 보는 것은 단편적이다. 하르츠 개혁은 중산층 삶의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컸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지역구 공천, 중앙당이 하기로…친한계 공천권 제한

“코로나 백신에 곰팡이” 신고 방치한 질병청…1420만회분 접종됐다

‘윤석열 출국금지’ 국회 보고했다고…박성재 “야당과 결탁했냐” 질책

조희대, 민주당 사법 3법 ‘반대’…“개헌 해당하는 중대 내용”

전한길은 ‘가질 수 없는 너’…가수 뱅크도 윤어게인 콘서트 “안 가”

‘노스페이스’ 영원그룹 회장, 82개 계열사 은폐해 고발 당해

“내 거야, 부적” 알몸 1만명 뒤엉킨 일본 축제…3명 의식불명

‘남국불패’...김남국, 인사청탁 사퇴 두 달 만에 민주당 대변인 임명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팔짱 케미’ 룰라 사로잡은 이 대통령 선물…전태일 평전, K-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