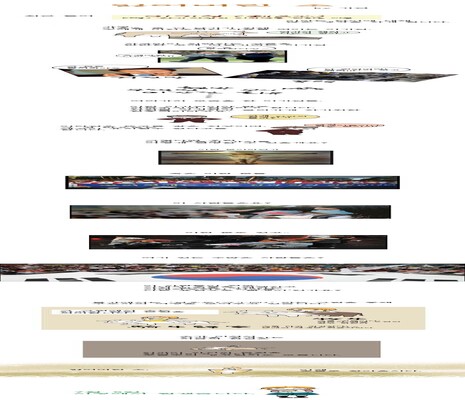▣ 박용현 한겨레21 편집장 piao@hani.co.kr
1.
몇 해 전 미국의 한적한 소도시에 머물 때의 일이다. 자동차 없이 생활하다 보니 버스를 이용해야 했는데, 처음 버스를 탄 날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다. 험상궂은 표정에 덩치가 산만 한 운전기사와 유난히 추레한 차림새의 승객들 사이에 앉아 묘한 압박감을 느끼던 차에 목적지가 다가왔다. 얼른 일어나 출입문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차벨을 눌렀다. 그런데 기사가 갑자기 룸미러로 나를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닌가. 흠칫 놀라 가만히 들어보니, 버스가 정차하지도 않았는데 일어서서 움직이면 어떡하느냐, 위험하다, 차가 완전히 선 다음에 일어나서 내려라,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순간, 그의 다소 거친 말투마저 고맙게 느껴졌다. 그곳은 참 조용하고도 평화로운 소도시였다.
좀더 번화한 도시에 가서 버스를 탔을 때도 비슷한 광경을 보았다. 서 있는 승객이 있을 정도로 버스 안은 번잡했는데, 차가 멈추더니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기사(미국 버스기사는 늘 산만 한 덩치다)는 아예 운전석을 벗어나 버스에서 내리는 것이 아닌가. 잠시 뒤 기사는 휠체어를 밀며 나타났다. 휠체어를 고정시키도록 돼 있는 자리에 이르더니 끈으로 휠체어를 단단하게 매줬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휠체어를 탄 이에게 온갖 유머를 구사하며 수다까지 떨면서. 다소 번화하긴 해도 그곳 역시 평화로운 도시였다.
귀국한 뒤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 뛰어올라 각종 요가 자세를 연습하며 출근하는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할머니든 다섯 살배기든 임신부든 버스를 잡기 위해 뛰어야 하고, 승차 직후 손잡이를 붙들지 않으면 엉덩방아를 찧는 낭패를 당할 수 있고, 문이 열린 뒤 조금이라도 늦게 내릴라치면 승객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온몸을 찔려야 하는 서울은 전쟁터 같았다.
2.
그러나 서울의 거리에도 평화의 종소리가 울렸다. 그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온 복음이었는데, 바로 촛불시위 현장에 신부님과 목사님과 스님들이 가져온 선물이었다. 비록 경찰의 강경 진압에 때로 부딪치고 피 흘리는 일도 있었지만, 권력의 전횡에 맞선 저항의 평화는 면면했다.
일부에선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가차 없이 강경 진압을 한다는 미국 시위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총기협회의 로비 탓에 총기 소지 금지가 이뤄지지 않아 누구나 주머니에서 권총을 빼들 가능성이 있고 경찰은 이에 가공할 무장과 폭력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한 해 수만 명이 총에 맞아 죽는 미국 거리의 차가운 평화를 말함인가.
비록 짐짝 취급을 받으며 출근길 버스를 타야 하고 일상에 지친 저녁엔 뒷골목 선술집에서 악다구니 끊이지 않아도 이 전쟁터 서울의 평화가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수만~수십만이 거리로 몰려나와 몸뚱이 하나로 권력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 거리의 평화가 더 마음에 든다.
그러니 권력 있는 자가 거리의 평화를 말하려면, 방패와 진압봉을 내려놓고 버스 운전석에 앉을 일이다. 스스로 왕이면서도 버스 운행에 차질이라도 빚을까봐 위험도 무릅쓰고 미리 일어나 출입문에 서 있어주던 승객들에게 이젠 그러실 필요 없으니 편안히 앉아 있다 내리시라고 얘기해야 한다. 할머니, 어린이, 임신부부터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장애인 승객이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승객의 양해를 구하고 얼른 내려 휠체어를 밀어주며 자신 없는 유머라도 건네야 한다. 그러면 승객들은 신명나서 외쳐줄 터. “오라이~”(All Right). 버스는 참 조용하고도 평화로운 거리를 신나게 달리는 것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룰라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장갑’ 받고 미소…뭉클한 디테일 의전

정청래 “장동혁, 고향 발전 반대하나…충남·대전 통합 훼방 심판받을 것”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전한길, 반말로 “오세훈 니 좌파냐?”…윤어게인 콘서트 장소 제공 압박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피해자들은 왜 내 통장에 입금했을까
![[속보]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소득세 대체할 것” [속보]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소득세 대체할 것”](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19899520364_4017719899388765.jpg)
[속보]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소득세 대체할 것”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에 미-중 전투기 대치 사과’ 전면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