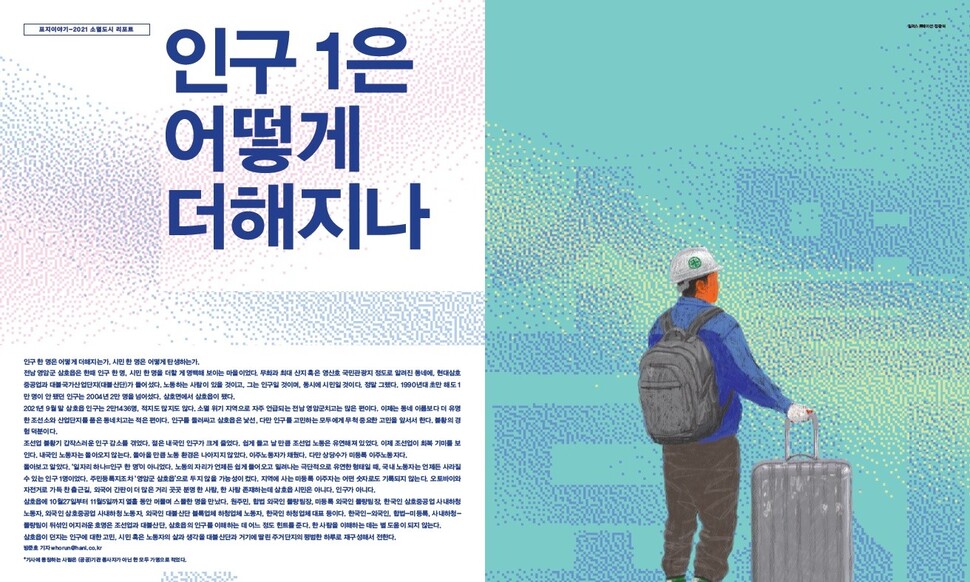
제1389호 표지이야기 ‘보이지 않는 노동자의 도시’는 전남 영암 삼호읍의 산업과 노동, 인구 이야기를 자못 심각한 표정으로 적은 기사입니다.
삼호읍은 물론 건조하기만 한 동네는 아닙니다. “목포는 좀 가보았지만 영암은 낯설어서…”라고 운을 떼면, 삼호읍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런 얘기를 쏟아낼 터입니다. “독천 낙지, 아시죠? 펄이 사라지기 전까지 낙지 하면 독천이었는데 보통 목포만 아시더라고. 지금도 독천 낙지 식당들은 바로 옆 학천면에 남아 있죠.” “이곳 농협 초대회장 박부길 선생님이 1970년대 문익점처럼 들여온 무화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암이라는 이름이 나타난 기록만 해도 신라시대로 거슬러 간다니, 그 오랜 세월 쌓아온 이야기가 오죽 많을까요. 대불국가산업단지니 조선업이니 하는 것들이야말로 이 유서 깊은 지역에 한때 새겨지고 말 손톱자국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손톱자국이 동네에 미친 영향이라면, 다양한 사람이 교차하는 공간이 됐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교차는 여느 곳처럼 풍성한 문화의 가능성으로 읽을 수도 있을 텐데요. 아직 고민이 더 많습니다. 하청업체 본공, 물량팀 등으로 나뉜 다양한 내국인 노동자는 정주할 수 없는 불안정성을 고민합니다. 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자들은 노동자이나 시민은 아닌, 자기 존재의 불완전함을 고민합니다. 점심시간 작은 공장 앞 도로, 근무시간 물량팀 컨테이너 사무실, 퇴근시간 조선소 앞, 퇴근 뒤 감자탕집과 고깃집, 주말 노동자 워크숍…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냄새, 다른 소음과 분위기 속에서 열흘 동안 각자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동네가 당신에게 무엇인지 물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네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고백건대 실패. 2만 명쯤 사는 삼호읍의 전모를 파악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푸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투정 받아주신 삼호읍 주민, 전문가, <한겨레21> 동료께 감사합니다.) 주민 구성이 다양할 뿐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다양합니다. 이주노동자라는 존재를 두고서 누군가 생산 공백을 메워주는 고마운 노동자라고 했습니다. 임금에 따라 자리를 옮겨다니는 야속한 노동자라고도 했습니다. 불법이라 어딘지 두려운 이라고도 했고, 불법인 탓에 더 조심하고 숨죽이는 이라고도 했습니다. 알고 보면 정 많은 사람이라고 했고, 섞이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비슷한 혼란은 기사가 나간 뒤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도 느껴졌어요.) 다양함을 그저 혼란으로 읽으며 전전긍긍하는데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어느 나라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동네죠.”
다양한 사람, 그 사이 관계가 얽혀 이루는 동네 분위기가 입체적이고 혼란한 건 당연합니다. ‘좋은 동네? 나쁜 동네?’, 쓸데없는 판단은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그저 내국인 주민을 떠나게 한 노동조건을 반성하고, 새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자리를 생각하는 일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예기치 못했으나) 현실로 놓인 다채로움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 삼호읍은 정말 소멸마을의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래 유명한 낙지에 낯선 무화과가 더해져 동네의 굳건한 자랑이 된 것처럼요.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노태악 오늘 퇴임…‘후임 제청’ 없어 대법관 공백 현실화

트럼프 ‘기만 전술’ 논란…이란 공습 명령 뒤에도 ‘협상’ 뉘앙스
![[단독] 정보사, 계엄 전 9개월간 ‘잠수정·동력 PG’ 북한 침투 훈련했다 [단독] 정보사, 계엄 전 9개월간 ‘잠수정·동력 PG’ 북한 침투 훈련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2/53_17724435748156_20260302502367.jpg)
[단독] 정보사, 계엄 전 9개월간 ‘잠수정·동력 PG’ 북한 침투 훈련했다

예산장관에 4선 ‘안정감’ 박홍근 지명…비명 박용진 발탁해 ‘통합’

‘이란 공습’에 장동혁 “김정은의 미래” 박지원 “철렁해도 자신감”
![[사설]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설]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2/53_17724442937947_20260302502331.jpg)
[사설]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훈장 거부’ 전직 교사, 이 대통령 훈장 받고 “고맙습니다”

미군 사령부 ‘명중’ 시킨 이란…미 방공미사일 고갈 가능성 촉각
![이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내린 57.1%…“서울과 영남권서 하락” [리얼미터] 이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내린 57.1%…“서울과 영남권서 하락” [리얼미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2/53_17724082363583_20260302500278.jpg)
이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내린 57.1%…“서울과 영남권서 하락” [리얼미터]

정청래·이성윤 이어 최민희도 ‘재명이네 마을’ 강퇴


















![[단독]장동혁은 어떻게 단톡방에 포획되었나…1020명 참여 7개월 단톡방 메시지 24만건 분석해보니 [단독]장동혁은 어떻게 단톡방에 포획되었나…1020명 참여 7개월 단톡방 메시지 24만건 분석해보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2031912989_202602275014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