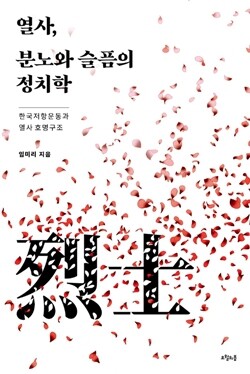
전태일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 ‘열사’(烈士)로 호명된 사람이다. 전태일 이후 수많은 열사가 “죽음으로 정신적인 저항의 위대성”을 보였다. 저항적 자살이다. “‘열사’는 1980년 5·18 이후 한국 사회의 이분법적 적대를 표현하는 가장 극명한 단어이다.”
임미리의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한 책 (오월의봄 펴냄)은 1980~2012년 열사로 ‘호명’된 133명을 분석한다. 지은이는 열사를 저항적 자살의 유형에 따라 당위형/실존형으로 나눈다. 시기별로는 열사의 기원(전두환 정권), 의례화 시기(노태우·김영삼 정권), 열사의 해체기(김대중·노무현 정권) 순으로 분석된다. 이 책을 읽는 것은 괴롭다. 수많은 죽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비참함 때문이 아니다.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사들의 무덤에서 피어난 쑥부쟁이가 한국의 민주주의일진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두환에서 김대중으로, 반민주에서 민주로, 상전벽해인 줄 알았던 세상에서도 죽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노동자들이 분신으로 투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 열사 18명이 스러져간 이유는 무엇인가. 김영삼(10명), 김대중(8명), 이명박(6명) 정권 때보다 훨씬 많은 수다. 이런 참담한 일은 왜 일어났는가. “민주 대 반민주의 정치 균열이 약화, 붕괴함에 따라 열사도 본래의 기능을 잃고 형해화했다.” “19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이후 자살의 고립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에 기인한 일반적 자살과 구분하기가 점차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죽음이 고립되었다. 그리고 특정한 죽음만이 열사로 ‘격상’되었다. 저항운동 내부의 권력관계 탓이다. “수십 년간 정권 교체에 몰두하는 사이 노동자와 도시빈민의 생존권은 주변화됐고, 매번 선거는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주변계급(under-class)을 과소 대표하는 것으로 귀착됐다.” “1980년대 변혁운동은 전태일을 ‘사후적으로’ 열사로 소환했으나 그 소환은 전태일과 똑같은 수많은 노동자와 도시빈민을 위한 것으로 귀결되지 못했다. 또 다른 열사로서 전태일‘들’을 탄생시켰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노동자 전태일의 죽음을 막아내지는 못한 것이다.”
집요할 정도로 열사들의 유형과 시대 상황을 분석한 지은이의 문제의식은 하나다. ‘지금 우리는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책의 알짬이다. “이분법적 전선이 필연적으로 또 다른 억압과 배제를 낳는다면, 다원화된 전선은 사회 주변부에 대한 공감을 필수로 한다. 주변계급이야말로 가장 깊은 존재론적 슬픔의 담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슬픔에 공감했을 때 더 큰 분노와 더 넓은 연대가 가능하다.”
이 책은 “몸은 먼저 가지만 정신은 지켜볼 것이다”라며 떠나간 이들에 대한 산 자의 윤리요, 응답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하메네이 전권 위임받은 라리자니 “미국, 후회하게 만들겠다”

미군 사령부 ‘명중’ 시킨 이란…미 방공미사일 고갈 가능성 촉각

이란 37년 절대권력, 하루아침에 ‘폭사’…하메네이는 누구

국힘, 필리버스터 백기투항…TK여론 악화로 행정통합법 처리 ‘다급’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1/53_17723445090457_20260301501521.jpg)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

‘하메네이 사망’ 이란, 실세 라리자니 체제 이미 구축

말에 ‘뼈’ 있는 홍준표…배현진 겨냥 “송파 분탕치는 정치인 정리해야”

국힘 ‘TK 빼고 전패’ 어게인?…날개 단 이재명 효과, 6월 시나리오는

“장동혁, 윤석열 껴안더니 부정선거 음모론까지”…개혁신당 비판
![왜 부자는 수돗물 마시고 가난하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 마시고 가난하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1/53_17723391952718_511772339139994.jpg)
왜 부자는 수돗물 마시고 가난하면 병생수 마실까 [.t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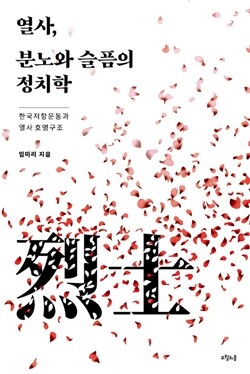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