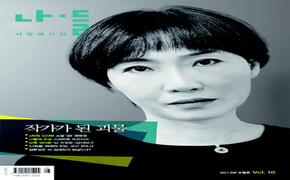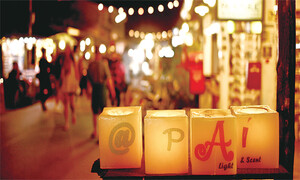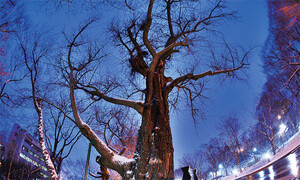서울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길러진 내게 ‘고향다운 고향’은 없었다. 고만고만한 대도시에서 ‘진달래 먹고 물장구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의 기억 따위는 자랄 수 없었다. 공터가 아파트로 바뀌고, 집 앞에 지하철이 생기고, 인구수 증가로 학교가 늘어나던 개발의 추억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다. “너 고향이 어디야?”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서울 노원구를 떠올린 것은. 실제 태어난 곳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이었지만, 4~5살 때부터 8살 때까지 나는 노원구 공릉동에 살았다. 기억나는 가장 어렸을 때의 순간들은 모두 그 공간을 맴돌았다. 5살 눈높이에선 높기만 했던 집 계단을 내려오다 날마다 구른 기억, 분홍색 원피스에 맞춰 분홍색 스타킹에 분홍색 구두를 신고 숙녀처럼 걷던 기억, 당시 유행하던 마스크맨이니 후레쉬맨이니 하며 친구들과 놀던 기억은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기억과 현실은 멀어질 때마다 미화됐다. 지하철과 버스를 몇 번이고 갈아타고 몇 시간이나 가야 했던 그곳은 8살 소녀가 20살 아가씨가 될 때까지 머나먼 곳이었다. 머나먼 고향은 그렇게 박제됐다. 의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시골처럼.

수습의 기억이 꿈에 나올까 서울 노원구에는 사적으로 다시 가보지 못했다. 사람으로 낳아주고 기자로 만들어줬는데 노원구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노원구 중계본동 골목에 그려진 벽화들.탁기형
떠난 지 16년 만에 노원구를 다시 찾은 건 2008년 12월8일, 수습 첫날이었다. 기자들은 언론사 입사 뒤 수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 기자로 발령 난다. 경찰서에서 먹고 자는 ‘하리꼬미’와 관할 구역 내의 경찰서·소방서·지구대·병원·장례식장을 돌며 기삿거리를 찾는 ‘마와리’는 수습의 알파요 오메가다. 노스탤지어가 공포로 바뀌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1진 선배가 요구하는 육하원칙에 경찰은 침묵을 지켰다. ‘허접스러운’ 취재는 선배의 분노를 불렀다. 경찰들의 ‘잡상인’ 취급과 선배의 ‘무능한 기자’ 타박 사이에서 방황하던 나날들이었다. 그사이 나는 친구들과 놀던 골목길에서 눈물 젖은 붕어빵을 먹었고,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해 냄새만 풀풀 풍기는 ‘거지’가 되었다.
추억이 씻겨간 노원구에 남은 것이라곤 경찰서, 지구대, 또 다른 지구대뿐이었다. 거기에서 ‘주폭’을 휘두르는 취객, 인력업체에서 돈 떼이고 소란을 피운 가난한 이주노동자, 사채빚에 시달려 갓난쟁이를 안고 가출한 주부, 부모님을 전쟁으로 잃고 외롭게 살다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평생을 보고 듣고 만나며 기사로 대변해야 할 우리 사회의 슬프거나 씁쓸한 자화상들이었다. 노원구는 그런 동네였다. 한쪽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고 그곳 아이들을 상대로 한 사교육이 성행할 때, 다른 한쪽에선 서울 중심에서 밀려난 가난한 이들이 먹고살기 바빴다. 그러나 못 먹고, 못 자고, 못 씻으며 일에만 쫓기던 나는 그곳을 진정으로 이해할 여유가 없었다. 2009년 1월 노원경찰서를 떠나 다른 경찰서로 옮겨간 뒤 나는 노원구에 사적으로 다시 가지 않았다. 수습의 기억이 꿈에 나올까 무서웠다.
다시 생각해보면 노원구로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사람으로 낳아주고 기자로 만들어줬는데 미움만 받는 꼴이니 말이다. 아마도 내가 두려웠던 건 수습 시절의 힘겨운 기억만은 아니었을 것 같다. 진짜 무서웠던 건 행여나 노원구가 “넌 정말 좋은 기자가 됐느냐”고 꿈에서라도 물어보는 건 아니었을까.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국힘 지지율 17% “바닥도 아닌 지하”…재선들 “절윤 거부에 민심 경고”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jpg)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일반이적죄 등 혐의

조희대, ‘노태악 후임’ 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

트럼프 새 관세, FTA 맺은 한국은 유리…기존 세율에 10% 더해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미, 이란에 ‘무기한 핵합의’ 요구…협상단, ‘제로 핵농축’에서 물러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