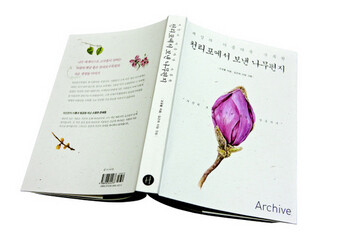
걷고 싶은 계절이다. 우리가 삭막한 도심의 회색 콘크리트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지구는 돌고, 계절은 그렇게 바뀌고 있었나 보다. 겨울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는 나날이 얼마 남지 않은 휴가 날짜처럼 아쉽기만 한 이때, 부러운 마음이 드는 편지 하나가 날아들었다.
나무칼럼니스트 고규홍씨가 쓴 (아카이브 펴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알려진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의 꽃과 나무의 살림살이에 대한 글을 모은 책이다. 일간지 기자 생활을 하다 세상사에 부대끼던 마음을 달래려 마흔 살 즈음 불쑥 찾아든 공간이 천리포수목원이었다. 그길로 마음을 빼앗겨 지난 12년간 저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인적이 드문 시간에 천리포수목원을 들러 꽃과 나무들 사이를 걸었다. 그 과정에서 2000년 5월8일을 시작으로 ‘나무편지’를 보냈다. 11년째, 200여 통의 편지에서 1500종의 식물을 언급했지만 아직도 할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천리포수목원에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넘치는 생명력을 자랑하는 식물이 무려 1만5천여 종에 달하기 때문이다.
숲길을 걸으며 나무의 속내를 들여다보다

초령목
숲길은 고요한 가운데 매일매일 소소한 변화들로 수다스러운 공간이었다. 흐드러지게 꽃을 피웠나 하면 후두둑 떨어뜨리는 날이 있었고, 어제는 세 개의 잎을 피웠다가 오늘은 소리 없이 다섯 개의 잎을 피우고, 진한 향으로 벌과 나비를 불러 축제를 벌이는 게 식물이었다. 저자는 꽃과 나무의 숨은 이야기들을 굽이굽이 풀어놓는다. 조곤조곤 말하는 그의 문장들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고즈넉한 숲길을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듯, 옆에서는 나무가 뿜어내는 아련한 향이 나는 듯하다. 낯설었던 식물들의 이름을 되뇌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해 듣노라면 새 친구를 알아가듯 흥미롭다. 그중 몇몇 이야기만 옮겨보면 이렇다.

흰진달래
천리포수목원이 가장 화려해지는 시기는, 만물이 그렇듯 봄이다. 괴테는 에 땅속에서 씨앗이나 뿌리로 긴 시간을 보낸 식물은 지상에서 흰색이나 노란색을 띤다고 썼다. 수목원도 이른 봄이면 흰색과 노란색의 향연이란다. 시작은 설강화다. 봄을 알리는 외래 식물로 ‘스노드롭’이라고도 부른단다. 겨울이 끝나는 게 아쉬운 듯 여린 초록의 줄기 위에 눈발 같은 꽃잎이 송이송이 매달려 있다.
친근하고 익숙하게 봄을 알리는 꽃이라면 단연 목련이 아닐까. 붉은 잎의 자목련, 노란잎의 황목련도 있지만 일제히 ‘파∼’ 하며 하얗게 꽃망울을 터트리는 목련은 봄을 부르는 전령 같다.

가을벚나무
저자는 목련을 말하며 다른 꽃과 비교해 흥미로운 점을 설명한다. 목련과 꽃은 암술과 수술이 다른 꽃에 비해 견고하단다. 보통의 꽃들은 암술과 수술이 나비나 벌이 날아와 꽃가루받이하기 좋게 하늘거리는데 목련의 것만 유독 단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목련이 지구에 벌이 나타나기 전에 자리잡은 식물이라는 증거란다. 벌보다 먼저 지구상에 있었던 곤충인 딱정벌레에게 수분을 의지해야 했는데, 딱딱한 딱정벌레에 의해 꽃술이 상하지 않으려면 견고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내년 봄 만개한 목련을 보면 조금 달리 보일 것 같다. 저 꽃은 얼마나 유구한 세월 동안 지상에 봄이 왔음을 알려왔을까.

설강화
봄을 알리는 노랑의 대표라면 개나리와 산수유가 있겠다. 특히 찬 바람이 부는 겨울부터 꽃봉오리가 솟아 잔설이 녹으면 화들짝 피어나는 산수유는 그윽한 향도 그렇지만, 산과 들을 수놓은 듯 피어나는 모양도 이른 봄에 맞춤한 식물인 듯하다. 작은 꽃봉오리 하나에 새끼 손톱보다 작은 꽃송이가 30~40개씩 알알이, 새 계절에 대한 희망처럼 피어난다.

만병초
그렇다면 따뜻한 기운이 저물어가는 요즘 같은 계절, 저자의 마음을 흔드는 식물은 없을까. 찬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11월, 겨울이 들어서면 비로소 꽃을 피우는 오텀날리스(Autumnalis)는 봄의 벚꽃 같은 모양의 꽃을 틔운단다. 아직 공식적인 우리말이 없어 저자와 지인들은 그 꽃 모양에 ‘가을벚나무’라 이름 붙였다. 그러나 봄의 벚나무처럼 한꺼번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고, 늦가을부터 시작해 드문드문 계속 꽃잎을 틔워가며 이듬해 봄까지 꽃을 보여준단다. 그 속도와 모양이 흐린 겨울 하늘에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 저자는 겨울바람에 온기를 불어넣는 듯하다고 표현했다.
납매는 12월부터 2월까지 노란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추운 날씨 탓일까, 다 피어도 활짝 펼쳐지지 않고 약간 오므라든 채로 있다. 넋을 앗아갈 정도로 달고 짙은 향이 황홀하다. 특별히 향이 짙은 데는 뜻이 있다. 계절 탓에 꽃가루받이를 해줄 곤충이 많지 않아 향으로 곤충을 유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명체의 행위에는 항상 이유가 따른다.

삼지닥나무
소소한 생의 방식 하나에도 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음이 신비롭다. 뜻없이 나뭇가지를 꺾고 이기와 탐욕에 휘둘려 식물을 짓밟고 베고 밀어버리는 인간의 행위가 부끄러워진다.
나무를 향한 경탄과 반성
이외에도 계절과 상관없이 흥미로운 얘깃거리는 계속 이어진다. 예컨대 이름이 솔깃한 나무인 만병초는 심장과 신장병을 비롯해 관절염·신경통·귓병·복통·염증 등 일상에서 흔히 겪는 질환에 골고루 적용해온 약재인데, 그 효능 때문인지 노인들이 만병초 줄기로 지팡이를 만들어 짚고 다니면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도 퍼졌단다. 이 믿을 수 없는 얘기 때문인지 산천에 자생하던 만병초가 희귀한 식물이 됐다. ‘귀신나무’라고도 불리는 초령목은 이름의 유래가 흥미롭다. 향기가 달큰한 과자나 사탕의 것처럼 독특하고 강해 하늘과 땅속의 귀신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겠다며 사람들이 ‘영혼을 부르는 나무’라고 이름 붙였단다.
규칙성을 가지는 식물을 보면서는 경탄과 함께 미안한 감정을 내뱉는다. 가지가 꼭 셋씩 갈라지는 삼지닥나무, 멀리서 보아도 금세 나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수평으로 층층이 나뭇가지를 뻗는 층층이나무 등 놀라운 규칙성이 깃든 식물들을 보며, 저자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규칙을 인간이 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한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60살 이상, 집에서 6천보만 잘 걸어도 ‘생명 연장’…좋은 걷기 방법

미 공수부대 대규모 본토 훈련 취소…이란 지상전 투입설 확산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9%, 김민석·장동혁·한동훈 4% [갤럽]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9%, 김민석·장동혁·한동훈 4% [갤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619029891_20260306500988.jpg)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9%, 김민석·장동혁·한동훈 4% [갤럽]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819701798_20260306502051.jpg)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

배우 이재룡, 또 음주운전 사고…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도주까지

부산 찾은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었어도 코스피 5천~6천 가능성”

“러, 이란에 미국 군함·항공기 위치정보 제공”…전쟁 ‘간접 참여’ 정황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77491692_20260305504002.jpg)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항명’ 박정훈 준장 진급…이 대통령 “특별히 축하드린다”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217/53_17659590361938_241707891273117.jpg)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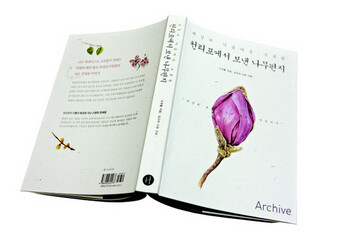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