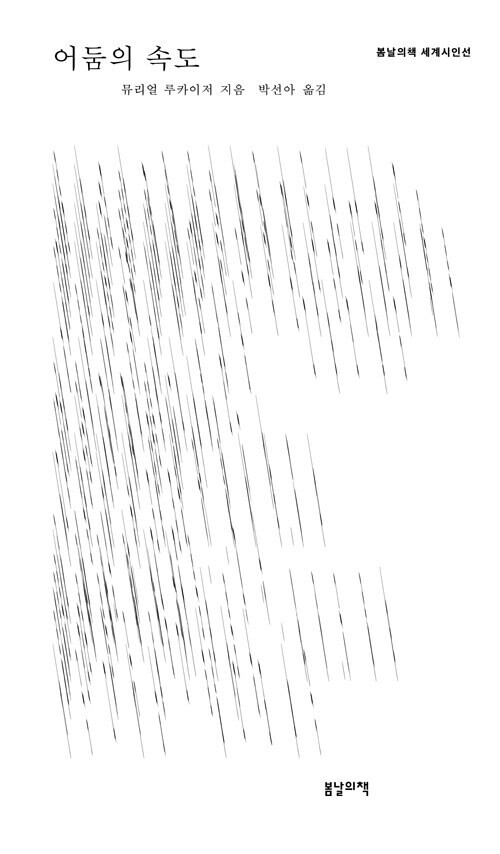
-뮤리얼 루카이저 지음, 박선아 옮김, ‘끝없는’ 부분, <어둠의 속도>, 봄날의책, 2020년
에이드리언 리치의 산문집을 읽는데 계속 뮤리얼 루카이저란 이름이 나왔다. “역사와 육체, 기억과 정치, 시와 물리학 등의 결합관계를 이해”한 루카이저야말로 “내 시를 쓰고, 내 삶을 살아가는 투쟁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시인”이었다고 기린다. 어떤 시를 쓴 시인이기에 이렇게 상찬하나 궁금했다. 마침 집에 그의 시집이 있었다. <어둠의 속도>. 지난해 선물받고 서너 장 들춰보다 그냥 덮었던 기억이 난다.
마음가짐이 달라서일까, 이번엔 책장을 쉬 넘길 수 없었다. 천천히 시 50편을 통독했다. 시집 한 권을 이렇게 정성껏 읽기는 처음이다. 구체적인 삶에서 나온 언어들, 거기 담긴 간절한 기원이 마음을 움직였다.
스물한 살 때 첫 시집으로 ‘예일젊은시인상’을 받은 뮤리얼 루카이저는 평생 사회적 차별과 독재, 전쟁에 맞서 싸운 투사 시인이었다. 초기작 ‘어린 시절로부터의 시’에서 “경험을 들이마시고 시를 내쉬어라”라고 썼듯이, 그는 언제나 자신이 겪고 느낀 것을 토대로 작업했다. 시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시의 생애>는 스페인 내전의 경험에서, 대표작 <사자의 서>는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광부들의 현실에서, 생애 마지막 시집 <문>은 김지하 시인의 석방운동에서 나왔다. 그러니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출간한 <어둠의 속도>가 반전을 노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반전을 노래한다는 말이 이상할지 모른다. 하나 시인은 시집에 실린 여러 편의 ‘노래’(Song) 시가 보여주듯, 정말이지 반전을 외치지 않고 노래한다. 그 노래는 스페인 강변과 베트남 숲속에서 죽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이며, 전쟁 같은 삶에 의해 끊어지는 노래이다. 오르페우스가 그랬듯 시인은 본래 노래하는 자이기에, 루카이저는 이 노래를 기억하고 이어부르는 것을 자신의 책무로 삼는다.
그러나 그가 부르는 노래는 이제까지 시인들이 배워 부르던 노래가 아니다. 시집을 여는 첫 시에서 그는 “가면은 이제 그만! 신화는 이제 그만!”이라고 선언한다. 신화적 권위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기억, 자신의 언어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겠다고 다짐한다.
이 다짐을 이루기 위해 그는 길가의 “작은 돌멩이”와 “화염을 비처럼 맞는 어린아이들”과 “치아파스의 굶주린 여자들”에게 귀 기울인다. 자신처럼 “전쟁들 사이에 생이 붙잡혀” 괴로워하면서도 끝내 고통받는 이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았던 ‘케테 콜비츠’의 생에 귀 기울인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지상의 모든 존재가 들려주는 푸가의 선율을 듣는다. 되풀이하며 나아가는 푸가는 세상 만물이 하나이며 너의 죽음과 나의 삶이 하나임을 들려주는 유대(紐帶)의 노래다.
루카이저는 자신도 당대의 전쟁에 책임이 있음을 안다. 오랜 차별과 폭력의 역사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언어로 노래하고 싶지만 쉽지 않음도 안다. 그래도 그는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다. “우주는 원자가 아니라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푸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목소리를” 위한 마중물 같은 노래, 새롭게 변주되며 풍부해질 음악이기 때문이다.
하여 푸가와 나선의 진보를 믿으며 시인은 “굽은 부리”로 노래 부른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태어났든 모든 존재에는 “각자의 기품이 담겨 있다”고.(‘어둠의 속도’) 여전한 전쟁의 시대, 각자의 기품을 기억할 때다.
김이경 작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란, 카타르·쿠웨이트·UAE·바레인 미군기지·예루살렘에 미사일”

트럼프, 이란 국민에 “우리 작전 끝나면 정부 장악하라”

이스라엘, 이란 공격 시작…미국도 공격 참가

장동혁 “2억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이 대통령 “개 눈에는 뭐만”…‘분당 아파트 시세차익 25억’ 기사 직격

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 국회 통과

‘장엄한 분노’ 미·이스라엘, 이란 대규모 공습…목표는 이란 정권 붕괴

국힘 “장동혁 대표, 오피스텔 한 채 매물로 내놔…거래는 아직”

파키스탄, 아프간에 전쟁 선포…탈레반 집권 후 최악 충돌

송언석, 천영식 8표차 부결에 “당 의원 일부 표결 참여 못해, 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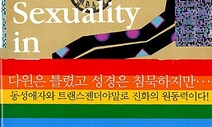



![[여자의 문장] 오늘은 남은 날들의 첫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226/53_16089104864529_3816089104598297.jpg)
![[여자의 문장] 지금 내 옆에 한 역사가 있구나](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205/53_16071542872292_5316071542603478.jpg)
![[여자의 문장] 긴즈버그가 살아 있다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107/53_16046788066306_4016046787948322.jpg)
![[여자의 문장] 이이효재 선생님의 사랑 덕분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016/53_16028376100073_3316028375771239.jpg)
![[여자의 문장] ‘말해야 알지’에서 ‘말하면 뭐 해’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918/53_16004060688722_7416004050542492.jpg)
![[여자의 문장] 온몸이 담덩어리였던 여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831/53_15988548501725_9015988548343815.jpg)
![[여자의 문장] 끝까지 사는 것, 내 의무이고 책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24/53_15955930226408_18159559299991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