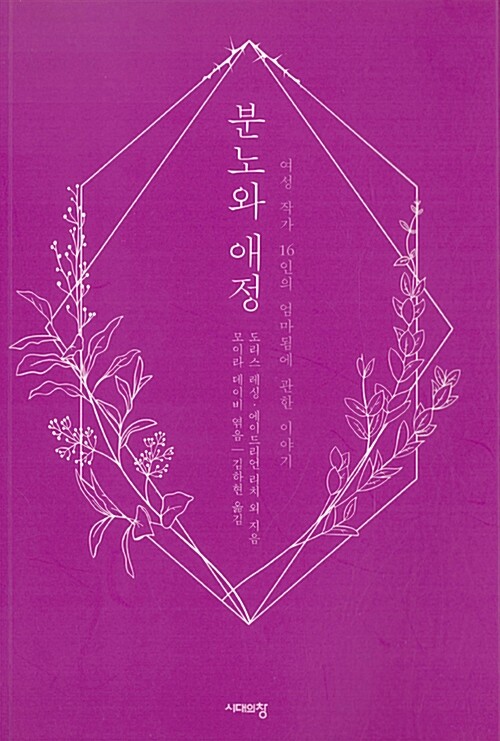
여성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 하나다.
그건 특권이다. 의무나 운명이 아니다.
-어슐러 르 귄 등 지음, <분노와 애정>, 김하현 옮김,
시대의창, 248쪽, 2018년
자기 엄마를 좋아하는 딸은 흔치 않다. 존경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많은 딸이 엄마의 불만, 차별, 잔소리, 신경질, 신세한탄, 무력함에 질려서 집 떠나기를 고대하고 결혼을 선택한다. 그리고 자기 엄마 같은 엄마가 아닌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하지만 막상 엄마가 되면 생각과 다른 현실에 당황한다. 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자기가 낳은 아이임에도 아이는 사랑스럽기보다 낯설게 느껴진다. 물론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더없이 행복할 때가 있지만, 징징대고 빽빽대고 밤잠을 깨웠단 이유로 살기등등한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많다.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고, 좋은 엄마는커녕 엄마 될 자격도 없는 인간이란 자괴감에 시달린다.
<분노와 애정>은 이런 엄마들(양육자 대부분이 엄마라 이렇게 표현한 걸 양해하길!)과 이런 엄마를 이해하고 싶은 이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다. 도리스 레싱, 실비아 플라스, 앨리스 워커 등 영어권 여성 작가 16명이 엄마됨에 관해 쓴 이야기를 모았는데, 여기저기서 발췌한 글이 많아 아쉬움이 남긴 하나 엄마 노릇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읽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책이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자책감을, ‘남들도 다 이렇구나’ 하는 공감으로 떨칠 수 있다.
공감의 지점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누구는 “버지니아 울프보다 잘할 때까지 아이는 갖지 않겠다”고 다짐하다가 불과 2년 만에 “중요한 건 언제 아이를 낳느냐가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것”이라며 걱정하는 실비아 플라스에게 공감하고, 누구는 “애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애들이 진짜 밉다”는 제인 라자르의 고백과 “이 양가성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바로 모성애가 아닐까” 하는 그의 통찰에 공감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상실의 아픔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나의 엄마됨은 무언가를 천천히 계속해서 놓아주는 것이었다”는 엘런 맥마흔의 문장에 밑줄을 칠지도 모른다.
방점은 달라도 16개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읽다보면 결국 깨닫게 된다. 수전 그리핀이 지적하듯, 우리 문화에서 엄마됨은 희생을 요구하고 그래서 “엄마는 아이 안에서, 아이를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혹자는 아이가 자랄 때까지 몇 년간 엄마가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탓할 일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헌신과 희생이야말로 모성애란 숭고한 사랑을 이루는 힘이라고.
그러나 수전 그리핀은 세상이 당연시하는 엄마의 희생이 사실은 아이의 희생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엄마가 자아를 희생하면 아이도 자아를 희생한다. 엄마의 사랑은 아이를 집어삼킨다. 엄마의 평가는 억압이 되고, 엄마의 보호는 지배가 된다.”
희생한 엄마들을 ‘맘충’이라고 비하하는 아이들의 언어가 이 말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알다시피 누구도 희생하지 않을 때 모두가 즐겁다. 즐거움은 기쁨과 활력을 낳고 생을 긍정하게 한다. 그때 아이는 세상의 부모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한다. “태어나서 좋아요! 살아 있어서 좋아요!”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이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면 웃는 당신을 주어라. 진심으로 웃는 삶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그 삶의 시작은, 엄마인 당신의 진실을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이다. 에이드리언 리치가 말했듯,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앞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이경 작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쿠팡, 4분기 영업익 97%↓…김범석, ‘개인정보 유출’ 첫 육성 사과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

임은정, ‘한명숙 사건’ 소환해 백해룡 저격…“세관마약 수사, 검찰과 다를 바 없어”

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압수수색…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수사

‘재판소원 육탄방어’ 조희대 대법원…양승태 사법농단 문건 ‘계획’ 따랐나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쿠바 “미 고속정 영해 진입해 4명 사살”…미국은 일단 신중 모드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jpg)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국힘 지지율 17% “바닥도 아닌 지하”…재선들 “절윤 거부에 민심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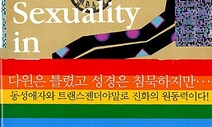



![[여자의 문장] 오늘은 남은 날들의 첫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226/53_16089104864529_3816089104598297.jpg)
![[여자의 문장] 지금 내 옆에 한 역사가 있구나](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205/53_16071542872292_5316071542603478.jpg)
![[여자의 문장] 긴즈버그가 살아 있다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107/53_16046788066306_4016046787948322.jpg)
![[여자의 문장] 이이효재 선생님의 사랑 덕분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016/53_16028376100073_3316028375771239.jpg)
![[여자의 문장] ‘말해야 알지’에서 ‘말하면 뭐 해’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918/53_16004060688722_7416004050542492.jpg)
![[여자의 문장] 온몸이 담덩어리였던 여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831/53_15988548501725_9015988548343815.jpg)
![[여자의 문장] 끝까지 사는 것, 내 의무이고 책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24/53_15955930226408_18159559299991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