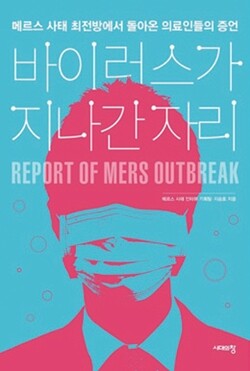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광풍이었다. ‘1번 확진 환자’의 증상이 발현한 게 2015년 5월11일이었다. 꼭 1년 뒤인 올해 5월11일 현재 확진자 186명 가운데 38명이 사망했다. 열에 둘이 숨졌다. 경제적 손실도 컸다. 메르스 환자의 진료·격리에 나섰던 의료기관·약국·상점 등 233곳에 정부가 준 손실보상금이 1781억원이었다. 내수·고용·수출 등 국내 경제도 줄줄이 주저앉았다. 메르스 사태 7개월 만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른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 사실상 메르스 사태는 끝이 났다.
왜 다시 메르스일까? 이외원 평택한마음병원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메르스가) 한국에 또 들어오면 다음엔 이번보다 나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태를 지배할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게다가 상식 이상의 정보가 의사에게도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면 또 당할 수밖에요.”
(시대의창 펴냄)는 메르스 사태 당시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했던 의료진 16명과의 인터뷰를 담담하게 이야기로 풀었다. 책은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과 보건 당국의 낮은 역량을 그대로 보여준다. 초기 방역 과정부터 문제였다.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의료진의 말을 들어보자. “주변에 의심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방침이 정비되는 데만 14일, 즉 2주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초기 의심환자를 확인한) 원장이 병원 문을 닫겠다고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그렇게 하라고 못했다고 해요. 그 순간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하느님이 조금만 더 심술을 부렸다면 아마 페스트처럼 인구의 절반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요.”
‘컨트롤타워’ 구실을 했어야 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더 깊은 한숨을 내쉬게 했다. “14번째 환자가 있을 때였죠. 저희 펠로우 선생님이 궁서체로 ‘살려야 한다’는 말을 써서 환자 이름 위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와닿은 거죠. 그래서 ‘저걸’(‘살려야 된다’는 문구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청와대에서 홍보 담당자가 와서는 그 문구를 열 장 출력해서 여기저기 붙였어요. 진짜 살려야 할 건 사람인데….”
현장은 전쟁터였다. 당국이 손을 놓은 사이에도 의료인들은 메르스 환자의 생존을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옆에서 산소 봐주고, 석션해주고, 네블라이저(천식 치료용 흡입분무 치료기) 해줘야 하는데요. 그 모든 일을 간호사가 다 하죠. 메르스 환자의 분비물 처리까지도요. 간호사들 진짜 펑펑 울었어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 없고, 장비는 허접한 거 주면서 일만 시키니까요.” 메르스 현장에 투입됐다는 이유로 인권도 무시됐다. 의료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너희 엄마 요즘 집에 오니?” 같은 차별과 멸시의 말을 들어야 했다. 최은영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병동 간호사는 “이런 상처는 고스란히 개인 몫으로 남았죠. 저희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기록에도 남겠죠”라고 했다.
인터뷰 전문가 지승호와 국내 전문의 10명으로 구성된 ‘메르스 사태 인터뷰 기획팀’은 책의 기획 의도에 대해 “제2의 메르스 사태 예방을 위한 진실한 리더십이 아직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에서 을 선물하세요 :) ▶ 바로가기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란 새 지도자 모즈타바 첫 연설…“호르무즈 봉쇄, 미군기지 공격 계속해라”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3006909357_20260312502955.jpg)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

오늘부터 휘발유 100원 더 싸게 산다…정유사 출고 최고액 ℓ당 1724원

오세훈, ‘장동혁 2선 후퇴’ 압박 초강수…서울시장 추가 모집 ‘버티기’

이스라엘, 이란 정권 붕괴 기대했지만…“환호가 좌절로”
![손녀와 초등학생 [그림판] 손녀와 초등학생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312/20260312503676.jpg)
손녀와 초등학생 [그림판]

이란, 종전 조건 ‘불가침·배상금’ 제시…미국과 평행선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