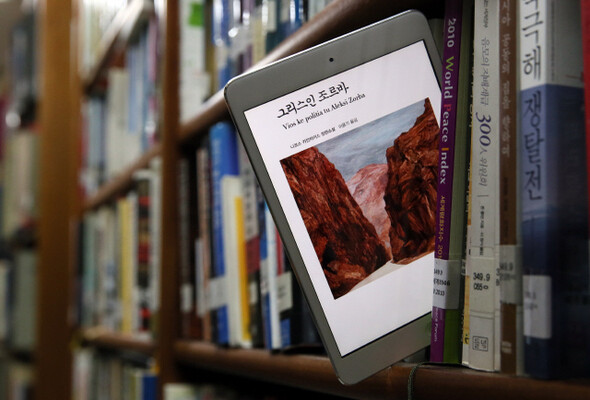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전자책 시장의 화두는 단연 “누가 ‘전용 단말기’ 시장을 선점하는가”였다. 미국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전용 전자책 단말기인 ‘킨들’이 성공을 거두자, ‘한국판 킨들’을 누가 먼저 차지하는가를 둘러싼 싸움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적표는 초라하다. 교보문고가 최근 내놓은 전용 단말기 ‘스토리K HD’와 YES24 등 서점 5곳과 출판사 4곳이 함께 만든 전용 단말기 ‘크레마터치’ 모두 1만 개 안팎의 판매에 그치고 있다. 인터파크 서점의 전용 단말기 ‘비스킷’은 현재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자신의 서점에서만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전용 단말기 경쟁에서 ‘한국판 킨들’이 탄생하지 못한 이유는 ‘콘텐츠 부족’ 때문이었다. 자기계발서 등이 중심이던 전자책 시장에서 볼 만한 책이 없어 이를 외면하는 고객이 많았다. 게다가 다양한 종류의 태블릿PC가 등장하자 상대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전용 단말기가 밀려나게 된 것이다.
전용 단말기 전쟁이 시들해진 전자책 시장에서 최근 스마트폰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자책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IT) 업체도 전자책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9월 구글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구글 플레이 북’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글 앱으로 웅진출판·21세기북스 등 국내 출판사 수백 곳의 책을 사볼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카카오 등도 전자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4월 ‘네이버북스’ 앱을 통해 전자책 단행본을 서비스한 네이버는 올해 초부터 작가 지망생의 소설 등을 올리는 ‘웹 소설’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는 1인 출판을 해 판매할 수 있는 ‘라이프러리’(lifelary)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출판계에서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건 교보문고가 내놓은 전용 단말기 ‘샘’(Sam)이다. 10만원대 단말기로 매달 1만5천~3만2천원을 내면 전자책 5~12권을 한 달 동안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대해 출판계에서는 도서정가제를 무력화하고 전자책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서비스라며 반발하고 있다. 열린책들을 시작으로 대형 출판사가 전용 앱을 통해 싼값에 전자책을 판매하는 걸 우려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표결 못한다” 여당서도 ‘법 왜곡죄’ 수정 요구…“후퇴 말라” 강경파 넘을까

‘800만원 샤넬백’…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왜 유죄일까

코스피 사상 첫 6000 돌파…5천피 달성 한 달 만에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한 전한길·김현태…“탈취 시도” 억지 주장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4/20260224503791.jpg)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이 대통령 “산골짜기 밭도 20만~30만원”…부동산 타깃 확대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