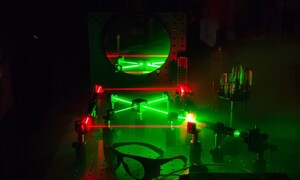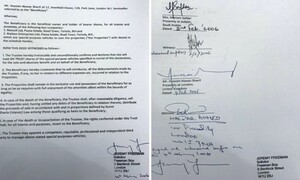먹음직한 음식 사진이나 재롱 떠는 아이 사진도, 가난과 질병으로 스러져가는 빈민촌 참상에도 ‘좋아요’ 1표 외에 더 무엇을 보탤 수 있으랴. 하지만 세상엔 ‘좋아요’를 눌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부지기수다. ‘좋아요’로는 부족하다.
스마트폰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없던 시절도 있었다. 그 시절엔 대자보가 ‘트위트’요, 담벼락이 ‘타임라인’이었다. 아, 대자보라니! 이제야 고백건대, 내게도 ‘안녕하지 못한’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20년쯤 전 얘기다. 군대를 막 제대하고 복학한 나는 한창 전공 공부에 재미를 붙이던 중이었다. 그날도 친구와 둘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유학 중이던 선배에게서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그 선배는 현지 유학생 선배들에게 들었다며, 학과 교수님과 관련해 좋지 않은 소문을 수화기 너머로 들려줬다. 그러면서 삼엄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이 얘길 꼭 대자보로 널리 알려라. 너희 둘만 믿는다, 딸깍.”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비밀 지령을 받은 스파이가 꼭 이런 기분이겠지. 나와 친구는 조용히 책을 덮었다. 문방구에 가서 유성매직을 색깔별로 사고, 전지와 청테이프도 넉넉히 골랐다. 친구는 전지를 꼭꼭 접어 줄을 만들었고, 나는 첫 줄부터 차례로 여백을 채워나갔다.
방금 접수한 따끈따끈한 소식은 이내 전지 두 장을 채웠다. 새벽 2시. 우리 둘은 택시를 타고 학교로 달렸다. 학교 후문에 도착해 담벼락에 대자보를 붙이고 다시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까지 1시간30분 남짓. 우리는 떨리는 와중에도 은밀한 폭로의 짜릿함을 즐기고 있었다. 두고 봐. 내일이면 학교가 발칵 뒤집어질 거야. 우리 둘은 동이 틀 때까지 소주잔을 부딪치며 주책없이 솟구쳐오르는 뿌듯함을 달랬다.
다음날, 학교 후문을 들어섰다. 대자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후후, 지금쯤 난리가 났을 테지. 동태를 살피러 학과 사무실로 조심스레 들어갔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너무도 평온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 누구도 대자보나 거기서 문제 삼은 교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우리가 붙인 대자보 위엔 곧 다른 대자보가 채워졌다. 우리의 반란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허무하게 진압됐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대학원 술자리에서 그 대자보 얘기가 우연히 나왔다. 당시 조교였던 선배가 기억을 떠올리며 심드렁하게 내뱉었다. “아, 그 대자보? 그거 앞뒤도 잘 안 맞고 얘기도 횡설수설해서, 본 사람들이 뜨악하고 지나갔던 건데.” 맙소사. 젊은 날의 내 짧은 혁명이여.
돌이켜보면 굳이 대자보를 고집하지 않아도 됐다. 나는 당시 PC통신에 한창 빠져 있었다. 새롭고 혁신적인 소통 도구를 써서 그 내용을 퍼뜨렸다면 어땠을까. 그 뒤로도 이따금 쓴웃음을 지으며 당시를 떠올린다.
2013년 세밑, 대자보가 다시 등장했다. PC통신도 저물었고 홈페이지마저 구닥다리가 된 시대에. 대학 08학번. 새내기 시절 광우병 촛불시위를 경험하고, 군대를 다녀와선 희망버스에 올랐던 청년이 대학 담벼락에 대자보를 붙였다.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삐뚤빼뚤 물으며.
처음엔 생뚱맞은 만큼이나 의아했다. 왜 대자보일까? 페이스북 담벼락과 카카오스토리가 더 익숙해 보이는 27살 청년이. 손쉽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퍼뜨릴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지천이잖은가. 그런데 고작해야 반나절, 그것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나 수명을 다할 대자보에 왜 울분을 쏟아내는 거지?
내 ‘상식’은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았다. 담벼락에 붙인 투박한 외침은 거대한 울림이 됐다. 이 청년의 일갈은 SNS를 타고, 미디어를 넘어, 다른 대학가 담벼락으로 전염됐다. 온·오프라인 담벼락 여기저기서 안부를 빙자한 ‘자기 고백’이 내걸렸다. 그렇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메시지’였다. 혁신적 도구가 메시지의 고루함을 채워주리라 믿었던 나는 안이했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먹음직한 음식 사진이나 재롱 떠는 아이 사진도, 가난과 질병으로 스러져가는 빈민촌 참상에도 ‘좋아요’ 1표 외에 더 무엇을 보탤 수 있으랴. 하지만 세상엔 ‘좋아요’를 눌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부지기수다. 태초에 ‘좋아요’와 ‘리트위트’ 이전에 메시지가 있었다. 기계적으로 공감을 보태는 데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부산 찾은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었어도 코스피 5천~6천 가능성”

60살 이상, 집에서 6천보만 잘 걸어도 ‘생명 연장’…좋은 걷기 방법

미국 공수부대 대규모 본토 훈련 취소…이란 지상전 투입설 확산

트럼프 “이란, 오늘 매우 강력한 타격 입을 것”…공격 확대 시사

배우 이재룡, 또 음주운전 사고…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도주까지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77491692_20260305504002.jpg)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별 떨어진 후덕죽 “반성의 기회”…손종원 ‘더블 별’ 유지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9%, 김민석·장동혁·한동훈 4% [갤럽]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9%, 김민석·장동혁·한동훈 4% [갤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619029891_20260306500988.jpg)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9%, 김민석·장동혁·한동훈 4% [갤럽]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217/53_17659590361938_241707891273117.jpg)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819701798_20260306502051.jpg)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