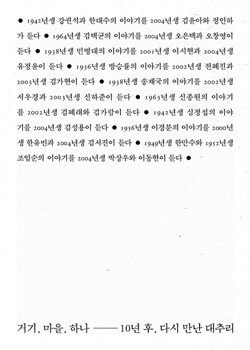
시간이 지나도 눈앞에 선명한 것들이 있다. 2006년 5월4일 새벽,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공사를 위한 대추리 행정대집행이 진행됐다. 군인들은 헬리콥터로 철조망을 가져와 공사 예정 구간에 설치하고 경찰은 무장한 채 이들을 호위했다. 군경이 아이들 등교 버스까지 막아서자 주민들은 분노했다. 공권력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모습이 뉴스를 타고 생중계됐다. 이날 새벽 펼쳐진 군경의 작전명은 ‘여명의 황새울’. 저녁이면 노을로 붉게 물들던 황새울 들판의 이름을 딴 작전이었다.
2007년 2월, 정부와 이주 협상이 타결되면서 대추리에 남았던 마흔네 가구 주민들은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로 이주했다. 대추리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평택평화센터 기획, 다돌책방 펴냄)는 이주 10년을 맞은 2017년 주민들의 마음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 결과물 중 하나다. 평택평화센터는 청소년들이 묻고 주민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매번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옛날과 그때와 오늘의 대추리’에 대한 기록을 구술로 담았다.
따지고 보면 대추리 사람들은 늘 쫓겨나기만 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기지가 세워지며 ‘원대추리’에서 쫓겨났고, 해방 뒤 미군이 기지를 확장하면서 ‘구대추리’로 다시 밀려났다. 2002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또 쫓겨나 현 대추리 평화마을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싸움은 여태 끝나지 않았다.
2007년 합의안에는 노와리 이주단지의 명칭을 ‘대추리’로 바꿀 수 있고, 주민들 생계를 위해 상업용지 8평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대추리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살았던 방승률(83)씨는 “우리가 나올 때 정부와 협상 볼 적에 대추리라는 명칭은 꼭 갖게 해준다고 했었던 거, 그게 안 되는 거가 제일 자존심 상한다”고 말했다.
현대식으로 지은 집 한 채만 가졌을 뿐 돈벌이도 막막하다. 스물네 살 때 시집와 대추리에서 살았던 한대수(77)씨는 말한다. “돈벌이가 없지, 아무것도. 대추리에서 살았으면 내 손으로 농사짓고 애들 도와줘가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주해 10년을 살았어도 정이 붙지 않는지 송재국(81)씨는 옛날 집이 그립다. “대추리에서는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지만 그렇게 살 때는 들어가면 온화하고 포근했는데…. ”
대추리 주민들이 국가의 이주계획에 목숨 걸고 저항했던 건 보상비가 적어서도, 전문 데모꾼들에게 이용당해서도 아니었다. “올해도 농사짓자”던 시위 구호 그대로 대지에 깊이 뿌리내린 삶을 이어가고 싶었을 뿐이다. 경남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 제주 해군기지 등 논란이 있을 때마다 주민의 바람은 모두 같았다.
미군기지 확장 반대 팽성읍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맡았던 주민 김택균(55)씨는 정부에 이 말이 하고 싶다.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먼저 생각하고, 그분들하고 먼저 대화를 나누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어.”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새겨들을 이야기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란, 하메네이 사망 확인…후계자 라리자니 “미국 후회하게 만들겠다”

‘하메네이 사망’ 이란, 후계자 라리자니 체제 이미 구축

미군 사령부 ‘명중’ 시킨 이란…미 방공미사일 고갈 가능성 촉각

트럼프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이번 주 폭격 계속”

트럼프, 이란 국민에 “우리 작전 끝나면 정부 장악하라”

이 대통령 “북 체제 존중, 흡수통일 추구 않겠다”…3·1절 기념사

국세청 직원과 싸우다 던진 샤넬백에 1억 돈다발…고액체납자 81억 압류

전한길은 왜 ‘후추 스프레이’를 휴대할까…국회 검색대서 발각 소동

범여권 주도 ‘사법 3법’ 완료…‘법원행정처 폐지’ 추가 입법 만지작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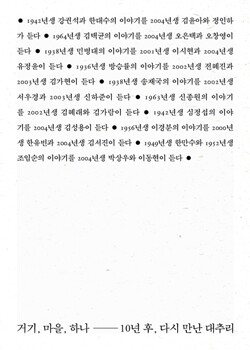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