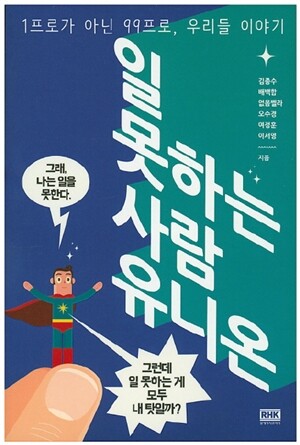
여정훈은 1년6개월 동안 어느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뒤 나왔다. “회의시간은 나의 결과물과 계획에 대한 성토로 채워졌고, 사무실 분위기도 갈수록 험악해졌다. 회의시간에 몇 번을 뛰쳐나왔다. 일을 잘해보려고 할 일 목록을 적는 노트도 만들어보고 표도 그려봤지만, 노트든 표든 다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나는 퇴사를 결정했다.” 그러고는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었다(https://www.facebook.com/groups/1motU/). 장난 삼아 만든 그룹을 찾아온 사람들은 “나도 일 못해요” 고백을 이어갔다. “일 못하는 나는 세상의 찌꺼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말을 밖으로 꺼내보니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여정훈)
세상의 책은 일 잘하는 법으로 가득하다. 순식간에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 습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 누가 더 끝까지 해내는가,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수많은 ‘성공’ 책 속에서 (RHK 펴냄)은 특이하다. 세상에는 ‘일못’(일 못하는 사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잘’(일 잘하는 사람)이고 싶은 책이 가득한 것이겠지만. 책은 그렇게 모인 유니온 멤버들이 ‘일못’을 고백하고 다독이면서 자신의 잘못 너머를 바라보는 책이다.
‘일못’들이 ‘내 탓이오’ 하다보니 통찰이 흐른다. “네가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야, 일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라는 말은 인격 모독이지 충고가 아니었다(배백합). 우리 가족도 아니거니와(이서영). 고양이 장례식을 치른 뒤 나간 사무실에서는 사람들이 “고양이 장례식 하느라 월차 낸 사람”이라고 놀렸다. 그전에는 누군가 “고양이 살았어요, 죽었어요”라고 무신경하게 묻기도 했다. “나는 일을 잘한다는 것은 ‘기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이서영)
결국 ‘일못’들은 한국의 노동 환경이 ‘일못’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관찰에 이른다. 효율을 중요시하는 곳, 하루의 할당량이 높게 정해진 곳에서는 ‘일못’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캐나다에 간 친구는 야근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일하다보면 급하게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드물더라도 오늘 회의하고 내일 일을 완성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나?” “아니지, 그렇게 한국처럼 일정을 타이트하게 짜지 않지. 애초에.” “와, 부럽다. 나 같은 느림보 직원이 있으면 시행착오에 걸린 시간까지 고려해서 미리 계획을 다 짜는 건가?”(94~96쪽)
성공회 전도사이면서 ‘일못’ 멤버이기도 한 노승훈은 이런 말을 한다. “(일못은) 선천적으로 재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규정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그걸 규정하는 사람을 난 ‘꼰대’라고 부르고 싶다. …나는 일 잘한다. 그런데 어딜 가나 한 명쯤은 나와 호흡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 사람이 내 상관이고 직장의 파트너라면 나도 ‘일못’이 될 뿐이다.”
‘일못’은 인간적이다. ‘쓸모와 무쓸모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쓸모 있고도 표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잘’이니 ‘일못’들은 ‘일 못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악플이 달려도 ‘지속 가능한 일못’을 연구(오수경)하고 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장동혁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라...당원 투표 결과 따를 것”
![법정의 참 군인과 비굴한 군인 [왜냐면] 법정의 참 군인과 비굴한 군인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4/53_17702022240809_20260204503792.jpg)
법정의 참 군인과 비굴한 군인 [왜냐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헌법·법률 따른 판결”

명태균·김영선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 무죄

장동혁 “선거권 16살로 낮추자”…민주 “반대하다 갑자기 왜”

체납 ‘전국 1위’ 김건희 모친, 25억 납부 거부…80억 부동산 공매

박근혜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빌린 10억 못 갚아

암 환자는 왜 치매가 드물까?…연구 15년 만에 단서 찾았다
![이 대통령 지지율 63%…민주 41% 국힘 22% [NBS] 이 대통령 지지율 63%…민주 41% 국힘 22% [NB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5/53_17702584059712_20260205501484.jpg)
이 대통령 지지율 63%…민주 41% 국힘 22% [NBS]

“이런 못된…” 이해찬 묘비 ‘AI 패륜조작’ 사진 돌자 CCTV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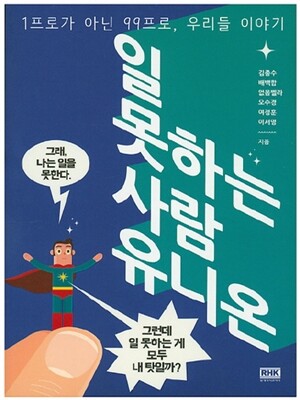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