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옷방을 정리했다. 그렇다. 나는 심지어 옷방을 갖고 있을 정도로 옷이 일반적인(이라고 일컫는) 남자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사를 갈 때면 이삿짐센터 청년들이 “대체 뭐하시는 분이세요?”라고 한 번도 빠짐없이 물어볼 정도로 말이다.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밤무대 가수예요”라거나 “무명 배우예요”라고 대답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더 귀찮은 질문에 더 창의적인 거짓말을 내놓는 것이 귀찮아서 참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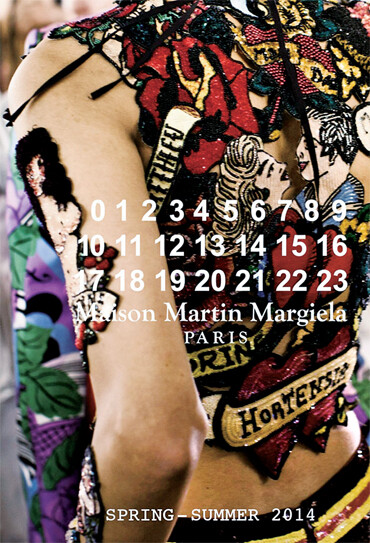
Maison Martin Margiela 광고 갈무리
하여간 옷방을 정리하다가 화들짝 놀랐다. 옷이 끝없이 나왔다. 나오고 또 나왔다. 그러다 지난가을 대여섯 번 입고 처박아뒀던 가죽 재킷에 살짝 곰팡이가 슨 것을 발견하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싶어졌다. 나는 재킷을 위해 희생당한 가엾은 양의 고귀한 넋을, 심지어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 가죽 재킷은 내가 가장 아끼는 옷 중 하나로, 벨기에 디자이너 마르틴 마르지엘라가 만든 브랜드 ‘메종 마르틴 마르지엘라’의 라벨이 붙은 제품이다. 겉에만 살짝 슨 곰팡이를 마른 수건과 페브리즈를 이용해 마구 닦아내면서 나는 또다시 감탄했다. 이건 정말이지, 패션 천재의 유산이 곳곳에 박혀 있는 좋은 가죽 재킷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마르지엘라라는 이름을 보면서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한겨레신문사의 구본준 기자를 떠올렸다.
그는 내가 아는 가장 멋진 선배 중 한 사람이었다. 멋지다고 해서 그가 꼭 옷을 잘 입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그는 좋은 옷과 좋은 신발을 볼 줄 알았고, 그가 사랑했던 ‘건축’만큼이나 관심을 기울이며 공부를 했다. 어느 날 그는 내 스니커즈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어떤 디자이너가 만든 거냐고 물었다. 마르틴 마르지엘라의 디자인이라고 했더니 이런 기대치도 않았던 대답이 나왔다. “안 그래도 마르지엘라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멋진 디자이너 같애. 다음에 신발 살 때 나도 한번 따라갈까?”
구본준 기자가 지금 살아 있었더라도 마르지엘라의 스니커즈나 구두를 샀을지는 모르겠다. 그는 아이가 있는 가장이었으니까 가끔 구두에 큰돈을 투척하는 독신남들의 대범함을 흉내 내지는 못했을 거라는 데 내 마르지엘라 스니커즈를 걸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마치 건축을 사랑하듯이 옷을 설계하는 디자이너와 옷을 짓는 장인들을 궁금해했고 또 사랑했다. 그건 우리가 프랭크 게리가 지은 오피스에 살지 못하고 안도 다다오가 지은 콘크리트 2층집에 살지 못하면서도 그들이 만든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값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우리가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값을 치르고 내 옷방에 욱여넣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스타일리시한 것인지를 배운다.
나는 이 마지막 칼럼을 읽는 당신이 건축과 영화와 산업디자인의 천재들과 장인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 패션디자이너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조금 더 발휘해주면 좋겠다. 그 호기심은 어쩌면 당신에게 유니클로와 H&M의 거대한 옷더미 속에서도 제값보다 더 값진 것을 고를 수 있는 심미안을 가져다줄지도 모른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3006909357_20260312502955.jpg)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이란, 종전 조건 ‘불가침·배상금’ 제시…미국과 평행선

내일부터 휘발유 100원 더 싸게 산다…정유사 출고 최고액 ℓ당 1724원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손녀와 초등학생 [그림판] 손녀와 초등학생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312/20260312503676.jpg)
손녀와 초등학생 [그림판]

오세훈, ‘장동혁 2선 후퇴’ 압박 초강수…서울시장 추가 모집 ‘버티기’

‘대출 사기’ 민주 양문석 의원직 상실…선거법은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