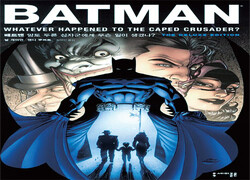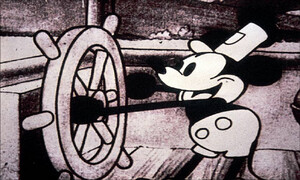보통 공포영화의 캐릭터들은 오래전 전설과 민담에서 시작된다. 뱀파이어나 늑대인간 등이 그렇고, 근대과학의 발명품인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역시 골렘을 비롯한 영혼이 없는 인형 혹은 괴물로 전해 내려온 존재였다. 카리브해의 부두교에서 실제로 존재했고, 동양에서는 강시로 나오기도 했던 좀비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좀비’로 정착된 것은 조지 로메로의 영화 (1968)부터였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덤 속의 시체들이 깨어나고, 좀비에게 물리면 누구나 좀비가 되는 악순환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끔찍한 공포였다. 1950년대에 유행했던 ‘외계 침공’에 대한 공포가 내부의 공포로 바뀐 것이기도 했고.
조지 로메로가 만든 좀비 3부작의 2편인 에서는 좀비들이 살아 있을 때의 기억과 습관을 따라 대형 쇼핑몰로 밀려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좀비는 종말의 날에 깨어나는 시체들만이 아니라, 각종 이데올로기와 매스미디어에 현혹돼 대량소비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현대인을 은유하기도 했다. 한동안 소원했던 좀비영화가 부활한 것은 대니 보일의 (2002) 덕분이었다. 초자연적인 재앙이나 정부의 극비 실험 같은 애매한 이유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이라는 설정의 의 좀비는 야수처럼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습격했다. 을 리메이크한 역시 찬사를 받으며 ‘좀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했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지만 원작의 충격이 더 놀랍다. 로버트 커크먼 글, 토니 무어와 찰리 아틀라드 그림의 <워킹 데드>.
이후 좀비는 공포영화만이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영화·소설·만화·게임 등 각종 장르에서 ‘좀비’는 천변만화 캐릭터를 확장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열풍 이후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영 어덜트’ 장르에서는 ‘의식을 가진’ 좀비와 사랑에 빠지는 까지 나왔다. 생각 없이 인육을 먹는 종말의 존재가 아니라, 의식을 가진 또 하나의 종으로까지 좀비 캐릭터는 확장되고 있다. ‘시체’라는 캐릭터의 특성상 한계는 명확하겠지만, 인간을 종말로 몰아넣는 가장 확실한 공포로서 좀비의 존재감은 절대무적이다. 뇌를 부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고, 단 하나의 인간도 남지 않을 때까지 증식하는 존재.
마침 동서양의 만화에서도, 좀비물의 걸작이 탄생했다. 먼저 로버트 커크먼 글, 토니 무어와 찰리 아틀라드 그림의 . 의 프랭크 대러본트가 제작한 드라마로 본 사람이 더 많겠지만, 당연하게도 원작의 힘과 감동 혹은 충격이 거의 하늘과 땅 차이다. 커크먼은 좀비영화들의 뒷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일단 사지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는 전형적인 좀비물의 영역에서 출발해 점점 상승하며 묵시록의 아비규환을 목도하게 만든다. 이건 결코 끝나지 않을, 끝이 존재할 수 없는 지옥도다. 드라마의 지나친 가족주의와 인간성 탐구가 지겨웠다면 만화를 반드시 보라고 권한다. 인간성이란 추구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육의 끝에서 건져 올리는 유일한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의 작가 하나자와 겐고의 전작은 소심하고 찌질한 청년의 분투를 그린 이다. 는 그런 찌질한 청년 만화가가, 좀비들로 가득한 종말의 시대에 ‘영웅’으로 서는 과정을 그린다. 슈퍼히어로? 천만에. 야말로 좀비처럼 살아가던 인간이 어떻게 영웅의 씨앗을 내부에 지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만화다. 어떻게 피어나는지 역시. 또한 는 영화보다 영화적인 컷과 연출로 좀비들의 세상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경이로운 작품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

미 “모즈타바 외모 훼손됐을 것…다음주 이란 매우 강하게 타격”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

홍익표 정무수석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