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였다. 무엇이든 가능해 보였지만, 실제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혼란과 무질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시대였고….”
찰스 디킨스는 1859년 펴낸 를 이렇게 시작한다. 소설의 무대는 혁명기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이다. 부와 빈곤, 탐욕과 굶주림, 욕망과 회한, 빛과 그늘이 동시에 등장한다. 18세기 유럽은 모순덩어리다. 예루살렘은, 18세기 유럽에나 어울리는 도시다.
한 손엔 십자가, 다른 손엔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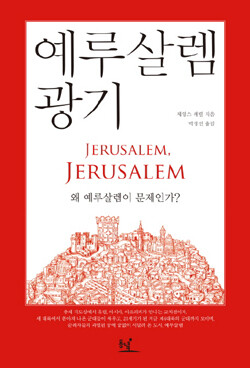
1
“이 책(, 제임스 캐럴 지음, 박경선 옮김, 동녘 펴냄)은 예루살렘이라는 실제 도시와 그 도시가 던져주는 묵시종말론적 환상 간의 치명적 순환 고리에 관한 책이다. 다시 말해, 두 예루살렘에 관한 책이다.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현세의 예루살렘과 상상 속 예루살렘, 그러한 이중성은 기독교의 예루살렘과 유대교의 예루살렘, 그리고 언덕 위 도시라는 실제 지리상의 예루살렘과 메시아 국가라는 이상으로서의 예루살렘 간 긴장을 통해 한층 두드러진다.”
지은이는 ‘열병’이란 낱말을 머리글의 제목으로 삼았다. 두 개의 천 년이 흐르는 동안, 예루살렘을 향한 인류의 집착은 가히 열병에 가까웠다. 그 도시를 향한 ‘환상’으로 유럽인들은 한 손에는 십자가, 다른 손에는 창을 꼬나쥐고 중세를 배회했다. 예루살렘의 ‘은유’다. 지은이는 “지난 2000년간, 예루살렘의 지배 세력은 열한 차례나 거듭 전복됐고, 거의 모든 경우 극단적 폭력을 수반했으며, 그 전면에는 늘 종교가 있었다”고 짚는다.
인류가 자랑하는 양대 유일신교인 기독교와 이슬람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점은 ‘열병’의 실체를 웅변한다. ‘폭력적 소수자’의 전형 격인 유대인들의 종교도 예루살렘에서 발원했으니, 유일신교의 배타성은 그 땅의 흙에라도 깃들어 있는가? 하긴 조지 부시와 도널드 럼즈펠드도 이라크 땅을 유린할 때 ‘예루살렘’을 외쳤다. 예루살렘은 두루 ‘성배’다.
유대인과 무슬림의 성소, ‘통곡의 벽’과 ‘황금 돔 사원’이 공존하는 예루살렘을 지은이는 “환상이 현실화한 도시”라고 짚는다. 긴 세월 수많은 민족이 환상을 품었으나, 꿈을 현실로 이뤄낸 것은 유대인이었다. 땅 없는 백성이던 그들이 ‘홀로코스트의 광기’를 뚫고 나라를 세운 것은 1948년이다. 그 땅에 살던 아랍인들에게는 나크바, 곧 대재앙의 원년이다. 지은이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표현을 빌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희생자의 희생자가 됐다”고 썼다.
“아랍인들이 왜 화해해야 하는가? 만일 내가 아랍 지도자라면, 절대 이스라엘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나라를 빼앗았다. 물론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게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우리 하느님은 그들의 하느님이 아니니 말이다.”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인 다비드 벤구리온 초대 총리의 고백이다.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마무리된 땅에서 팔레스타인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됐다. 매일이 전쟁이었고, 전쟁은 오늘도 계속된다. 어느 한쪽이 온전히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그날까지. 유대인의 게토는 팔레스타인의 가자다. 벤구리온의 말을 더 들어볼까?
“우리는 분명 이스라엘에서 왔으나, 2000년 전의 일인데다 그게 그들에게 무슨 상관인가? 반유대주의, 나치, 히틀러, 아우슈비츠가 있었다. 하지만 그게 그들의 잘못이었나? 그들의 관심사는 단 하나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그들의 나라를 훔쳐갔다는 거다. 그들이 그것을 왜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란, 카타르·쿠웨이트·UAE·바레인 미군기지·예루살렘에 미사일”

트럼프, 이란 국민에 “우리 작전 끝나면 정부 장악하라”

이스라엘, 이란 공격 시작…미국도 공격 참가

미·이스라엘 작전명 ‘장엄한 분노’…“이슬람 공화국 체제 붕괴 목표”

장동혁 “2억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송언석, 천영식 8표차 부결에 “당 의원 일부 표결 참여 못해, 사과”

이 대통령 “개 눈에는 뭐만”…‘분당 아파트 시세차익 25억’ 기사 직격

트럼프의 공습 ‘이란 정권교체’ 가능할까…중동 장기광역전 우려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570592077_20260227501013.jpg)
한밤중 다리에 쥐나는 ‘하지정맥류’…“자연 회복 불가능, 빨리 치료” [건강한겨레]

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 국회 통과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