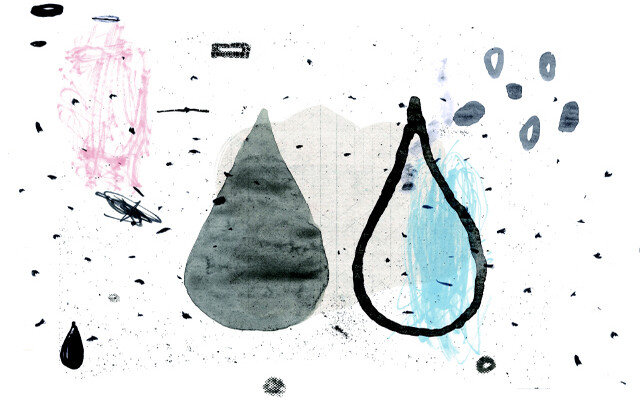뜬금없는 고백이지만 원래는 ‘음양의 음영’이 아니라 다른 타이틀로 이 지면을 맡으려고 했다. 지난 4월, 연애 칼럼을 제안받고서 처음 생각했던 제목은 ‘물방울과 티끌의 일’이었다. 국어사전에서 연애를 찾아보면,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함’(‘남녀’로 한정한 것이 다소 찜찜하지만)이란 의미 아래 또 다른 한자 조합의 ‘연애’가 있다. 바로 ‘涓’(물방울 연)과 ‘埃’(티끌 애)로 이루어진 연애다. 물방울과 티끌. 아주 작은 것을 이르는 말이란다. 묘한 조합이다. 맨 처음 든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미세하다는 것 외에 물방울과 티끌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가. 그렇다면 조그맣다는 이유만으로 물방울과 티끌을 묶어버려도 괜찮은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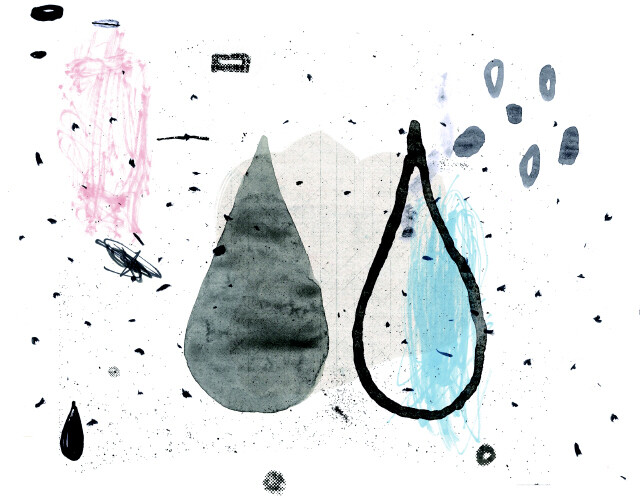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조승연
곱씹을수록 연애(戀愛) 역시 물방울과 티끌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방울은 다른 물방울과 구분되지 않고 티끌도 그렇다. 마찬가지로 관계 속 당사자들이 집채만 하게 느끼는 일들도 유사 이래 수많은 커플이 거쳐온 패턴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 한 라디오의 연애상담 코너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연애 중에 생기는 고민은 정말 비슷함을 실감한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들한테 너무 친절해요” “장거리 커플인데 전화할 때마다 싸워요”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이전보다 관계가 세분되긴 했지만(‘썸’처럼) 방송 콘텐츠로서의 연애상담은 기시감과의 악전고투다.
반면 클로즈업으로 들여다본 연애는 신기할 정도로 이질적 요소를 동시에 품고 있다. 배려와 질투, 게임과 미션이 공존하며 태내 이후 가장 아늑한 안정감과 캡사이신처럼 알싸한 성적 긴장감이 공존한다. 서로 다른 수십 년의 내력을 갖고 있는 두 개체가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희한할 정도로 비일상적이다. 물방울처럼 맺히고 흐르고 번지는 사람이 티끌처럼 뭉치고 날리고 쌓이는 사람과 하나 되고자 하는 것. 이처럼 연구비 따기 힘든 실험이 또 있을까. 어쩌면 지구 어딘가에, 서로 끌어당기고 어우르고 할퀴고 핥는 두 사람을 보고 ‘그야말로 한 쌍의 물방울과 티끌이구나!’라는 관용구로 일컫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으리라.
이 탐탁스러운 타이틀을 쓰지 않은 이유는 당시 작업하던 노래 제목으로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까놓고 말해 원고료보다 저작권료 쪽이 압도적으로 더 크기도 하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노래 제목으로도 쓰지 못했다. 나의 작업 파트너는 이 테마가 나만큼 맘에 들진 않았던 모양이다. ‘물방울과 티끌’은 반려됐고 결국 해당 곡은 다른 테마와 제목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물방울과 티끌’이란 곡이 들어갈 뻔했던 음반은 바로 가을방학의 새 앨범 이다.
그러고 보면 언니네이발관의 석원 형이 밴드라는 게 연애와 비슷하다고 한 적이 있다. 아니 결혼생활과 비슷하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왜냐면 한때 언니네이발관의 멤버였던 나를 이혼한 전처에 비유한 걸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그래서는 아니었겠지만 한동안 내 연관검색어 첫 번째가 ‘정바비 게이’였고 두 번째가 ‘정바비 이석원’이었다). 저 비유는 시사하는 바가 분명 있다. 서로 다른 수십 년의 내력을 가진 개체들의 음악적 결합이 연애나 결혼을 연상시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절대 내 맘 같지 않다. 나도 그(녀) 맘 같지 않다. 내가 각별히 아끼던 ‘물방울과 티끌’이란 제목이 동료의 반대로 이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이 상황이야말로 밴드가, 그리고 연애가 왜 물방울과 티끌의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로 그렇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60살 이상, 집에서 6천보만 잘 걸어도 ‘생명 연장’…좋은 걷기 방법

부산 찾은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었어도 코스피 5천~6천 가능성”

미국 공수부대 대규모 본토 훈련 취소…이란 지상전 투입설 확산

트럼프 “이란, 오늘 매우 강력한 타격 입을 것”…공격 확대 시사

배우 이재룡, 또 음주운전 사고…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도주까지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77491692_20260305504002.jpg)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9%, 김민석·장동혁·한동훈 4% [갤럽]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9%, 김민석·장동혁·한동훈 4% [갤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619029891_20260306500988.jpg)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9%, 김민석·장동혁·한동훈 4% [갤럽]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819701798_20260306502051.jpg)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

‘항명’ 박정훈 준장 진급…이 대통령 “특별히 축하드린다”

트럼프, ‘이민 단속 논란’ 놈 국토안보장관 경질…“청문회 발언이 결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