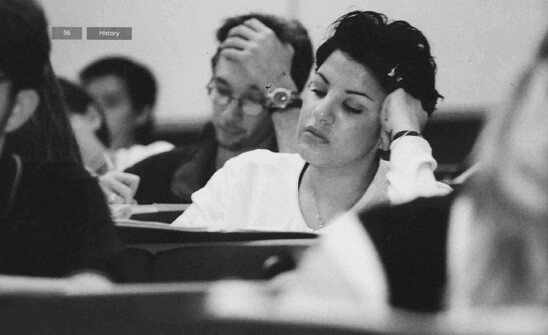4년 동안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교수와 눈을 맞추고 얘기한 시간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내가 다닌 학과는 인문대에다 유독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어문학과였다. 그럼에도 교수와 일대일로 얘기를 나눈 시간은, 그중에서도 수업이나 전공과목과 관련해 토론 내지 문답을 나눈 시간은 4년을 모두 합해도 채 1시간 아니 30분도 되지 않을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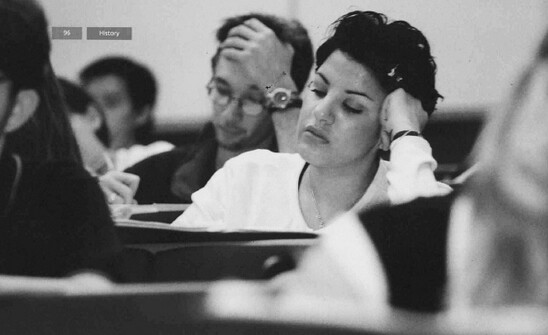
영국에서 인문·예술학 등의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런던대 산하 골드스미스칼리지의 수업 풍경. 영국 대학의 과목당 수업은 주당 1시간 강의와 3시간의 세미나로 이뤄져 있다. 골드스미스칼리지 제공
지난해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가장 낯설었던 장면은 교수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교수님, 식사는 하셨어요?”식 근황 토크나 “교수님, 학점 좀 잘 주세요” 혹은 “교수님, 오늘은 휴강해요”식의 조르기 토크가 아니다. “제 생각에는”으로 시작되는 내 의견 얘기하기다. 그게 어색하고 민망하면 학교 생활 적응에 실패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곳 대학에선 교수와 토론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니까.
영국 대학은 강의와 세미나가 2인1조로 움직인다. 교수의 강의가 끝나면 일정에 맞춰 이어지는 세미나에 들어가야 한다. 강의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는다. 대신, 세미나 출석 체크는 필수다. 세미나는 대학 공부의 꽃이다.
학생들의 조별 발표는 때로 지루할 만큼 뻔하기도 하고 가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쏟아지기도 한다. 외국 대학 예찬론이 나오면 공익광고처럼 펼쳐지는 영상물에서처럼 모두가 매번 치열하게 토론하지는 않는다. 물론, 교수에게 대드는 것처럼 화끈하게 토론을 하는 친구들은 꼭 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생이 거는 싸움에 진지하게 응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의 태도는 명확하다. “나도 틀릴 수 있으며, 나는 너의 반론에 흥미가 있고, 너의 의견은 무척이나 인상적이며, 우리는 이것에 대해 언제든 다시 얘기할 수 있다.”
세미나에서 아무리 말을 아껴도 피해갈 수 없는 대화의 시간이 있다. 과목의 학점은 에세이나 리포트, 시험 등으로 평가된다. 에세이나 리포트로 평가되는 경우, 학기 말이 되면 과목마다 교수와의 개별 면담 시간이 주어진다. 그 시간에 학생들은 자신이 쓸 에세이의 주제와 근거, 관련 책에 대해 교수 혹은 조교와 상의한다. 학부과정이나 석사과정이나 이런 시스템은 똑같이 적용된다. 나는 그 시간이 좋았다. 내가 써보고 싶은 주제에 대해 제안하면 교수가 그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내가 관심 있을 만한 책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그러다가 막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교수와 얘기가 통하지 않아 가슴을 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는 계속 나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피드백’을 요청한다. 이런 방식으로 과목이 진행되면 에세이나 리포트를 쓸 때 나의 태도 역시 명확해진다. “나는 충분히 교수를 설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의의 어떤 부분에 특히 집중했고, 나의 글에 대한 교수의 생각이 궁금하며, 나는 이것에 대해 앞으로 계속 고민해볼 생각이다.”
영국 대학에서 학생-교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언제든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상대다. 이러한 관계는 학교와 학생이라는 좀더 큰 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생회는 언제든 같은 자리에서 학교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다. 학생회는 세밀하게 구성돼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려 노력하고, 학교는 합리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학생회 학생 중 몇몇은 1년 동안 수업을 받지 않고 학교의 지원하에 학생회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학생회 산하의 그룹 중에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모토를 내건 그룹들은 때로 작은 시위를 하고, 전단지를 돌리며 자신들의 의견을 학생들에게 피력한다. 그 친구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열등생이나 열정만 가득한 못난이 취급을 받는 일은 전혀 없다.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뿐이다.
학사 운영 면에서는 한국 대학보다 한참 못하다. 우리처럼 때맞춰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지 못한다. 여전히 학과 사무실에는 사인해야 하는 온갖 종이가 넘쳐나고, 너무 느려 속이 터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래도 장점이라면 과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하나의 틀에 학교의 모든 과가 일렬종대로 줄을 맞춰 서는 경우는 없다. 과마다 특성에 맞는 학사 운영을 내세운다. 전공은 정교하게 나눠져 있고, 학생 스스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공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대학보다 학과의 경쟁력이 우선시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중앙관리식 집중에 익숙해져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국 학생의 입장에서 영국의 학사 관리에 별점을 매기라면 음, 별 2개 반에서 2개 정도? 장점과 단점이 팽팽하게 맞선다. 제아무리 과의 특성에 따른 운영과 관리를 한다고 해도, 체계적 관리 시스템 없이는 장점이 제대로 드러날 리 없으니까.
영국 대학은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많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위기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은 불합리한 인턴제도 등에 휩쓸리고, 높은 학비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부채에 시달린다.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줄고 학비는 연간 3천파운드에서 2배 정도 오를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집권하면 엘리트 교육에 ‘올인’할 거라는 전망도 있다. 경쟁력에 집착하는 대학은 세미나 내용을 녹취해 세미나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느냐를 학점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출석 평가 비율도 높인단다. 한국에 비해 끈끈한 인간관계나 집단문화가 별로 없는 영국 대학에서 자발적인 토론이나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유마저 빼앗아간다면, 음 생각만 해도 우울해진다.
안인용 기자 한겨레 ESC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원룸 살면서 평생 모은 5억…“누나, 나처럼 아픈 사람 위해 써줘”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백악관 논란 메시지 하루 만에 ‘수습’

백악관, 윤 선고엔 “한국 사법 사안”…대신 “미 기업·종교인 표적화 우려” 제기

휑…‘윤어게인 집회’ 2천명 신고하더니 20명도 안 모였다

검찰, 송영길 돈봉투 의혹 사건 상고 포기…무죄 확정

위증 혐의 최상목, ‘한덕수 중형’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10개월간 환자 묶은 부천 이룸병원…인권위 “신체 자유 보장” 권고

윤석열 “국민께 사과…내란죄 인정 논리는 납득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