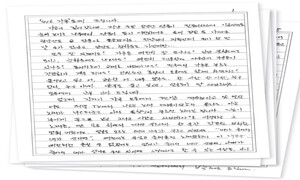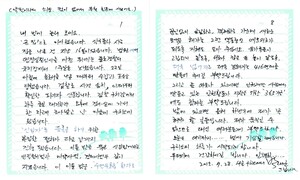1990년 5월 서울 명동성당에서 조선대생 이철규의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단식농성에 함께하고 있다.
박래군은 멀리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을 했던 2004년, 그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겠다고 서울 여의도에서 거의 살았던 것 같다. 다음해 상임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도 사무실에서 그와 마주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상임활동가 회의 정도가 아니었나 싶다. 가끔씩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는, 아니 앉아 있을 때는 거의 늘 자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서도 코를 고는 모습에 놀라다가, 토론회 사회를 보면서도 조는 모습을 보고, 그냥 웃으며 놀리기 시작했다. 정권이 굳이 그를 잡아가두려는 이유를 알기 어려운 때였다.
2006년 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그랬다.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을 하던 중 그와 또 다른 동료 한 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모두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구속영장은 발부되었다. 석방을 위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거의 매일 대응회의를 하면서 결국 보름 만에 빼냈다. 모두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인권활동가의 구속이 웬 말인가 말이다. 그러나 ‘인권’활동가라는 명함의 약발은 그리 길게 가지 않았다.

2006년 3월15일 국방부가 경기도 평택 대추리에서 농사를 못 짓게 굴착기를 앞세워 땅을 파내자 주민과 함께 저지하고 있다. 한겨레 장철규 기자
2009년 3월이었겠다. 오랜만에, 그는 사랑방 활동가들과 술 한잔 하기로 했다. 그해 1월 6명이 죽은 서울 용산 참사 진상 규명에 매진하게 된 그의 얼굴을 사무실에서 보기 참 힘든 때였다. 막걸리를 시켜 한 잔씩 나누며 모둠전이 나오길 기다리는 중, 그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참사 뒤 두 달이 되어가지만 장례도 기약하지 못하던 때다. 그는 서둘러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으로 갔다. 전이라도 하나 먹여 보내지 못한 게 못내 아쉬운 날이었다.
용산 참사 이후 한 달여간, 공동집행위원장인 그가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다. 그도 최선을 다했고, 함께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으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 이후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 요구도 모두 묵살되던 중이었고, 벌써 사람들은 잊어가던 때였다. 그래서일까. 당시 그의 구속영장은 2008년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활동, ‘MB 악법 저지 공동행동’ 활동까지 열거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의 왕성한 활동의 증표로 읽을 수도 있겠으나, 잡아넣으려고 쓸 만한 건 다 끌어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잡아가두려는 속뜻이 분명하니, 그렇게 잡혀 갇혀서는 안 됐다. 그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다”는 공개 서신을 재판부에 보냈다. 그는 “유가족들의 한과 눈물로부터” “제가 스스로 짊어진 책임에서” 도피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사랑방 활동가들은 그가 수배 생활을 하던 장례식장으로 모둠전을 포장해가서 막걸리를 함께 마셨다.
이듬해 1월9일 용산 참사로 희생된 철거민 5명의 장례를 치렀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지만 그는 눈을 맞을 수 없었다. 정부는 수배자들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당시 수배자들이 있던 서울 명동성당 주위로 경찰력을 배치했다. 삼우제까지 마치고 그는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했다. 공개 서신을 보낼 당시 이미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처지”를 선택한 그였다. 명동성당에서 나와 경찰서까지 가는 짧은 시간은 자유로웠을까? 갇힌 장소가 어디였든 그를 가둔 “스스로 짊어진 책임”은 그를 풀어주지 않았던 것 같다.

2010년 1월11일 ‘용산 참사’ 수배자인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왼쪽), 이종회 ‘용산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경찰에 자진출석하기 앞서 명동성당에서 서로 격려하고 있다. 한겨레
사랑방이 20주년을 맞던 2013년 봄, 그는 사랑방의 멤버십을 정리했다. 우리는 그가 만든 밥을 나눠먹는 시간을 마지막 선물로 준비했다. 밥 당번이 돌아올 때면 사무실로 들어와 밥을 해놓고 바삐 나가곤 했던 그를 위해 고등어와 콩나물을 사두었다. 그의 단골 메뉴였던 고등어조림과 콩나물볶음의 맛은 여전했고 그도 여전했다. 다만 그는 너스레를 조금 덜 떨었고, 자신이 인권운동을 배운 단체라며 동료와 후배들에게 소감을 말할 때는 조금 뭉클했고, 노래를 부를 때에는 20년 세월의 무게를 실어 조금 진지했다. “끝내~ 살리라~ …죽음을 딛고 노동해방 그날에, 꼭 살리라.”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게 될 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뭔가 해야 한다는 고민들이 모일 때 그 자리에 박래군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했다. 왜 그랬을까. 그는 한국 사회의 모든 인권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기억되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희망버스처럼, 정말 통장 개설밖에 안 했는데도 기소되는 사람이었다. ‘현장 체질’이라고 하지만 거리나 광장만큼 교육이나 재정이나 공간도 중요하다는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가 가보지 못한 현장도 많았고 그가 함께했던 어떤 현장도 그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굳이 그의 대단한 능력을 꼽자면, 그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모든 현장에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건, 아마 구속의 표적이 된 이유도 그것이겠지만, 기꺼이 그와 연루되기를 자처하는 무리(군)들이 그에게로 왔기(래) 때문이리라. 물론 사람들과 두루 어울리며 허허실실 하느라 숭숭 나는 구멍들을 누군가는 메웠고, 발빠르게 현장에 찾아가는 만큼 비게 되는 자리들을 누군가 채웠다. 그러니 모으는 능력 역시 그 혼자의 것은 아니겠다. 그래도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그는 ‘있는’ 사람이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언덕이었고, 그래서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부재와 함께 확인되는 존재감의 정체가 그렇다. 그러고 보니 그가 늘 감행하던 썰렁한 농담이야말로 그의 존재감의 본질이겠다.

지난 4월2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배·보상 기준과 금액을 발표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돈으로 능욕당했다”며 정부를 규탄하고 삭발을 감행했다. 박래군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아 유가족들의 시위 현장에 늘 함께했다. 박승화 기자

2013년 5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자동차 만들기 프로젝트 ‘H-2000’의 조립이 다 끝난 뒤 건배를 하고 있다. 박승화 기자
너무 많은 사람들 곁에 그가 있었다. 썰렁해도 용서하겠다며 어서 빨리 나오라는 목소리가 주위에서 빗발친다. 그의 구속으로 초과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이 그만큼 크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그의 대단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대단한 배후 때문임을 확신한다. 돌이켜보면 용산 참사 당시 나는 누군가의 죽음보다 국가의 죽임에 더 분노했다. 그러나 그는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었다. 시계를 보다가, 아빠가 들어와 아이들과 라면을 끓여먹을 시간이라며 혼자 우는 유가족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죽임의 진실이 밝혀질 때에만 죽음에 대한 애도가 완성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그 역시 그랬다. 그의 배후는 시대가 죽인 사람들이다.
그는 죽은 자의 증언을 귀기울여 듣는 사람이었고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의 자리에 함께 있다. 우리는 흩어지지 않는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자들은 오늘도 또 다른 죽음을 획책하며 진실을 묻으려 한다. 그러나 어떤 정권도 죽은 이들을 잡아가둘 수 없으며, 그/녀들은 우리를 묶어세우는 배후로 여전히 살아 있다. 그가 잠시 구속된들 무리가 흩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그의 석방을 위한 가장 유력한 행동이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도 그처럼 죽은 이들의 증언을 이미 들을 수 있다. 이제 그가 석방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1988년 6월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분신한 동생 박래전의 영결식에서 추모사를 읽고 있다. 박용수 제공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사법부’

한동훈 “윤, 계엄 안 했으면 코스피 6천”…민주 “안 놀았으면 만점 논리”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08840037_20260306502691.jpg)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

나경원 “‘오세훈 징계 정지’ 원칙 어긋나…안 좋은 평가, 본인 반성부터”

60살 이상, 집에서 6천보만 잘 걸어도 ‘생명 연장’…좋은 걷기 방법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77491692_20260305504002.jpg)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트럼프, 이란 초등학교 175명 폭사에 “이란 소행”…증거는 제시 안해

두바이 재벌, 트럼프 직격 “전쟁에 우릴 끌어들일 권한, 누가 줬냐”

말 바꾼 트럼프 “쿠르드 ‘이란 들어갈 의지'…나는 거절”

인천 빌라촌 쓰레기 봉투서 ‘5만원권 5백장’…주인 오리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