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소정 제공
시작은 ‘어차피’였습니다. 출퇴근길에 <한겨레21>을 사던 가판대가 문을 닫았습니다. 난감했습니다. 그곳만큼 <21>을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매주 샀잖아. 이참에 정기구독하지, 뭐.’ ‘어차피’와 ‘이참에’로 이어진 정기구독에서 <21> 후원자 모집 글을 봤습니다. 보자마자 생각했습니다. “그래, 진작 했어야지.” 후원독자 강소정(35·사진)씨가 후원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며 웃습니다. “소외된 계층을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긴 글도 좋고요.”
소정씨의 하루는 <21>과 함께합니다. 매일 서울시 은평구와 충무로를 오가는 지하철 3호선 안에서, 퇴근 뒤 집에서도 <21>을 꼼꼼히 읽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읽어요.” 이 정도면 ‘찐팬’(진짜 팬)입니다. ‘찐팬’의 ‘찐사랑’은 후원하면서 무게를 더했습니다. 기사만 읽던 것에서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도 살핍니다. 특히 방준호 기자의 기사에 눈이 오래 머뭅니다. 스크랩도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읽기 아쉬워서” “나중에 친구에게 보여주려고” 곱씹어 읽을 만한 기사들을 잘라 모아놓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정신장애인에게 마음 심폐소생술을’(제1287호) 등이 소정씨의 기사 스크랩북에 들어갔습니다.
소정씨는 ‘종이로 인쇄되는 상품’을 디자인합니다.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상자들이 그의 손을 거칩니다. ‘종이’ ‘인쇄’라는 공통 키워드로 수다가 폭발합니다. “제작을 맡기면서 디자인은 무상으로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안 들이고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은 기사는 제값을 치르고 읽어야 한다는 지론으로 이어집니다. “많이 취재하고 시간을 내서 쓰는 거잖아요. 별 고민 없이 쓰는 기사도 있지만 <21>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글은 당연히 돈을 내고 읽어야죠.” ‘당연히’라는 말에 뭉클해져 절로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감사한 게 아니에요. 마땅한 거죠. 사실 주간지 가격이 너무 싸다고 생각해요.”
종이에 찍힌 활자를 사랑해서일까요. 소정씨는 온라인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에 텔레비전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부터 한 달 이상 온라인과 방송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뉴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재난문자도 꺼놔서 잘 몰랐어요. 주간지를 읽은 뒤에야 알았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도 안 하고 인터넷 기사도 안 보니까 <21>을 더 열심히 읽게 돼요.” 중요한데도 쓰지 않은 기사가 없는지 돌아봅니다.
아무리 ‘찐팬’이라도 <21>에 바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후원을 ‘많이 많이’ 받아서 ‘크게 크게’ 번창해서 아주 오랫동안 좋은 기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3월13일 예정됐던 ‘한겨레21 후원제 첫돌 잔치’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여 신청해주신 분께는 개별적으로 취소 소식 전하겠습니다.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다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행사 일정을 바꾸게 되어 죄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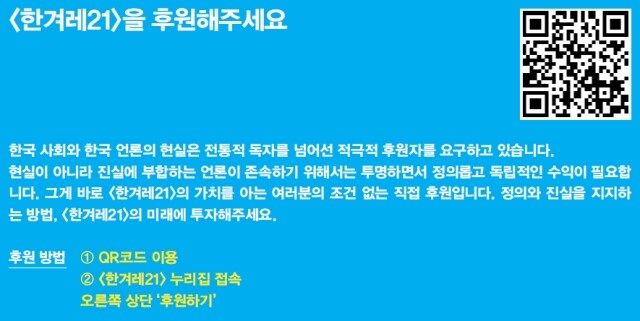
.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국힘 지지율 17% “바닥도 아닌 지하”…재선들 “절윤 거부에 민심 경고”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jpg)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조희대, ‘노태악 후임’ 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트럼프 새 관세, FTA 맺은 한국은 유리…기존 세율에 10% 더해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재판소원 육탄방어’ 조희대 대법원…양승태 사법농단 문건 ‘계획’ 따랐나

국세청 직원과 싸우다 던진 샤넬백에 1억 돈다발…고액체납자 81억 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