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올 상반기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눈길을 끌었던 국내서들 가운데 하나다. 지은이 인류학자 김현경은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한국의 근대화와 해외유학 관행에 대한 박사 논문을 썼고, 10여 년 동안 사회적 성원권과 환대의 문제를 연구하며 여러 대학에서 이를 강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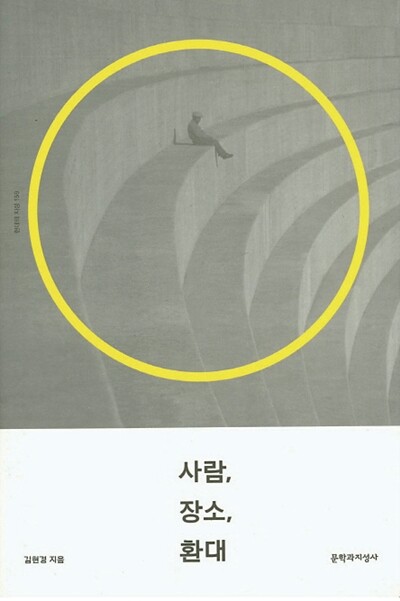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펴냄. 김현경 지음. 1만6천원.
이 책은 신분 차별이 철폐된 근대 이후 사회의 ‘형식적 평등’과 현실의 ‘실질적 불평등’이 어떤 긴장 관계를 만드는지를 논증한다. 사회는 발전하고 모두가 이전보다 더 평등해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전보다 더 살기 힘들어졌을까? 지은이는 공적으로 신분제가 철폐됐지만 갈수록 신분제가 부활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신분은 “장소/자리를 둘러싼 투쟁”이어서 “모든 기준에서 특수한 계층들”이 생겨나고 “사회 안에 별개의 사회”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불평등은 갈수록 심각하게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환대는 자리를 내주는 행위이다.” ‘사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곧 ‘사람’이 되려면 장소와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다. 환영은 대개 약속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지만, 환대는 상대방의 신원을 묻지 않고 기꺼이 거할 장소를 내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사회’를 구조 중심의 관점과 서로 예의를 갖추는 개인 사이의 행위 중심 관점으로 나누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안해하면서 월세를 올려달라는 집주인이나 자신을 해고한 사장도 ‘나’를 모욕하려던 것은 아니다. 시장의 법칙에 따라 그들은 심지어 안쓰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다. 이럴 때 굴욕감을 느끼고 이의를 제기하면 졸렬하거나 말 안 통하는 비합리적인 사람이 돼버린다. 약자의 굴욕감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때린 사람은 없는데 피해자만 속출하는 신자유주의는 이처럼 구조와 개인적 상호작용 질서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면, 성원권은 시민권보다 더 확대된 개념이다.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이유는 반쪽 구성원 자격만 인정받는 탓이다. 일상적 차별은 그가 정규직이 된다고 해서 모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이는 ‘신분’의 문제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공공성을 회복하는 ‘환대’에서 찾을 수 있다. 지은이는 이를 적극적으로 사회의 ‘공공성’과 연결한다. 이를테면 주거수당·실업수당 같은 복지는 사회 안으로 약자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환대의 다양한 형식이라는 것이다. ‘환대’가 불가능하다면 ‘사회’도 불가능하다. 사회는 ‘시스템’을 통해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노력’으로 실현된다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접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18413306_20260304503108.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순교자’ 하메네이에 ‘허 찔린’ 트럼프…확전·장기전 압박 커져

김성태 “검찰 더러운 XX들…이재명,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여”

국방부, 장군 아닌 첫 국방보좌관 임명 나흘 만에 업무배제

호르무즈 봉쇄 직전 한국행 유조선만 ‘유유히 통과’…사진 화제

팔 잃은 필리핀 노동자와 ‘변호인 이재명’…34년 만의 뭉클한 재회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39703969_20260304503247.jpg)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향해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코트

강혜경 “나경원과 오세훈 차이 좁히게 여론조사 조작” 재판 증언

“조희대, 법복 입고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내 사라지나” 박수현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