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가 휩쓰는 만남 프로그램들, 들여다보면 세대별 공략법 제각각
눈물샘 자극하는 과거 재연이나 경쾌한 토크쇼 형식도 모두 ‘현재’의 자화상
▣ 강명석/ 대중문화 평론가
한국에서 만남 프로그램이란 곧 ‘과거’와의 만남을 의미한다. 한국방송 <tv>나 문화방송 <꼭 한번 만나고 싶다>처럼 직접적으로 출연자들의 과거를 재연하기도 하고, 한국방송 <해피선데이>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친부모와 떨어져 해외에 입양되어 살았던 주인공들의 그간의 삶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해피 투게더-프렌즈> 역시 연예인 출연자의 학교 동창들이 말하는 추억을 통해 10여년 이상 만나지 못했던 그들에게 친밀감을 형성하게 한다. 과거는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당위성을 설정해준다. 누군가를 만나지 못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으니, 혹은 그들과의 추억이 깊으니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즉, 만남 프로그램의 핵심은 만남보다는 만남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되찾는 데 있다. 가족을 찾는 <꼭 한번 만나고 싶다>나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말할 것도 없고, <tv>나 <해피 투게더-프렌즈>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은 과거의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잠시나마 연예인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되찾는다. 그래서 만남 프로그램들이 과거를 다루는 방식은 곧 프로그램의 성격이 된다.
<꼭 한번…>과 <tv>의 차이</tv>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과거를 직접적으로 재연하는 것은 물론, 재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재연은 지난 몇십년간 그들의 각박한 삶을 보여주고, 더불어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그 시절의 풍경을 스케치한다. 그때는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부잣집에 팔려가다시피 해서 식모살이를 하는 게 당연했고, 배가 고파 어떤 일도 할 수 있었다. 그들의 고생은 그 시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이어지는 만남은 강한 카타르시스의 순간이 된다. 그래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배고픔 때문에 ‘팔려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세대에게 강한 결속력을 준다. 그들은 <꼭 한번 만나고 싶다>를 통해 이젠 신세대에겐 있었는지조차 실감나지 않는 그 시대의 정서와 풍경을 느낄 수 있다. 반면 같은 재연이라도 <tv>의 방향은 다르다. 재연이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의 핵심은 재연이 주는 과거의 아픈 사연들 같은 것이 아니라 재연을 보면서 토크쇼의 형태로 사회자와 게스트가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고, 토크는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한결 가볍게 한다. 재연은 프로그램의 성격을 복고적으로 만들고, 그런 정서에 익숙한 시청자들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신세대 가수부터 노년의 배우까지 모두 출연하고, 그만큼 폭넓은 시청자를 노리는 프로그램에서 마냥 눈물샘만을 자극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만남의 순간에도 강한 카타르시스보다는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그것은 애초에 친구 찾기인 <해피 투게더-프렌즈>는 물론,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클라이맥스는 역시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눈물의 순간이지만, 그 전후에 MC 김제동과 여자 연예인을 통해 최대한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며, 주인공과 부모의 만남 이후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주력한다. 이는 만남 이후가 거의 없는 <꼭 한번 만나고 싶다>와 <tv>와 다른 점이다. 즉, 과거가 ‘눈물’이 되는 것은 출연자가 아니라 시청자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전쟁 세대에게 과거는 눈물이자 단절이지만 그 이후의 세대가 더 많이 출연하는 <tv>는 과거가 복고나 회고가 된다. 그리고 공익과 오락이 함께 강조되는 일요일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의 만남 프로그램은 해외 입양이 국가의 ‘수출산업’이던 그 시절의 그림자가 깔려 있지만, 그보다는 그때 태어나 자란 지금의 20~30대의 정서를 반영하는 데 힘쓴다. 그리고 이것이 20대 초반의 연예인도 출연하는 <해피 투게더-프렌즈>에 이르면 만남은 눈물이나 회고가 아니라 달라진 친구들의 ‘현재’를 확인하고, 유쾌한 웃음이 프로그램의 중심에 자리잡는다. 이는 곧 지금 이 시대가 각각의 단절된 과거를 안고 사는 세대가 혼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느낌표>, 혼혈아와 할머니의 미래는?
1980년대엔 ‘이산가족 찾기’가 곧 ‘국민 정서’였다. ‘이산가족 찾기’에 담겨 있는 과거에 대한 아픔과 눈물의 감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사이 1990년대의 ‘X세대’는 1980년대에서 벗어나 ‘쿨’해지고자 했고, 모바일과 인터넷을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2000년대의 변화는 1990년대를 이미 ‘복고’로 만들고 있다. <꼭 한번 만나고 싶다>와 <해피 투게더-프렌즈>를 보는 세대가 갈리면서도, 그들이 모두 만남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닐까. 불과 몇년 만에 거리 풍경이 바뀌는 한국에서 그들이 자신의 과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자신과 과거를 공유했던 사람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의 만남 프로그램은, 과거를 추억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현재에 대한 자화상이다. 알고 보니, 우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아니면 어디서든 과거를 찾기 힘들고, 다른 세대와 무엇을 공유하기도 힘든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온 여성들과 한국 남성의 국제 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아가는 문화방송 <!느낌표>의 ‘집으로’의 접근은 흥미롭다. 그 아이들은 자신과 같은 세대가 아닌 할머니를 만나고, 프로그램의 초점은 만남 자체보다는 그들이 새로 형성할 미래에 맞춰져 있다. 과연 2000년대의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단절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을까. ‘집으로’의 아이들과 할머니가 공유할 수 있는 과거가 존재할 그때까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살아남으며 그들 나름의 일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tv></tv></tv></tv></tv>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총 쏴서라도” “체포 지시” 검찰 진술 장성들, 윤석열 앞에서 ‘딴소리’
![[속보] 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 내가 김용현에게 지시” [속보] 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 내가 김용현에게 지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204/53_17386652527469_20250204503524.jpg)
[속보] 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 내가 김용현에게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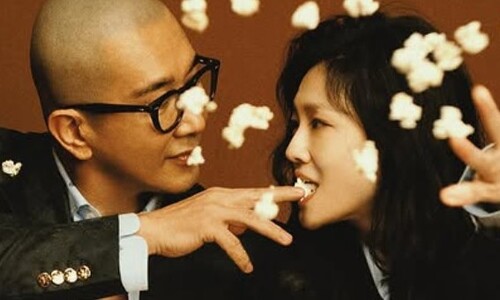
“구준엽 통곡에 가슴 찢어져”…눈감은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

15억 인조잔디 5분 만에 쑥대밭 만든 드리프트…돈은 준비됐겠지

‘체포 명단 폭로’ 홍장원 인사에 윤석열 고개 ‘홱’…증언엔 ‘피식’

전한길과 정반대…한국사 스타 강사 강민성 “부끄럽다”

기자 아닌 20대 자영업자…서부지법 난동 주도 ‘녹색 점퍼남’ 구속

한동훈 복귀 ‘초읽기’…김종인·조갑제 이어 유인태까지 만나

명태균·윤 부부가 띄운 ‘제보사주’, 앞장서 퍼뜨린 조선일보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정정보도] ‘시민이 쓰는 내란 공소장…우두머리 윤석열을 처벌하라’ 등 기사 관련 [정정보도] ‘시민이 쓰는 내란 공소장…우두머리 윤석열을 처벌하라’ 등 기사 관련](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