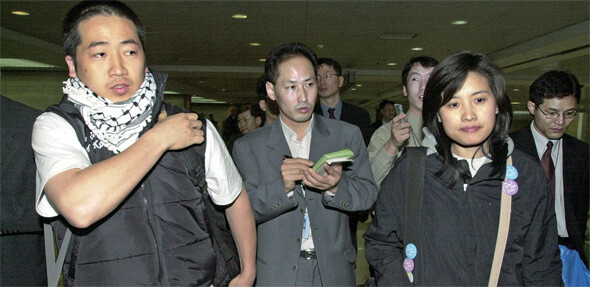유대인 박해의 첫 단계는 ‘국적박탈’이었다. 1935년 나치는 뉘른베르크법을 제정해 독일 내 유대인의 국적을 박탈하고, 유대인과 독일인 간 결혼을 금지했다. 나치의 대량 학살을 피해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야 했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드러난 국가의 야만성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뜻을 담았다.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닌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않는다.”(제15조)
전세계 무국적자 천만 명
20세기 이래 국민이 아닌 삶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국적이 없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국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 국적이 부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전세계적으로 1천만 명 이상의 무국적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수는 아무도 모른다. 무국적자 등록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소수다. 각 국가들에 무국적자는 보이지 않거나, 보고 싶지 않은 존재다. 군사정부 시절인 1962년,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무국적자에겐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그러나 5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무국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조차 만들지 않았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가 많아지면서 무국적자 발생 요인은 매우 복잡해진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무국적자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고 평가받았지만, 2000년대 이후 국적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온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아버지 국적을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숨졌다. 아버지 쪽 형제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입양했다. 그러나 아이는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었다. 파양돼 고아원에 보내졌다. 출생신고가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미 말소됐다. 신분증이 없는 상태다. 어머니가 베트남인이므로, 베트남 국적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베트남 대사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무국적 상태가 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인간사가 얽히고설키는 법인데, 이러한 경우의 수를 다 감안해 법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원래 국적을 포기한 가운데 위장결혼이 밝혀져 한국 국적을 상실해 무국적이 된 경우도 있다.
‘영토 없는 국가’ 개념 도입하자
국제적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무국적자 발생도 우려된다.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면서 섬나라들이 가라앉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카터렛섬에 살던 주민 2700명은 남쪽으로 80km 떨어진 부건빌섬으로 이주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주로 정치적 박해 요인이 있어야 ‘난민’으로 인정돼왔다.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정된 영토’를 가져야 한다. 영토를 잃는 것은 국가의 소멸이다. 이러한 까닭에 ‘영토 없는 국가’ 개념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망명 정부나 타국과의 협정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 참고 문헌 ‘대한민국 내 무국적자 현황’(김철효, 최서리·2013), ‘해수면 상승이 해양 경계와 섬에 미치는 법적 쟁점 연구’(김민수·2013)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룰라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장갑’ 받고 미소…뭉클한 디테일 의전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소득세 대체할 것”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전한길, 반말로 “오세훈 니 좌파냐?”…윤어게인 콘서트 장소 제공 압박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에 미-중 전투기 대치 사과’ 전면 부인

피해자들은 왜 내 통장에 입금했을까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국회 의장석 앉은 한병도…‘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주호영 대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