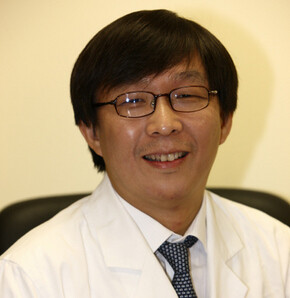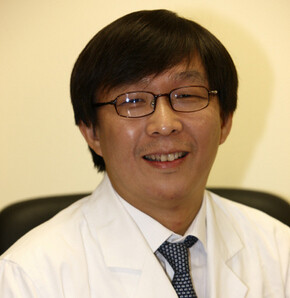
김붕년 서울대 의대 교수(소아청소년정신과). 사진 <한겨레21> 류우종 기자
내과 의사가 아닌 정신과 의사가 금연을 제창하기에 난처한 대목이 있다. 흡연실이 마련된 정신병동이 적지 않다. 흡연이 환청을 완화한다는 보고도 있다. 마감이 임박해 눈가가 흔들리는 기자의 담배 한 모금은 주사를 맞아 절규하는 아이들 손의 사탕과도 같다.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붕년 서울대 의대 교수(소아청소년정신과)는 말한다.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증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로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이 치료나 상담을 통해 건강은 좋아지더라도 흡연은 지속하는 걸 보고 고민이 되었어요. 게다가 지금 보건교사가 일주일에 2~3회 교육하는 등의 방식으로 태도가 바뀔까, 생각해보니 안 되겠다 싶었지요.”
‘의사 선생님’은 결국 ‘동지’들을 모아, 금연 교육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정신건강 평가 프로그램(자가진단)을 만들었다. 지난해 5월 구상해 연말까지 꼬박 8개월 동안 프로그램 개발에 ‘중독’됐다. 서울시, 백혈병재단 등이 울력했다.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도 올해 만들었다. 그린나래(greenteen.or.kr), 아이들에게 푸른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마음이 주소지가 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전달 효과도 높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아 실효성이나 활용도도 클 거라고 생각했지요.”
예방을 표방하지만, 동시에 치료 개념을 갖는다. 그가 여러 상담을 통해 분석한 바로는, 경쟁적 교육체제에서 노적되는 학업 스트레스, 흡연 부모로부터의 모방 효과, 위기가정에서의 도피 수단으로 청소년이 흡연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 모두 환경이다. 실제 지난해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보고(연세대 국민건강증진연구소 등)를 보면, 흡연 중학생의 35.9%가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답한 반면, 비흡연 중학생은 13.9%에 그쳤다.
김 교수가 “또래 압력이나 호기심(흔히 흡연 시작의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된다)으로 흡연을 시작한 이들은 대개 중독으로까지 이어지진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근거다. 기억력, 암 따위 건강상의 위험을 들어 ‘담배를 끊어라’ 내세우는 명제는 동기 유발은 될지언정 궁극적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교육과 진단을 통해 저마다의 상황을 인식시키고, 환경과 심리를 함께 치료한다. 학교나 공부방 같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때론 부모와의 직접 상담도 모색한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금연서약 캠페인을 열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극복한 수기를 공모하기도 했다. 280여 명이 글을 보냈다. 모든 ‘꿍꿍이’는 단 하나로 수렴된다. “정신건강 증진이 흡연 예방의 시작이다.”
현재 남성 중·고등학생의 11.8%, 여학생의 2.8%가 담배를 피운다(위 보고서). 학교 보건교사가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다. 실제보다 낮을 공산이 크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권하는 ‘환경’도 조사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법사위 통과…충남·대전, 대구·경북은 보류

이 대통령 “다주택 자유지만 위험 못 피해…정부에 맞서지 마라”

설 곳 없는 전한길 ‘윤어게인’ 콘서트…킨텍스, 대관 취소

쌓여가는 닭고기, 못 받는 쿠팡 주문...‘배민온리’에 갇힌 처갓집 점주들

‘무기징역’ 윤석열 항소…“1심 모순된 판단, 역사에 문제점 남길 것”

“국힘, 봄 오는데 겨울잠 시작한 곰”…윤석열 안고 가도 조용한 의총

이 대통령 “담합 신고 포상금 몇백억 줘라…‘로또보다 낫다’ 하게”

‘사법개혁 3법’ 통과 앞…시민단체들 “법왜곡죄, 더 숙의해야”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