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13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첫 브리핑을 듣고 있는 기자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차이는 ‘장르적 세계관’에 있다. 아마추어는 그저 ‘소설을 써보겠다’고 생각하지만, 프로페셔널은 ‘잭 런던의 자연주의에 트루먼 커포티의 극사실주의를 섞되 오스카 와일드의 데카당스를 체현하는 인물을 써보겠다’고 생각한다. 프로는 다양한 장르의 필터로 세상을 발견하고 표현한다.
기사에도 장르가 있다. 순진무구한 기자는 ‘스트레이트로 쓰겠다’거나 ‘피처로 써보겠다’고만 생각한다. ‘출입처 기사’는 지겨우니 ‘기획 기사’를 써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생명의 진화는 생체 기관의 분화 과정이고, 문명의 진화는 사회체계의 분화 과정이다. 한국 언론을 진화 단계에 비유하자면 딱 강장동물 수준이다. 먹고 싸는 기관이 동일한 말미잘의 습속으로 살아간다. 스트레이트 아니면 피처, 출입처 아니면 기획이라는 이분법으로 보도한다. 이래서는 그 필터에 포착되는 세계가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 기사 아이템도 잘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
국내 최고의 주간지에 어울리는 좋은 표지 기사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몇 기사 장르를 소개하는 출발은 아무래도 발생 기사, 유사 발생 기사, 그리고 탐험 기사를 구분하는 것이겠다. 발생 기사(Spot News)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보도한다. 각종 사건·사고가 대표적이다. 유사 발생 기사는 연설,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에 기초한 기사다. 대니얼 부어스틴의 용어를 빌리면 ‘유사사건’(Pseudo-event), 즉 작위적으로 연출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인데, 대개의 ‘받아쓰기 보도’가 여기서 비롯한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저널리즘스쿨이 발행한 교과서를 보면, 취재 단계를 ‘취재원 제공 자료’(Source Originated Material), ‘기자의 탐험’(Reportorial Enterprise), ‘해석과 설명’(Interpretation and Explanation)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제공 자료를 검증하거나 독자적으로 정보를 발굴하는 ‘기자의 탐험’ 단계부터 본격 취재가 시작된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탐험 기사(Enterprise Report)다. 한국에서는 이를 기획 기사라 한다. 한국 기자들은 흔히 ‘야마’, 즉 기사의 주제부터 떠올린다. 야마 잡아 몇몇 사례를 구해 넣으면 기획 기사가 된다는 잘못된 통념이 만연해 있다. 그렇게 하면 현실을 멋대로 왜곡하거나 재단하는 기사를 쓰게 된다.
반면 엔터프라이즈는 기자의 진짜 임무를 떠올리기에 무척 좋은 단어다. 그 영어 단어는 특정 지점을 오가거나(Shuttle) 몇 곳을 돌아다니는(Cruise) 행위를 지칭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쏘다니는(Wander) 것도 아니다. 발견의 목적을 갖되 발견할 대상을 정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엔터프라이즈다. 이를 저널리즘에 적용한 것이 엔터프라이즈 보도인데, 그 번역에 적합한 한국말은 암만해도 ‘탐험’이지 싶다.
좋은 기사는 대부분 탐험 기사다. 약 2년 전 영국 <가디언>의 국제 전문기자 존 헨리를 줌으로 인터뷰했다. 화면 너머에서 백발의 백인 남성 기자는 “<가디언> 기사 가운데 절반은 엔터프라이즈 기사”라면서 그게 자기네 신문의 명성을 만든 핵심이라고 으스댔다.
목적지는 없어도 발견하려는 대상이 있어야 탐험 보도를 할 수 있다. 좋은 기사를 탐험할 때는 공간, 사람, 시간, 자료를 찾으면 도움이 된다.
공간을 탐험하는 기사 장르는 르포르타주다. 영미권에서는 이 장르에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젠 누구나 르포를 쓰기 때문이다. 그 황금기이던 1920~1950년대 르포는 극소수 기자의 헌신적 분투로만 구현 가능한 장르였다. 세계 3대 르포르타주로 불리는, 에드거 스노의 <중국의 붉은 별>, 존 리드의 <세계를 뒤흔든 열흘>,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에는 공통점이 있다. 아무나 가볼 수 없는 격변의 현장을 장기간 목격·관찰·체험해 보도했다. 케이블 텔레비전이 세계 곳곳의 현장을 보도한 1980~1990년대를 기점으로 르포르타주는 영미 기자들의 출발선이 됐다. 이제 항상 르포르타주를 보도한다. 한국 언론계에는 르포르타주의 전통이 희미하다. 그러므로 르포르타주는 한국에서 여전히 막강한 장르다. 격변의 공간을 찾아가 장시간 취재하면 남다른 기사를 쓸 수 있다. 전쟁, 혁명, 재난 등만 격변인 것은 아니다. 일상 공간의 곳곳에 격변이 있다. 그러니 공간을 찾아라. 탐험 기사의 좋은 출발이다.
사람을 탐험하는 기사 장르는 피처다. 그런데 미국 미주리대학 저널리즘스쿨이 발행한 교과서를 보면 기사의 형태적 장르를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역피라미드(Inverted Pyramid), 집중 구조(Focus Structure), 연대기(Chronology), 내러티브(Narrative)이다. 피처라는 장르는 아예 없다. 피처와 비슷한 것이 ‘집중 구조’다. 인물에 집중해 전체의 문제를 드러내는 기사 장르에 붙인 이름이다. 인물 기사의 핵심은 그저 사람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구조, 체계, 역사가 한 인물에 집중되는 고리를 밝히는 데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슈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체현한 인물을 찾아 보도하면 좋은 탐험 기사가 될 수 있다.
앞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연대기와 내러티브는 시간을 탐험하는 기사다. 연대기는 이슈의 장기 변화를 추적해 보도하는 장르다. 한국 언론은 짧은 호흡으로 사안을 쪼개어 보도한다. 영미권의 연대기 기사는 대개 수십 년을 추적하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1년의 변화만 살펴봐도 좋은 탐험 기사가 될 수 있다.
내러티브는 흔히 문학적 기사로 소개되는데, 시간의 기사인 것 같다. 다만 연대기와 달리 내러티브는 시간의 축에 르포르타주의 공간, 피처의 사람을 등장시켜 발생 기사가 다룰 법한 사건들의 기승전결을 보여준다. 내러티브는 기사 장르의 꽃이고, 취재보도의 종합예술이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탐험하는 장르가 있다. 데이터저널리즘이다. 여러 정보의 묶음에서 패턴, 규칙, 특성을 발견하는 기사다. 데이터를 찾는 경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잘 정돈돼 이미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를 종횡으로 엮어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데이터를 일일이 발굴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일에 겁먹은 초년 기자에게 내가 권하는 방식은 세 번째 경로다. 데이터는 복수의 정보이므로 우직한 취재를 확대하면 누구나 데이터저널리즘을 시작할 수 있다.
지난겨울,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학생들이 지내는 기숙사의 실내 온도가 너무 낮다는 불평이 나왔다. 새벽, 아침, 낮, 밤 등 일정 시간을 정해 기숙사 모든 방의 온도를 벽면·창문·바닥에서 측정하는 취재를 지시했다. 그 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것이 데이터에 기초한 탐험 기사다. 다만 이런 취재에는 발품이 든다. 그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컴퓨터다. 발품 취재로 데이터를 수집하다보면, 컴퓨터 언어를 익혀야 할 동기를 얻게 된다.
장르를 구분하는 눈이 생기면 장르에 특화된 방법과 도구를 알게 된다. 에스에프(SF) 영화에는 컴퓨터그래픽이 필요하고, 좀비 영화에는 특수분장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취재보도 방법이 있다. 이를 익히면 세상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일이 더욱 넓어진다. 다만 단순한 방법과 도구로 좋은 탐험 기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는 게 좋다. 미국의 어느 언론학자는 직접 관찰, 문서 분석, 대면 인터뷰를 취재보도의 ‘성스러운 3요소’(Holy Trinity)라고 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도 이 세 가지 취재 방법은 좋은 기사를 영접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예를 들어 통신 기사는 탐험 기사의 좋은 소재다. 사건·사고의 개요만 밝힌 통신 기사를 보고, 그 현장과 당사자를 만나러 가면 탐험 기사가 된다. 앞서 발생 기사를 잠시 소개했는데, 사건·사고는 발생 직후가 아니라 나중에 취재하는 것이 더 좋다. 사건·사고의 맥락과 의미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드러난다. 1년 전의 일을 잊지 말고 지금 찾아가면 탐험 기사가 된다. 국내외 각종 기자상 수상작도 탐험 기사의 재료다. 남들이 쓴 기사의 주제와 취재 방법을 살펴보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대상을 찾을 궁리를 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기자상 수상작이 탄생한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의제, 주제, ‘야마’ 따위는 없다. 다만 그것을 다르게 보도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다른 곳을 관찰하고, 다른 문서를 분석하며,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된다.
최근 나는 ‘좋은 기사의 조건’을 공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과 인터뷰한 기사, 많은 문서를 살펴본 기사, 많은 곳을 돌아다닌 기사, 오랫동안 관찰한 기사 등을 독자는 좋아했다. 기자의 근육과 신경과 땀이 깃든 기사를 ‘좋은 기사’라고 인지한다.
대단치 않고 새로울 것 없는 이 발견은 나를 흥분시킨다. 기자는 사회의 감각기관이다. 감각의 목적은 물증에 있다. 실질적 근거를 발견해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기자의 책무다. 그러므로 실체에 육박하는 기사가 좋은 기사다. 발생 기사, 유사 발생 기사 등으로는 실체에 가닿기가 어렵다. 탐험 기사는 세계의 실체를 발견하려는 저널리즘의 최고 장르다.
물론 그것을 실행하려면 힘이 많이 든다. 영화 <스타트렉>에서 엔터프라이즈호에 승선한 승무원처럼 온갖 간난신고를 치러야 한다. 그런데 커크를 보라. 그는 고통을 즐긴다. 그래서 탐험을 중단하지 못한다. 마라톤을 달리다 아드레날린을 느끼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다. ‘주자의 희열’(Runner’s High)처럼 ‘기자의 희열’(Reporter’s High)이 있다. 희열 이전에 고통을 치러야 하고 희열 이후에도 고통은 계속되지만, 누군가는 그거 하나 바라면서 계속 달린다. 그게 기자의 삶이다. 나이 들어 신진 학자가 되어버린 전직 주간지 편집장이 보기에는 그러하다.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전 <한겨레21> 편집장
참고 문헌
Anderson, C. W., Bell, E., & Shirky, C. (2012). Post-industrial Journalism: Adapting to the Present. New York, NY: Tow Center for Digital Journalism.
Mencher, M. (1994). News reporting and writing (6th ed.). Boston: McGraw-Hill Co.
Brooks, B. S., Kennedy, G., Moen, D. R., & Ranly, D. (2017). News reporting and writing (12th ed.). Boston: Bedford/St. Mart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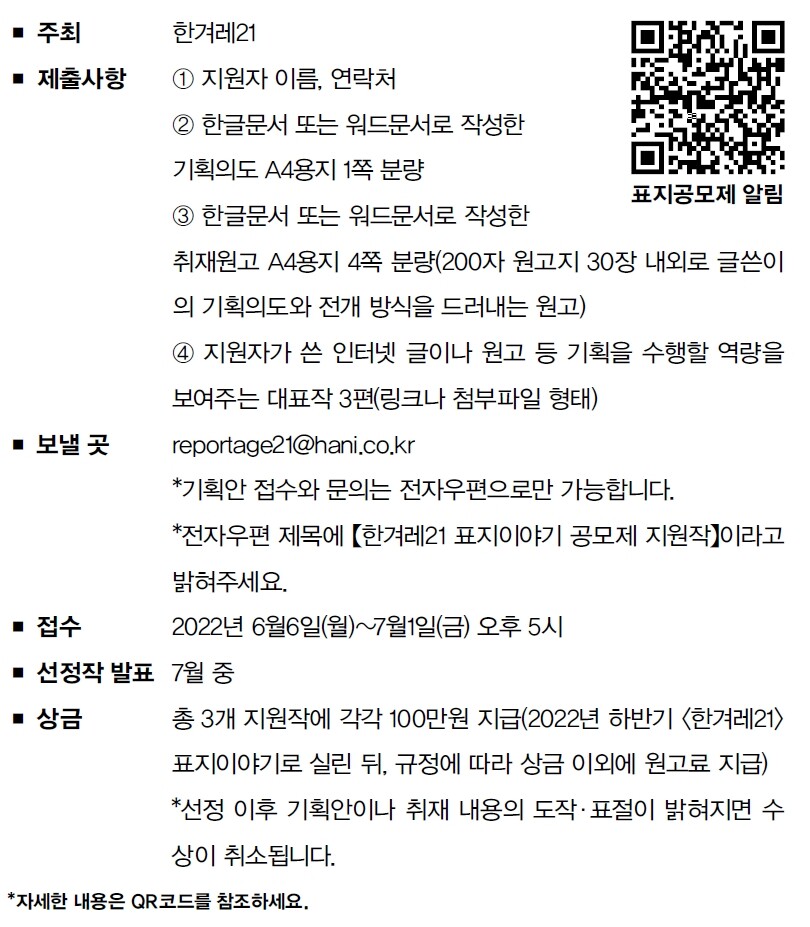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석열 훈장 거부’ 전직 교사, 이 대통령 훈장 받고 “고맙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내린 57.1%…“서울과 영남권서 하락” [리얼미터] 이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내린 57.1%…“서울과 영남권서 하락” [리얼미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2/53_17724082363583_20260302500278.jpg)
이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내린 57.1%…“서울과 영남권서 하락” [리얼미터]

미군 사령부 ‘명중’ 시킨 이란…미 방공미사일 고갈 가능성 촉각

김정은 이란 공습에도 시멘트공장 공개 방문…“투쟁공적은 영웅적”

싱가포르 ‘이재명·김혜경 난초’로 환영…이 대통령 “정말로 영광”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1/53_17723445090457_20260301501521.jpg)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위헌이다 [아침햇발]

‘그냥 한동훈’ 무소속 출마하나…최악 시나리오는 보수 분열→민주당 당선

나이 들어도 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란 최소 200명 사망…CNN “보복으로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

트럼프 “이란 새 지도부 요청으로 대화할 것”...군사·외교 투트랙 전략


![[단독]장동혁은 어떻게 단톡방에 포획되었나…1020명 참여 7개월 단톡방 메시지 24만건 분석해보니 [단독]장동혁은 어떻게 단톡방에 포획되었나…1020명 참여 7개월 단톡방 메시지 24만건 분석해보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2031912989_202602275014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