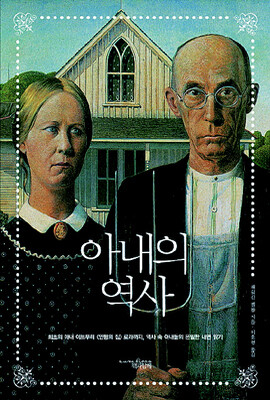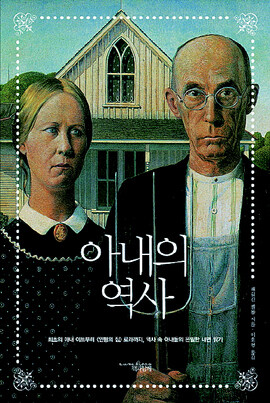
아내의 역사
매릴린 옐롬 지음, 이호영 옮김, 책과함께 펴냄, 2만8천원
“오래전에 서로 합의했잖아요.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나 좋은 대로 할 수 있다고요.” 로마제국의 시인 유베날리스의 시구에 등장하는 어느 귀부인은 다기진 자기주장을 내뱉는다. 로마의 결혼 풍습은 옛적 아내와 결혼에 대한 지금의 통념을 깨뜨린다. 당시 부유층 여성들에겐 이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맞바람 피우기 같은 자유로운 성생활이 당연시됐다. 서로를 동반자로 여긴다는 점에서 그들의 결혼관은 요즘과 비슷한 측면도 있었다.
남성의 시선 거두고 바라본 여성의 욕망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는 옛적부터 ‘동반자’와 ‘종속자’ 사이를 ‘진동’하며 변천해왔다. 아내의 주인은 남편이어야 하는가, 가사노동과 육아는 아내의 전유물인가,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재력과 배경인가 따위의 쟁점은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며 끝없는 논란을 일으켰다. 21세기인 지금은 부부의 맞벌이가 대세다. 독신으로 살거나 싱글맘을 고집하는 ‘비혼’의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아내가 일을 하더라도,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의 유력한 내조자가 되기를 바란다. 낙태·피임 등 몸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변한 것 같지만, 잘 변하지 않은 것이 아내와 결혼의 역사가 아닐까.
(1999)로 잘 알려진 미국 여성학자 매릴린 옐롬의 이 대작은 결혼제도에 얽힌 수천 년간의 미시사회사를 다룬다. 옮긴이가 밝힌 것처럼 ‘남성의 시선을 거둔 자리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욕망’에 대한 글쓰기다. ‘남편의 소유물’ ‘재력이 정하는 결혼’ 등 결혼제도와 아내에 대한 통념의 원형은 이미 고대 히브리 성서시대, 서양사의 원형인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정립됐고, 중세와 근대기에 일부 변형돼 오늘날까지 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지은이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중세기까지 서양에서 결혼은 사랑이 전제가 아니었고 생존,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재물 거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다. 성서 속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7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봉사를 거듭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결혼은 시민권을 계승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었다. ‘아내는 소유물’이라는 관념이 지속됐지만 이혼과 동성결혼, 혼외정사가 만연했던 고대 로마나 여성의 승낙을 처음 명시한 중세 교회법처럼, 동반자 관계로 가기 위한 인식상의 변화도 조금씩 진행됐다고 책은 밝혀놓고 있다.
남편의 소유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각이 표면화한 건 18세기 후반부터다. 노르웨이 작가 헨리크 입센의 희곡 의 주인공 노라는 아내·어머니이기 이전에 인간임을 선언한다. 이른바 ‘신여성’이란 뜨거운 주제가 근대 역사에 등장한 순간이었다. 신여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1세기 가까이 걸렸다. 이런 변화를 이끈 큰 요인 중 하나가 1·2차 세계대전에서의 여성 동원이었다는 사실을 지은이는 구체적인 기록으로 입증한다. 1950년대 성혁명 실마리가 된 ‘킨제이 보고서’의 출간과, 60년대 피임약 대중화, 70년대 낙태 합법화, 여성해방운동의 본격화 등 지난 세기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격변을 숱한 현장 사례를 통해 정리한다. 그것은 곧 재산의 일부였던 아내들이 재산의 소유권과 참정권을 지니게 되고, 섹스의 진정한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게 된 지난한 과정이었다.
조명받지 못한 채 묻힌 책을 복간해
10년 전 조명되지 못한 채 절판됐던 책을 재번역하고 오류를 바로잡아 낸 책이다. 1930년대 미국 화가 그랜트우드가 완고한 표정의 농부와 딸의 모습을 그린 이 표지를 인상적으로 장식한다.
노형석 기자 문화부 nuge@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 3법 추진에 반발

일본, 이제 ‘세계 5대 수출국’ 아니다…한국·이탈리아에 밀려나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

‘재판소원 육탄방어’ 조희대 대법원…양승태 사법농단 문건 ‘계획’ 따랐나

홍준표,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맞장구…“부동산 돈 증시로 가면 코스피 올라”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정청래 “사법 3법 곧 마무리…조희대, 거취 고민할 때”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459993113_20260226504293.jpg)
왜 부자는 수돗물을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병생수 마실까 [.txt]

‘경찰 출석’ 전한길 “수갑 차고서라도 이준석 토론회 간다”

임은정, ‘한명숙 사건’ 소환해 백해룡 저격…“세관마약 수사, 검찰과 다를 바 없어”